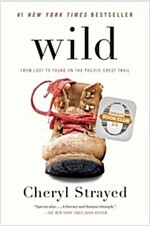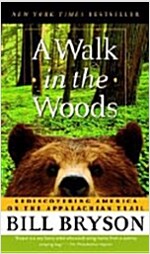여성이 쓴 트래킹 이야기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애서 출판되어 주목을 받은 책입니다.
같은 미국작가인 빌 브라이슨 (Bill Bryson)의 ‘Walking in the Wood(2006)’와 비교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숙명인 듯 합니다.
두 책 모두 아마추어 트랙커인 저자들의 자전적 이야기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두 트래킹 코스인 PCT(Pacific Crest Trail)과 AT (Appalachian Trail)를 다루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책 모두 영화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 두 작품을 간략히 비교하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첫째, 이 책의 트래킹 동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편과의 갑작스런 이혼 등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로 인한 것으로 혼란스럽고 당황스런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버림받고 양아버지 밑에서 자라야 했던 개인사가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아보입니다.
반면 빌 브라이슨의 책은 고등학교 동기와 함께 무모하게 애팔리치아 트래킹에 나서서 이들이 처한 상황을 코믹하게 보여줍니다. 배불뚝이 중년 아저씨들이 생전 처음 산속에 들어가 겪는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성찰보다는 유머와 코믹함이 있죠.
둘째,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자 혼자 트래킹을 하는 상황으로 험난한 트래킹을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6세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고 26살에 이혼을 한 여주인공이 한번도 해본적 없는 미국 서부 종주 트래킹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 혼자 트래킹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인 것인지 은연중에 대화를 통해 나타나 있고 책의 말미에 주인공이 위험에 노출되었던 순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빌 브라이슨의 책은 위에서 언급한 고교시절 고향 친구와 같이 트래킹을 하는 이야기로 트래킹 자체도 이 책에서 했던 것처럼 종주를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합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미 기혼인 저자와 노총각인 친구는 완주를 목표로 했었으나 산 밖의 삶과 일들에 끊임없이 얽매어 완주보다 숲속에서의 새로운 즐거움을 찿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픈 기억이 남아 있던 고향 미네소타와의 절연을 결심하고 트래킹에 나서 그 절박함이 더 강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자신이 계획했던 트래킹 코스를 모두 완주합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일부 구간을 우회하고 돈이 없어 물조차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고생했지만 결국 완주를 하고 맙니다.
요새처럼 집에 갇혀 일만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솔직히 외국에서의 트래킹 경험담은 그 자체로 짜릿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 페이퍼백이 나온 책이니 저자가 걸었던 미국 서부의 트래킹 코스가 근래에 일어난 캘리포니아 대화재로 얼마나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이 책에서 묘사한 캘리포니아와 오레건 주의 히피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때가 언제 오게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