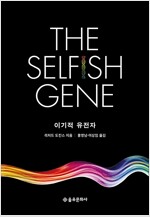
기록 툴을 보니 3월 8일에 시작한 <이기적 유전자>. 아직도 끝을 내지 못했다. 주로 출퇴근 시간에 tts 기능으로 듣는데 밀리의 서재 앱이 음성 재생을 끄면 듣던 자리를 잘 저장하지 못해서 자꾸 들은 곳 또 듣고 들은 곳 또 듣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들은 곳 또 들어도 그게 들은 곳인지를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재미가 없기도 하고 비슷비슷한 예시가 반복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본인의 연구가 아닌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보니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게 쓰려고 하다보니 너무 단순화된 예들을 들기도 한다. 때때로 동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의견에 (특히 번식이나 혈연관계 등에서) 가부장적 편견이 깔려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재미가 없다보니 요즘엔 기분이 별로인 날은 책 대신 음악을 듣는 일도 많아졌다. 듣다보면 졸려서 음악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가벼운 마음>을 읽고 바흐를 들어보기로 마음 먹었다. 굴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어보니 굴드에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바흐는 듣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흐답지 않게 통통 튀고 재미있는 연주라) 다른 것들을 들어보고 있다. 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어서 (음 하나하나가 다 잘 들리기 때문에) 바흐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은 잘 되지 않았다. 익숙해지면 언젠가는 될 지도. 어쨌든 그런 바흐를 듣는 것조차 <이기적 유전자>를 듣는 것보다는 즐거웠다.
그나마도 유전자라는 것에 대한 도킨스만의 정의, 해밀턴과 메이너드 스미스를 인용해 ESS (Evolutionary Stable Strategy) 이론을 소개하는 부분까지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 뒤는 영... 아직 10장을 듣고 있는데 13장까지 있다.
해러웨이의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에 나오듯 에드워드 윌슨 등의 사회생물학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상황에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스티븐 제이 굴드와의 입장 차이 등 이후 이야기가 더 궁금하고 1970년대에 나온 책을 개정하면서 저자 자신이 덧붙인 의견 등이 더 흥미로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리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타적일 수 있다' 라는 저자가 아주 잠깐 언급했을 부분을 강조하던데, 이 내용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초판부터 있었을 것 같진 않고 또 작가가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본인의 이론이 무한이기주의 경쟁사회를 정당화하는 - 사실 정당화도 아니고 그냥 연관지어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에 나중에 덧붙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논문 등에 연구의 불완전함에 대해 핑계대느라 꼭 한 문장 덧붙이는 그런 문장들처럼...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다 읽고 알아보고 싶지는 않고 누군가 정리해둔 걸 쉽게 접하고 싶은 마음에 유시민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 정리가 되어있을까 싶어서 (독서괭님이 이 책 읽고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회사 도서관에서 빌려왔다.
일단 <이기적 유전자>를 끝까지 다 훑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지루할 수가 있나. 그렇게 많이 팔렸다던데 나만 재미가 없는 건지 다들 재미없는데 차마 그렇게 말 안하는 건지... 누군가 <코스모스>와 비교를 하던데, 재미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말해주고 싶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