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녹음시작, 오늘까지 총 9시간 걸려 완성한 황경신의 생각노트 <생각이 나서>의 마지막 글귀
쓰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릴케의 말을 믿는다.
'끝이 나면 쓸 수 있다'보다 '씀으로써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로 나는 그 말을 이해한다.
슬픔 자체는 끝이 없지만 '어떤' 슬픔에는 끝이 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어떤' 사랑은 끝이 난다.
그리하여 나는 쓴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쓰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말을 나는 잘 모르겠다.
릴케는 어떤 의미로 저런 멋진 말을 한 걸까. 백혈병으로 51세의 나이에 사망한 릴케는
14세 연상이 루 살로메와의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루는 그 전에 이미 니체에게도 청혼 받은
적이 있는 여인. 따뜻한 모성을 느끼지 못하고 유년을 보낸 섬약한 릴케에게 살로메는 여인
이상의 동반자가 아니었다싶다.
그의 묘비에 적힐 시를 스스로 남기는데, 제목은 '비명'.
장미꽃이여 오 순수한 모순이여, 기쁨이여
그 많은 눈꺼풀 아래에서
그 누구의 잠도 아닌 잠이여.
'쓰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본다.
누군가가 내 인생의 키워드가 뭘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나는 '글쓰기'라고 내심 대답했다. 또 누군가는 자신도 3살 때부터 글을 썼다며 우스개를 했다.
그렇구나. 난 만 24개월부터 글(글자^^)을 쓰고 읽고 했다고 엄마는 자랑이다. ㅎㅎ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도록 일기를 써왔고 크고 작은 글쓰기 대회에서 입상도 했다.
재능이 열망을 좇아가지 못하면 번뇌가 오는 법. 다행인지 나는 욕심이 없나 보다.
어느 순간 열망을 조율하는 시점이 오고 (조금은 비겁하게) 내려놓고 물러서 있다.
글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분수처럼 치솟아 목울대를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이어야 울림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읽는 이가 알기 전에 양심이 먼저 안다. 진정성,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나는
그럴수록 글을 쓰는 일이 두려워 조심스러워진다.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으면 한 발도 뗄 수 없는 거다.
진정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생각하며
쓰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 그 너머의 너머일 거라고 조용히 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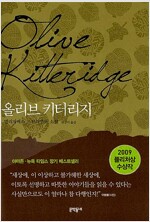
2012. 5. 21 녹음시작, 43쪽까지. 드디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세번째 장편 <올리브 키터리지>는 2009년 퓰리쳐상 수상작이다.
오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작가가 되겠다는 열망으로 글을 써온 스트라우트는
이런 유의미한 조언을 한다.
"작가가 되겠다면 포기하지 말며,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되, 그럴 수 없다면 계속 글을
쓰고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필사하며 습작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녀는 존 치버와 존 업다이크를 좋아하며 육필원고를 고집한다고.
작가 신경숙도 필사하며 공부한다고 하던데, 나는 필사 대신 녹음하면서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쉽게 대신하려고.^^ 편집하면서도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세 번이 되네.
스트라우트의 문장은 섬세하면서도 강하고 생의 위트와 연민이 공존한다.
농후한 생의 이력과 소화력이 엿보이는 문장들, 군더더기 없는 전개, 강인하면서도 시적 서정성이 엿보이는
아름다운 문장들로 가득한 이 소설은 13가지 단편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데, 서사가 독특한 구성 안에서 흐른다.
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여인, 올리브 키터리지가 있다.
강인하고 괴팍하고 불같은 성미를 지녔지만 따뜻함을 숨길 수 없는 이 여인과 남편 헨리, 외아들 크리스토퍼.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오랜 세월을 거친 이야기가 거대한 직조물처럼 서로 엮여 수채화를 그려낸다.
드러내어야만 치유 받을 수도 있는 생의 미려한 상처들에 온기어린 시선과 응원을 보내는 이 소설을 작가는
'삶을 마법으로 만들 줄 아는 분이자 내가 아는 최고의 이야기꾼인 어머니에게' 헌사한다.
오늘은 첫번째 이야기 '약국'의 43쪽까지 녹음했다.
첫 문장은 이렇다. - 헨리 키터리지는 오랫동안 이웃 마을에서 약사로 일했다.-
봄이 왔다. 낮이 길어지고 남은 눈이 녹아 도로가 질척했다.
개나리가 활짝 피어 쌀쌀한 공기에 노란 구름을 보태고, 진달래가 세상에 진홍빛 고개를 내밀었다.
헨리는 모든 것을 데니즈의 눈을 통해 그려보았고, 그녀에게는 아름다움이 폭력이리라 생각했다.(43쪽)
이 글귀를 보며, 나는 입하가 벌써 2주 전이었었던 걸 떠올렸다.
요새는 봄, 가을이 없이 여름이 오고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엄살인데, 전적으로 동감되지는 않는다.
봄과 가을은 나름의 빛과 향으로 우리에게 머물다 갔고 우리는 호들갑스레 봄을 노래하고 가을을 누렸으면서, 망각한다.
좋았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건 그저 없었던 듯 아무 것도 아니었던 듯, 여름이 너무 빨리 온다고 법석이다.
입하! 그리고 성하! 나는 입춘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봄을 잊고 싶진 않다.
봄은 늘, 여름 속에도 가을 속에도 그리고 겨울 속에는 더 속속들이 녹아있는 것.
생은 내내 봄날을 어깨곁고 가는 걸. 아, 올리브 키터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