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개월된 둘째와 네살짜리를 데리고 다니는 생활이 편하지는 않다. 아이가 없을 때야 여행에세이 등은 심심찮게 읽었었는데, 이제는 꼭두새벽부터 정신없이 준비해야 겨우 어딘가를 다녀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여행서적은 언제나 설레고 긴장된다.
기차로 만나는 여행은 어떨까?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유명한 첫 장면,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까지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췄다”를 읽었을 때는 그저 좋은 문장으로만 생각했지 그 풍경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몇 년 전 노르웨이의 뮈르달로 가는 기차 속에서 <설국>을 느꼈다. 해발 2m의 플롬에서 해발 866m의 뮈르달로 가기 위해서는 눈 쌓인 계곡을 통과해야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그게 눈의 터널이라고 생각했다. 어디를 보아도 눈뿐이었다. 눈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떤 나라가 나올까.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기차를 타보았지만 노르웨이의 산악기차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세계기차여행>(윤창호 외 지음, 터치아트)이라는 책이 있는데, 노르웨이의 산악기차를 포함해 스무 개의 낭만적인 기차여행이 나온다. 사진이 아름답고 풍경은 너무 아득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차의 덜컹거림이 느껴지는 것 같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스무 개의 루트를 모두 다녀볼 생각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유명한 첫 장면,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까지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췄다”를 읽었을 때는 그저 좋은 문장으로만 생각했지 그 풍경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몇 년 전 노르웨이의 뮈르달로 가는 기차 속에서 <설국>을 느꼈다. 해발 2m의 플롬에서 해발 866m의 뮈르달로 가기 위해서는 눈 쌓인 계곡을 통과해야 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그게 눈의 터널이라고 생각했다. 어디를 보아도 눈뿐이었다. 눈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떤 나라가 나올까.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기차를 타보았지만 노르웨이의 산악기차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세계기차여행>(윤창호 외 지음, 터치아트)이라는 책이 있는데, 노르웨이의 산악기차를 포함해 스무 개의 낭만적인 기차여행이 나온다. 사진이 아름답고 풍경은 너무 아득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차의 덜컹거림이 느껴지는 것 같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스무 개의 루트를 모두 다녀볼 생각이다.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쩐지 반갑다. 가수이자 글도 잘 쓰는 오지은씨의 책 <홋카이도 보통 열차>(북노마드)를 보고 동지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책에서 ‘철덕후’라는 단어를 처음 보았는데, 철덕후란 ‘철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한다. 철덕후 중에서도 철도 여행을 사랑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철도 노선과 기차 시간표, 차량 부품 등을 사랑하는 부류도 있다는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랑이 있구나 싶었다. 나는 철도 노선을 사랑하긴 힘들 것 같고, 기차 여행을 사랑하는 철덕후로 남을 것 같다. <홋카이도 보통 열차>에는 제목과 달리 열차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다. 당연하다. 열차여행이란 열차를 보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열차를 통해 창밖의 ‘나’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기차를 사랑하는 이유는 느리게 달리는 기차 창밖의 풍경을 통해 무수히 많은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기차가 타고 싶어 엉덩이가 근질거린다.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건데 일본에는 ‘청춘 18티켓’이란 게 있다고 한다.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발매되는, 5일간 무제한으로 보통열차를 탈 수 있는 기차표다. 청춘이 아니어도 18살 이상이어도 표를 살 수 있단다. 이름이 너무 멋져서 소설 제목으로 쓰고 싶을 지경이다. ‘청춘 18티켓’ 외에도 일본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차표가 있어서 다양한 경로의 여행이 가능하다. <드로잉 일본 철도 여행>(김혜원 지음, 씨네21북스)이나 <일본, 기차 그리고 여행>(심청보 지음, 테라출판사) 같은 책을 읽어보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86586.html
"이 세상에는 공항서적이라는 게 있다. 이 특수한 목적의 서적들은 전세계 모든 공항에서 똑같이 발견된다. 세계 어디를 가나 공항서점의 규모는 가판대 수준인데, 그 이유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의 악조건을 견딜 수 있는 책은 겨우 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행안내서와 회화책과 지도와 잡지를 제외하고 이들 공항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공항소설이라는 게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공항소설이란 매우 두껍지만 빠르게 읽히는 모험, 혹은 음모에 관한 소설로 공항서점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공항과 기내에서만 읽고는 버리는 흥미 위주의 소설이다. 한가한 사람들의 말재간에서 나온 용어인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장르의 역사는 오래됐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소설을 ‘철도소설’(romans de gare)이라고 불렀다. 비슷하게 우리에게는 휴게소 편의점에서 할인판매하는 ‘휴게소 소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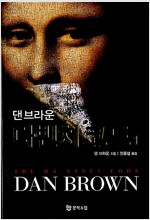

전형적인 공항소설로는 존 그리샴의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시공사),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조디 피콜트의 <19분>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소설들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너무 심오하거나 철학적이지 말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공항 대합실과 기내에서 책을 읽는 일은 혼자 집에서 책을 읽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두꺼워야만 한다.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환승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페이퍼백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다 읽고 나면 바로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항철학서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알랭 드 보통의 책들일 것이다. 여객기에서 바로 옆에 앉았다는 인연으로 시작되는 연애를 다룬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나 여객기 창의 풍경을 표지로 삼은 <여행의 기술>, 혹은 더 노골적으로는 영국 히스로 공항의 호의에 힘입어 쓴 <공항에서 일주일을>(청미래) 등은 공항서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책으로 느껴지리라. 너무 심오하거나 철학적이지 말아야만 한다는 원칙과 명색이 철학서라는 이 책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합일하는가는 직접 책을 펼쳐보면 알 수 있으리라. 하이데거도 좀 노력해서 알랭 드 보통처럼 썼더라면…. 그런 상상이 가능한 것도 다 이코노미석에 앉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석에만 앉았어도 반대로 생각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공항서점에 가면 공항여행기를 만날 수 있다. 이 책들은 무엇보다도 두껍다. 공항여행기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라면 폴 서루, 빌 브라이슨, 세스 노터봄 등을 들 수 있다. 서루의 경우에는 <중국기행>과 <유라시아 횡단 기행>이 나와 있다. 세스 노터봄 역시 <산티아고 가는 길>(민음사)과 여행소설에 더 가까운 <이스파한에서의 하룻저녁>이 나와 있다.






빌 브라이슨은 상대적으로 많은 책들이 번역됐다. <나를 부르는 숲>과 <발칙한 유럽산책>(21세기북스)을 비롯한 ‘발칙한 산책’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폴 서루와 빌 브라이슨은 전세계의 어느 공항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여행기는 공항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두 사람 모두 시니컬한, 혹은 유머러스한 여행자로서 자신이 목격한 이국의 관습들을 기록했는데, 소설을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865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