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자 경향신문의 '문화와 세상' 칼럼을 옮겨놓는다. 아침까지 주제를 못 잡고 있다가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한 대목을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쓰게 됐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독자들이 체호프의 <벚꽃동산>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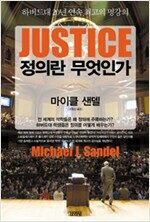
경향신문(10. 09. 28) [문화와 세상]노예의 본성, 자유인의 본성
안톤 체호프의 희곡 <벚꽃동산>에는 피르스라는 늙은 하인이 등장한다. 나이는 87세. 집안 대대로 주인댁의 농노였는데, 1861년 러시아에서 농노해방이 단행된 이후에도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걸 원치 않아 하인으로 남았다. 하인 이외의 다른 운명은 전혀 상상해보지도 않아서 농노해방을 아예 ‘불행’이라고 부를 정도다. 딱히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그냥 다 즐거웠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하지만 이제는 늙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중얼거리며 차츰 존재감을 잃어간다. 타고난 농노, 타고난 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 옹호’에 관해 읽다가 피르스란 이름을 떠올렸다. 인간의 본성과 정치의 목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었다.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정의했지만 여성과 노예의 본성은 정치의 주체인 시민이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겼다. 부당해 보이는 판단이지만, 사실 그런 부당한 배제는 200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 점에서 노예제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일단 노예가 꼭 필요하다는 점. 시민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누군가는 집안일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타고난다는 점. 자유인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으며, 그런 경우엔 노예제가 이롭고 공정하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다. <벚꽃동산>의 피르스라면 아마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노예제 옹호자로 비판하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의 ‘노예 본성론’이 노예제를 반대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의 천성이 노예로서 적합하지 않다면 그에게 노예 일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도 함축하기 때문이다. 즉 피르스의 경우처럼 하인의 직분에 만족하며 사는 ‘타고난 노예’가 없다면, 노예제는 자연스레 지지될 수 없다. 아무리 정치적·경제적으로 노예가 필요하더라도 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은 자유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몇 시간이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닭 가공공장에서의 일을 예로 들자면, 자유주의적 입장은 노동력과 임금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환됐는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에 서면, 노동조건에 더하여 그 일이 노동자의 본성에 맞아야 한다. 만약 너무 힘들고 위험하며 지저분한 일이라 본성에 부적합하다면, 노예제가 부당하듯 그 일 또한 부당하다. 적어도 우리가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를 위해서, 즉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의 본성은 폴리스에 살면서 정치에 참여할 때만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그는 보았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언어는 단지 쾌락과 고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공정하고 불공정한지,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는 수단이다. 그런 언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정치적 본성을 입증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정치공동체나 정치적 활동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거나 신이다. 또 누군가 스스로 그러한 정치적 활동과 관심에서 자신을 배제시킨다면, 그는 자발적으로 노예의 삶을 선택한 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삶인가? 역시 피르스의 경우가 참고할 만하다. <벚꽃동산>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모두가 떠난 무대 위에 드러누우며 이렇게 말한다. “살긴 살았지만, 도무지 산 것 같지 않아….”
10. 0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