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원에 다녀올 때까지 한두 시간 '재택'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무얼 할까 하다가, 지난주말에 미뤄놓은 페이퍼를 쓰기로 했다. 사실 오전에 네댓 시간을 원고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15매를 쓰면서 그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게 좀 우울하긴 하다. 사전준비가 부족한 탓이다) 여가를 좀 가졌으면 싶지만 요즘 형편이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고 또 막바로 '생계'와 관련한 일을 하자니 스스로를 너무 혹사시키는 듯하여(?) '무보수 알바'을 하기로 한 것(서재일이 내겐 '무보수 알바'에 해당한다). 게다가 오늘은 무보수에다 '불편한 알바'로군...



<뉴레프트 리뷰>(길, 2009)의 한국어판이 출간된 게 두어 주 전이다. 나는 격월간인 이 잡지가 연간으로 번역된다는 게 좀 불만스럽긴 하지만 서구 이론/담론의 한 수준을 보여주는 잡지(혹은 학술지)이기에 소개되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하고 가장 먼저 읽을 논문으로 랑시에르의 '미학 혁명과 그 결과'와 테리 이글턴의 '자본주의와 형식'을 꼽고서 원문까지 구했다(랑시에르의 원문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참에 랑시에르의 미학, 혹은 '미학과 정치'를 정리해보자는 게 개인적인 계산이었다. <감성의 분할>(도서출판b, 2008)과 <미학 안의 불편함>(인간사랑, 2008), 그리고 작년 12월 방한 강연문의 하나인 '감성적/미학적 전복'이 정리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이다. 그러고 보면 나의 관심사는 '뉴레프트 리뷰'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다만 랑시에르의 미학에 한정돼 있었던 것.
랑시에르의 글을 읽으며 그런 관심에 걸맞는 '한정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면 좋았겠다. 한데, 막상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건 불편과 당혹감이다. 그 불편은 먼저 두 가지 출처를 갖는다. <뉴레프트 리뷰>의 출간을 소개하는 기사의 이런 대목: "출판사측은 “현재 국내에 있는 좌파적 성격의 잡지들은 우리 학계의 낮은 담론 수준을 반영할 뿐”이라며 “1년간의 준비 끝에 나오는 <뉴 레프트 리뷰>의 한국어판은 우리의 협량한 지적 풍토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국일보) 그리고, <미학 안의 불편함>의 역자가 '옮긴이 서문'에서 랑시에르가 말하는 미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대목: "이런 의문들이 드는 것은 랑시에르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세를 탄 여러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의 글들이,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들이,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결국 현실과 분리된 채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말장난 하는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21쪽)
물론 정확하게 똑같은 대상을 두고 평한 것은 아니지만 <미학 안의 불편함>의 역자가 거명하고 있는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들뢰즈, 푸코, 데리다, 보드리야르, 바디우 등인 걸 보면, 그리고 <뉴레프트 리뷰>에서 보드리야르나 바디우, 랑시에르의 글도 읽을 수 있는 걸 보면 서구산 '고담준론'에 대한 두 가지 평가는 사뭇 대조된다. 그들의 이론/철학은 "한국의 협량한 지적 풍토에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의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래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나로선 '둘다 불편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두 가지 평가가 모두 번역이란 매개를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학계의 낮은 담론 수준"에서라면 어떻게 고급 수준의 "<뉴레프트 리뷰> 한국어판"이 나올 수가 있을까?(그러니까 낮은 담론 수준 운운은 누워서 침뱉기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의 말장난"이라도 우리에게 제대로 번역/소개된 적이 있을까?(사실 '메시지'야 어떻게 전달한다손 치더라도 '말장난'을 옮기는 건 매우 어려운 테크닉을 요구한다. 역자는 <미학 안의 불편함>에서 랑시에르의 말장난을 옮기고 있는 것인지?)

랑시에르의 '미학 혁명과 그 결과: 자율성과 타율성의 서사 만들기'를 읽기 시작한 건 몇 주 됐지만 처음 서너 쪽을 읽은 게 전부였고 다른 일들 때문에 미루다가 마저 읽은 게 지난 일요일쯤이다. 프리드리히 실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청하, 1995)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는데, 이 대목은 랑시에르의 다른 글들에도 보인다. 그러니까 겹쳐 놓으면 겹치는 부분도 아주 적지는 않다. 따라서 하나의 글만 온전하게 해독할 수 있다면 대강의 요지는 파악한 것이 되며 다른 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법하다. 물론 그 '하나'를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중반쯤 읽다가 나는 그것이 랑시에르 탓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이 글에서 'configuration'란 단어를 역자는 '공형상화'라고 옮기는데('con-figuration'으로 읽어서), 의미를 유추해볼 수는 있지만 '공형상화'는 한국어가 아니다. 그것이 차라리 '콘피겨레이션'이라고 음역해주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지 의문이다(철학계에서는 '위버멘쉬'란 음역도 번역어로 쓰지 않는가). 혹은 그냥 '모양새'나 '형태'로 옮기는 건 무식한 일일까?
번역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건 또 어떨까. "이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미감적 파악의 중요한 사례로 그림 장식을 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데, 이 장식들은 어떤 주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성의 장소의 향유에 기여하는 한에서 '자유미'다."(476쪽) 원문은 "It is no coincidence tht in Kant's Critique of Judgement significant examples of aesthetic apprehension were takedn from painted decors that were 'free beauty' in so far as they represented no subject, but simply conributed to the enjoyment of a place of sociability."(139쪽)
"사회성의 장소의 향유에 기여(conributed to the enjoyment of a place of sociability)" 같은 번역은 직역이면서 전형적인 번역투인데, 나라면 "사교 공간을 쾌적하게 해주는" 정도로 옮기고 싶지만, 원문을 바로 떠올리게 하는 장점도 있다. 그런데, 'subject'를 '주체'로 옮긴 건 의문이다. 물론 다의적인 단어여서 '주체'인지 '주제'인지는 매번 문맥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개인적으론 '그림 장식'과 관련되는 것이라 '주제'가 타당하지 않나 싶다. 다른 대목에서 'subject'를 '주제'라고 옮긴 곳도 있기 때문에 역자 나름대로 선택한 것일 텐데,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야겠다.



그렇게 의견이 다른 대목이 더 있다. "시인은 표상적인 주제를 일반적인 형상의 디자인으로 대체하고 시를 무용술이나 선풍기의 회전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한다."(477쪽) 원문은 "The poet wants to replace the representational subject-matter of poetry with the design of a general form, to make the poem like a choreography or the unfolding of a fan."(139-140쪽)
인용문에서 '시인'은 '말라르메'를 가리킨다. 말라르메의 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나 그의 시 가운데 '부채' 연작 같은 게 있었던 듯하다. '선풍기의 회전'(unfolding of a fan)이라고 옮긴 건 '부채 펼치기'를 뜻하는 게 아닐까?('선풍기의 회전 같은 시'는 얼른 연상이 안된다.) 그리고 '안무'란 뜻의 'choreography'는 '무용술'이라기보다는 어원적 의미 그대로 '무용 기록(법)'이란 뜻이 아닐까 싶다. 말라르메는 시어를 통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시를 어떤 춤이나 동작의 기록 같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했다는 것이 말라르메에 대한 나의 얕은 지식에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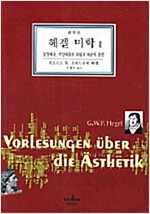

이제 그런 얕은 지식을 가지고 조금더 깊이 들어가보기로 한다. '깊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이라고 해야겠다. 프랑스문학뿐만 아니라 사실 나의 철학적 지식도 교양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적 지식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교양 수준의 사회적 제고와 확산이라고 생각하기에 소소한 교양이라도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공유하고자 애를 쓴다. 가령 나는 <헤겔 미학>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헤겔 미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양 수준에서 알고 있고, 그런 수준에서 "헤겔의 관점에서 볼 때 조각상은 예술이 아닌데, 그것은 이 조각상이 집합적 자유의 표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각상이, 집합적 삶과 그 조각상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사이이 거리를 형상화하기 때문이다."(479쪽) 같은 문장을 읽으면 그게 맞는 말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조각상은 예술이 아니다"?
미심쩍어 확인해본다. 원문은 이렇다. "The statue, in Hegel's view, is art not so much because it is the expression of a collective freedom, but rather because it figures the distance between hat collective life and the way it can express itself."(141쪽) "not so much because A but rather because B"구문으로 돼 있다. A라는 이유에라기보다는 B라는 이유에서 -하다, 라는 뜻이겠다. "헤겔의 관점에서 보자면 조각상은 A라는 이유에서라기보다는 B라는 이유에서 예술이다." 물론 '...is art not...'이라는 연쇄를 '...is not art...'라고 잘못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번역문을 보통은 한번이라도 다시 확인해보지 않는지? 한국어판 편집자 서문은 "좋은 글들을 오역으로 뒤덮어 한탄만 나오게 만드는 문화 속에서 어려운 글들을 꼼꼼하게 손보아 가독성을 높여준 훌륭한 번역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란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오역은 '한탄'은 아니더라도 '한숨'은 나오게 한다. 원문과 대조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다는 뜻이니까.
이 '한숨'은 '긴 한숨'이다. 이런 대목은 어떤가. "조각상은 그것을 생산하는 의지가 타율적인 경우에만 자율적이다. 예술이 더이상 예술이 아닐 때 예술은 사라진다."(480쪽) 이 논문의 부제인 '자율성과 타율성의 서사 만들기'가 무슨 의미인지 가장 확실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목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또한 잘못 옮겨졌다. 원문은 "The statue is autonomous in so far as the will that produces it is heteronomous. When art is no more than art, it vanishes."(142쪽)이다.
나는 이 대목을 읽다가 역자가 이 논문을 직접 옮긴 것이 맞는지(혹은 진지하게 옮긴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다. 요즘은 똑똑한 초등학생도 알 만한 관용구인데, 'no more than'은 '단지, 고작(only)'이란 뜻이다. 이걸 '더이상 -가 아닐 때'라고 직역(?)함으로써 번역문은 "예술이 단지 예술에 불과할 때, 예술은 사라진다"는 랑시에르의 역설을 동어반복으로 바꿔놓았다. 역자나 교열자는 바로 앞문장의 "조각상은 그것을 생산하는 의지가 타율적인 경우에만 자율적이다"이란 역설과 "예술이 더이상 예술이 아닐 때 예술은 사라진다"는 '허무한' 동어반복이 과연 호응한다고 본 것일까?



헤겔에서 벤야민으로 넘어가보자.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가 루이 아라공의 소설 <파리의 농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수잔 벅모스의 인용에 따르면 "나는 밤마다 침대에서 그 책을 읽었는데, 몇 자 읽기도 전에 심장박동이 빨라져 더이상 읽어나갈 수가 없었다. 실제로 <파사젠베르크>의 최초의 메모는 이때부터 씌어졌다."라고 벤야민은 적었다). 그와 관련된 대목이다. "물론 발자크의 진열장을 가장 탁월하게 변모시킨 것은 파리 오페라 거리에 있는 낡은 유형의 우산 상점의 진열대인데, 루이 아라공은 여기에서 독일 인어의 꿈을 인지하고 있다."(484쪽)

'오페라 거리'는 '오페라 파사주(Passage de l'Opera)'를 옮긴 것이다. '오페라 아케이드'라고 옮길 수도 있겠다. 아라공이 <파리의 농부들>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스망 대로를 만드느라고 다 철거됐다 한다(그러니 지금은 파리에 가봐도 구경할 수 없다는 뜻이겠다). 이 아케이드에서도 특히 "낡은 유형의 우산 상점의 진열대"(old-fashioned umbrella-shop)가 자주 언급되는데, '발자크의 진열장'이 '오래된 골동품 진열장'이므로 'old-fashioned'는 '낡은 유형'보다는 '구식'이나 '골동품'이란 뜻으로 새기는 게 더 좋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산 상점(umbrella-shop)'.
<미학 안의 불편함>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다: "바로 그것이 발터 벤야민이 오페라 골목의 낡은 지팡이 가게를 신화적 풍경과 놀라운 시로 변형시킨 아라공의 <파리의 농부>를 읽고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90쪽) 분명 지시대상이 같을 듯싶은데, 하나는 '우산 상점'이고 다른 하나는 '지팡이 가게'다. 우산도 팔고 지팡이도 파는 가게인지, 아니면 불어 단어가 '우산'으로도, '지팡이'로도 번역되는 것인지 오역 여부를 떠나서 궁금하다. 'umbrella'야 우산이 맞지만, <파리의 농부>를 다룬 다른 글들에서도 '지팡이'만 언급되고 있어서 이건 대체 뭔가 싶다.
이어서 낭만주의 시학에서 시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 "그리하여 시인은 단지 화석들을 캐내고 그것들이 지닌 시적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자연학자나 고고학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또한 이상적인 사물들의 신체 그 자체 속에 새겨져 있는 전언들을 간파하기 위해 사회의 어두운 밑바닥이나 무의식 속을 파고드는, 일종의 증상학자가 된다."(484쪽) '자연학자'는 'naturalist'를 옮긴 것으로 흔히는 '박물학자'를 가리킨다. 시인은 박물학자이자 고고학자이면서 동시에 증상학자가 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런데, '이상적인 사물들'은 뭔가? 이게 'ordinary things'를 옮긴 것이다. '일상적인 사물들'의 오타인 것. 번역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고, 출간작업 또한 시일을 다투면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증상학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학은 사회로 하여금 그 자신의 비밀을 깨닫게 만드는 과제를 스스로 떠맡으면서, 정치적 주장과 교의로 가득 찬 시끄러운 무대를 떠나 사회의 심층으로 파고들어가 일상생활의 내면적인 실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수수께끼와 환상을 드러내는 새로운 해석학의 틀을 짠다."(484-5쪽) 여기서도 '일상생활의 내면적인 실재'는 'the intimate realities of everyday life'를 옮긴 것인데, '내면적인 실재'처럼 거창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냥 '일상생활의 친근한 현실' 정도의 뜻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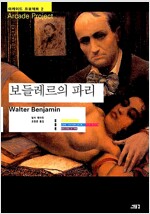


조금 딱딱하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게 옮긴다는 것이 다른 번역본들에서 내가 받은 역자의 번역관인데, 기이하게도 이 랑시에르 번역에서는 부주의하거나 불충실한 대목들이 자주 나온다. "상품 물신숭배가 벤야민으로 하여금 파리 아케이드의 지리와 한가로운 구경꾼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들레르 상상계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485쪽)에서도 '보들레르 상상계의 구조'는 '보들레르 이미지의 구조(sthructure of Baudelaire's imagery)'를 옮긴 것이다. '이미지의 구조'를 '상상계의 구조'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지만 짐작엔 아무래도 'imagery'를 'imaginary'와 혼동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런 심증은 이런 문장을 읽으며 더 굳어진다: "문화비평은 낭만주의 시학의 인식론적 모습으로, 예술의 기호들과 삶의 기호들의 낭만주의적 교환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485쪽) 원문은 "The critique of culture can be seen as the epistemological face of Romantic poetics, the rationalization of its way of exchanging the signs of art and the signs of life."(145쪽) 놀랍게도 '교환방식에 대한 이론적 설명(rationalization of its way of exchanging)'이 '낭만주의적 교환 방식'이라고 엉뚱하게 옮겨졌다. '탈주술적' 번역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착시'에서 비롯되었겠지만 근본적인 오역이라 할 만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마무리짓기로 한다(실수도 너무 자주 반복되면 필연처럼 보인다). 먼저 재현의 문제를 다룬 대목: "감각적인 것과 가지적인 것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의 상실'은 관계짓는 힘의 상실이 아니라 그 형식들이 복수화된 것이다. 예술의 미학적 체제에서는 어떤 것도 '재현 불가능'하다."(490-1쪽) 뒷문장의 원문은 "In the aesthetic regime of art nothing is 'unrepresentable'"(149쪽) 아마 역자도 이런 문장을 번역서에서 봤다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예술의 미학적 체제에서 재현불가능한 것은 없다"라는 랑시에르의 핵심적인 주장을 역자는 정반대로 옮겨놓았다(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가장 나쁜 오역이다). 랑시에르가 보기에는 재현의 가능/불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현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어지는 대목에서 랑시에르가 홀로코스트 재현 불가능론("홀로코스트는 재현 불가능하며, 예술이 아니라 증언만을 허락한다")을 논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오역은 미스테리하다.
그리고 끝으로,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한 랑시에르의 정식화: "미학적 정식이 처음부터 예술을 비예술과 연결하는 한에서, 그 정식은 예술의 삶을 두 개의 소실점, 곧 단순한 삶이 되는 예술이나 단순한 예술이 되는 삶 사이에 위치시키고 있다."(492쪽) 원문은 "To the extent that aesthetic formular ties art to non-art from the start, it sets up that life between two vanishing points: art becoming mere life or art becoming mere art."(150쪽)
'삶이 되는 예술'/'예술이 되는 삶'은 'art becoming mere life'/'art becoming mere art'를 옮긴 것이고, 물론 '예술이 되는 삶'은 '예술이 되는 예술'의 오역이다. 쉽게 말하면 예술의 삶(life of art)은 '삶을 위한 예술'(타율성)과 '예술을 위한 예술'(자율성) 사이에서 진동한다는 것. 랑시에르의 표현으론 이렇다. "미학적 체제에서 예술의 삶은 정확히 말하면 왕복 운동하는 것, 곧 타율성에 맞서 자율성을 실행하고, 자율성에 맞서 타율성을 실행하고,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한 가지 연결에 맞서 다른 연결방식을 수행하는 것이다." 랑시에르의 메시지 전체는 궁극적으로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된다.
한 편의 논문을 갖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랑시에르의 사례를 보건대 한국어판 <뉴레프트 리뷰>를 일반 독자가 읽고 제대로 해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원문을 대조해서, 적어도 참조해서 읽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거나 오독할 수 있는 대목들이 적잖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마도 현재로선 거기까지일 것이다. 조급한 번역과 부실한 교열/편집은 자랑할 게 못되지만 '한국적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의 협량한 출판 풍토' 탓이라고 하면 내가 오버하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 번역은 한 사회의 총체적 문화 역량과 관련된다. "우리 학계의 낮은 담론 수준"에서 결코 높은 수준의 번역이 나오지 않는다. 사회적 보상도 낮고 대우도 부족한 형편에 언제나 '기대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사실이지만 <뉴레프트 리뷰> 한국어판을 들추며 한번 더 확인하게 된다...
09. 02. 21.
P.S. 랑시에르 논문의 오역들을 지적했지만 그 다수는 단순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정오표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한데, 그런 부주의는 왜 대부분의 인문 번역서에 만연한 것일까?). 혹자는 번역비평에 대해 '식은 죽먹기'라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실제 번역작업에 비하면 번역비평의 수고는 약소하다(그래서 보상도 없을 뿐더러 별로 하는 이도 없는 것 아닌가?). 이건 '프로'의 일이 아닌 것이다. 다만 나는 번역의 동업자가 아닌 한 독자로서 내가 지불한 책값이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이다. 그 확인의 방식이 언제나 '식은 죽먹기'다.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이다. '식은 죽'이되 남이 먹다 남긴 죽이니까. 이런 걸로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양서를 읽고 정신을 살 찌우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며 정신건강에도 이롭다. 유감스러운 건 한국어로 그런 양서를 읽기가 쉽지 않다는 것. '식은 죽'이라도 계속 먹어치우면 좀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미학 안의 불편함>의 경우 나는 앞뒤로 조금씩 읽고 더 읽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현학적으로 기술된 글을 완전히 체계와 문화가 다른 언어로 번역을 했으니 이 책을 읽고 단번에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나아가 무례하기까지 한 요구일 것이다."(9쪽)란 역자의 판단을 존중해서다. 그 요구가 독자의 것인지 역자의 것인지는 모호하지만 나는 조심하는 차원에서 예의를 지키기로 했다. 이 책은 올여름에 <미학과 그 불만(Aesthetics and Its Discontents)>이란 제목으로 영역본이 나올 예정인데, 아마도 가을쯤엔 '체계와 문화가 아주 다르진 않은 언어'로 읽을 수 있을 듯싶다(러시아어로는 마지막 장 '미학과 정치의 윤리적 전환'만이 번역돼 있다). 그때까지는 '랑시에르 안의 불편함'이 조금 더 누그러지기를 기대해본다(그의 영화론이나 이미지론도 더 번역되면 좋겠고). 덧붙여, 시간이 되면 <뉴레프트 리뷰>의 다른 논문들에 대한 독후감도 나중에 적어놓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