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책을 <감정의 문화정치>로 할지 <가치 있는 삶>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아마 다 읽게 된다면 감정이 되겠지만. 가치를 올해의 책으로 남기고 싶어서 홀딩한 상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6장. 책임의 윤리학.
그런 책들이 있다. 제대로 읽기 위해서 내 삶을 바꿔야 하는 책들이. 그리고 그런 책이 있다. 나를 바꿔 온 까닭이 이 책을 읽어낼 수 있기 위함이었다는 알게 하는 책들이.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런 저자들을 만난다. 내게 전자는 정희진. 후자는 미셸 푸코.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전자일지 후자일지 물음표인) 사라 아메드. 살아남기 위해 굳혀버렸던 나의 감정을 풀어헤쳐 이해하고 내게 가능한 수준의 언어의 형태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나는 (정희진의) 몸으로 읽는다는 말을 안다. 감정은 (이성의 반대가 아닌) 체현된 사상이라는 문장을 몸으로 산다.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나라는 인간에게 기억이 윤리적 장치였던 것이다.
삶에서 (때로는 역사에서) 어떤 단절과 비약을 염두에 두지만, 단절은 망각이 아닌 기억을 전제한 것이어야 한다. 잊지 않는 까닭이 있다. 반복 강박은 삶이 보내는 신호다. 내겐 다르게 살기 위한 숙제 같은 거였다. 물론 망각은 중요하다. 그것은 새롭게 살 수 있는 여분의 가능성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기억도 중요하다. 기억은 윤리적 장치다. 스스로가 해로운 인간으로 기능하지 않기 위해.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잊어버렸을 것이며, 몸을 다 지워버렸을 거다.

“(189) 기억한다는 행위는 충실함을 의미한다. 기억은 어떤 사건을 우리의 의식에서 지워 내고 싶은 유혹에도 우리가 그 사건이 남긴 흔적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윤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90) 사실 내가 현재에 충실한 삶이라는 이상을 보편적인 삶의 철학으로 대중화하려는 시도가 너무나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과거의 지혜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중략) 우리에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욕구의 관점에서 과거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욕구를 더욱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과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것이 희미해져 가는 과거를 영감이 가득 깃든 삶의 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때때로 가능한 이유다.
(191) 현재를 충실하게 산다는 이상은 (중략)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의 흔적을 더욱 몰아낼수록 과거를 능가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다. 과거가 현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재에 당면한 문제와 과거의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다. 과거가 지닌 무게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며,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오직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를 갖는다는 사실, 기질의 발달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존이 타인의 존재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 책임은 도덕적인 사고 과정을 처리하는 의식적 세계 너머의 무의식적 열정이 머무는 뒤죽박죽 지하 세계까지도 닿는다.
(193)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타인들도 똑같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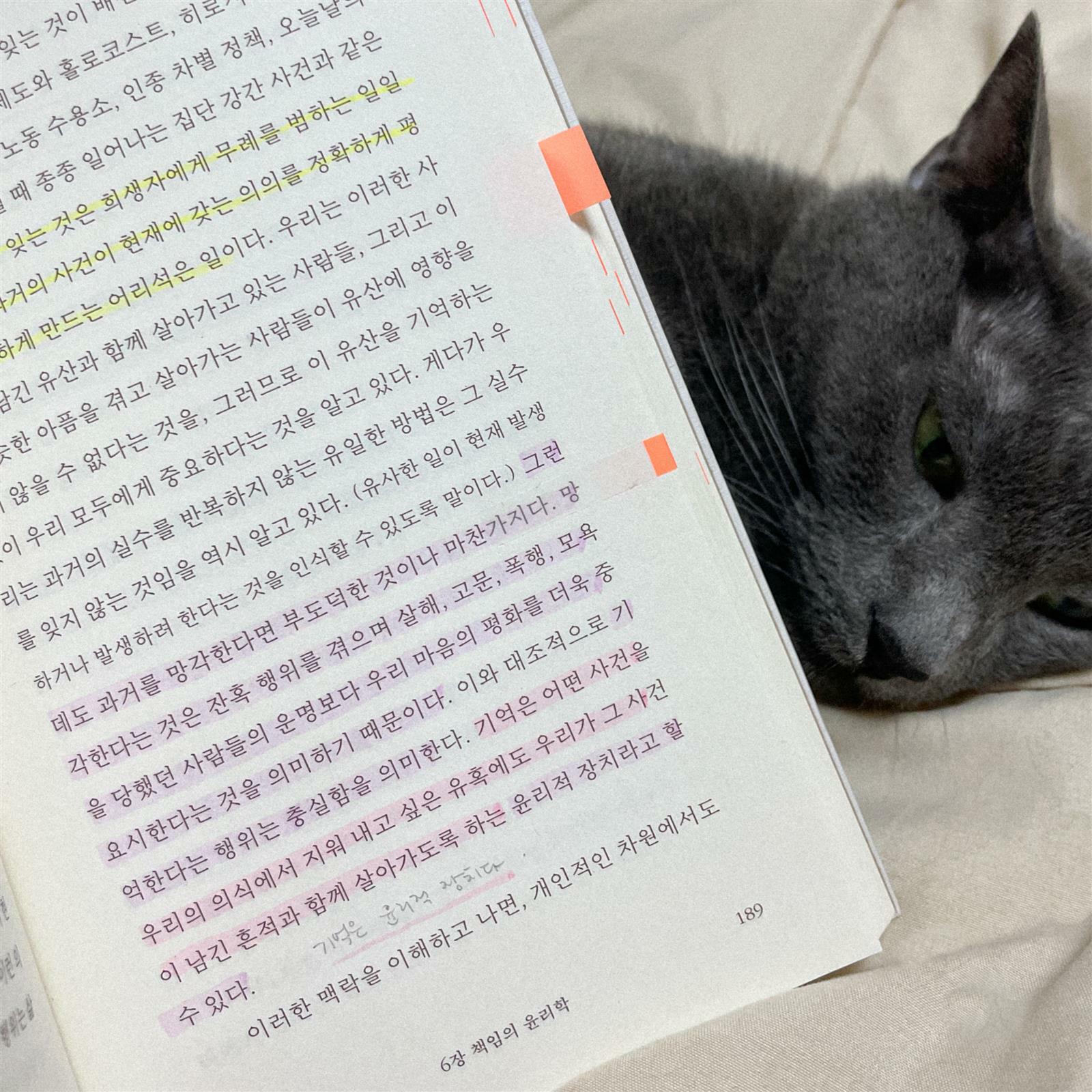
무의식적 열정과 뒤죽박죽 지하 세계. 마리 루티 답다. 무의식이 강요한 일에 대한 책임까지도.
잊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맞춤하게 찾아와 나 자신을 해석하게 하는 독서라는 노동은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모두가 나처럼 읽지는 않는다는 건 내게 자존감이 되었다.)
나는 내 삶을 잘 책임지고자 한다. 그건 오직 나 하나일 테지만 나와 관계 맺은 모든 것과 때때로 내가 잊어버린 그러나 잊지 않으려 하는 기억들과 관계된 일이라 가끔은 벅차고 난망하게 느껴진다.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을 읽고서는 쿨내 진동하며 아예 다 잊고 살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일은 충분히 넉넉히 부끄러워하는 일이겠지. 우리는 부끄럽기 싫어서 사과하고 싶지 않아서 더 무자비하게 망가져가는 게 아닐까. 가끔은 정성들인 것들을 대범하게 망칠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전제를 흔들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게 될 때까지 멀어져야 하는 것이며. 멀어지는 것은 달아나기 위함이 아니라 마주보기 위함이라고.
상처를 기억하는 것. 지금의 삶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 다르게 읽어내며 기억하는 것이. 내게는 #가치있는삶 처럼 느껴진다. 나는 과거와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몸으로 나를 만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다. 다르게.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더 웅크려있기를 처방했던 23년도 딱 16일이 남았다.
기억한다는 행위는 충실함을 의미한다. 기억은 어떤 사건을 우리의 의식에서 지워 내고 싶은 유혹에도 우리가 그 사건이 남긴 흔적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윤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P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