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플] 테스터 모집에 신청하고 사용하면서 알지 못했던 알라디너의 서재에 방문하게 됐고, 그러다 애거사 크리스티의 신간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 마 이 갓!

세상에, 이 표지좀 봐.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이라고 해봤자 몇 개 안 읽어보았지만, 나는 이 스페셜 컬렉션 쪽이 훨씬 좋았던 터라 이 책도 당연히 꼭 읽고야 말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스페셜 컬렉션과 차이가 있다면, 이 표지..인데. 크-
《봄에 나는 없었다》와 《딸은 딸이다》는 슈퍼바이백으로 읽고 바로 팔았다. 그런데 이 책은 어쩐지 팔기 싫은 표지를 하고 있어...그치만, 나는 이성이 있는 여자사람이니까 ... 저런 표지라고 해서 책장에 꽂아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뭔소리여...)
아, 궁금해!! >.<
접힌 부분 펼치기 ▼
[책소개]
애거사 크리스티가 '메리 웨스트매콧'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여섯 편의 장편소설을 모은 '애거사 크리스티 스페셜 컬렉션'의 세번째 작품.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두 남녀가 함께한 삶의 끝에서 비극을 맞이하고, 화자인 주인공이 그 비극 속에 감춰졌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특유의 간결하고 신랄한 문체로 그린 작품이다.
T. S. 엘리엇의 시구 "장미의 순간과 주목朱木의 순간은 같다"에서 모티브를 빌린 이 작품에서 애거사 크리스티는 삶과 죽음, 순간과 영원이라는 대명제 아래, 인간의 계급의식과 인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대해, 자기희생과 연민이라는 명분을 쓴 우매한 가식에 대해, 관계와 소통의 지난함에 대해 호소하면서 인간 심리의 미스터리를 통찰한다.
그리고 햄릿과 맥베스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고뇌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것이 과연 인간을 인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가, 라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휴 노리스는 어느 날 찾아온 낯선 부인의 요청으로 수십 년 전 자신을 슬픔과 경악에 빠트렸던 존 게이브리얼을 만나러 간다. 그러나 허름한 방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던 게이브리얼을 본 순간 충격에 휩싸인다. 추악하고 비열한 협잡꾼이라 믿었던 그 남자가, 한 여자를 비참한 삶으로 내몰았던 그 남자가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영웅이자 구원자인 클레멘트 신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펼친 부분 접기 ▲

애거서 크리스티의 신간 소식을 접하고난 후, 아 또 신간은 뭐가 나왔나, 하고 들어가봤다가 오, 김이설의 소설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도 알게 된다. 내가 김이설 작가와 맺고 있는 관계는 트윗 팔로우가 전부인데, 그간 트윗에서 그녀의 새책 출간에 대해 본 기억이 없던 바, 이 김이설이 내가 아는 그 김이설이냐, 싶어 작가 이름을 클릭했더니, 역시나 그 김이설이 맞았다.
'중편'이라는 분량에 그간 김이설 작가의 다른 책을 자연스레 떠올렸는데, 아마도 분량은 그것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얼굴에 흉터를 가진 여자가 나온다는 책 소개에, 대뜸 '한강'의 <아기부처>를 떠올렸다. 갑자기 아기부처 다시 읽고 싶어지는데 그 책도 이젠 집에 없고...
읽은 책 팔지 말고 가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도 통장에 잔고가 바닥이 되면 어김없이 팔게 되는데, 통장 잔고가 빵이 되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
접힌 부분 펼치기 ▼
[책소개]
<선화>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흉터로 인해 가족과 불통하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담한 문체와 사실적인 이미지들로 조형해내고 있는 소설로,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안고 삶을 견뎌내고 있는 핍진한 일상이 전부인 여자 선화의 삶을 통해 외형적 상처와 흉터가 우리 삶의 내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진지하게 조명하고 있다.
펼친 부분 접기 ▲

그리고 이응준의 '약혼' 이라니!
이 책은 2006년도에 나온 책의 개정판이다. 사실 나는 약혼 이란 제목을 단 이 책이 장편소설이었으면 좋겠다고, 이 가을에 제대로된 연애소설을 한 편 읽고 싶다는 기대를 충족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내 기대와는 달리 이 책은 아홉편의 단편이 실린 단편집이란다.
이응준의 소설 《내 연애의 모든것》을 재미있게 읽은 터라, 그의 연애소설을 또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단편소설이라니 어쩐지 맥이 빠진다. 그래도 무려 '약혼' 인데!
크- 묵직한 로맨스 소설-그러나 시대물은 아닌-을 읽고 싶은 내 바람과는 어긋나지만 '약혼'이란 타이틀로 어떤 연애가 진행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 책, 9월말까지 알사탕 300개를 준다...흠.. (알사탕에 무릎꿇지마!!)
접힌 부분 펼치기 ▼
[책소개]
1994년 단편소설 '그는 추억의 속도로 걸어갔다'를 시작으로, 정결하고 투명한 시적인 문체를 사용해 예술에 대한 깊은 열정과 고뇌가 깃든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시인이자 소설가 이응준의 네번째 소설집 <약혼>(2006)의 개정판.
<약혼>에는 '사랑'을 화두로 한 아홉 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약혼'이라는 제목이 주는 환하고 밝은 이미지와는 달리 이 소설집에 실린 모든 작품의 중심에는 죽음이 자리하고 있다. 죽음과 죽음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이야기의 초점인 셈으로, 이는 몸과 영혼, 순간과 영원, 죽음과 불멸, 인간과 신 등의 관계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펼친 부분 접기 ▲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이 책 저 책 욕심을 내보지만 정작 내 책장에 꽂아두게 됐을 땐 읽지 않는 책들로 변해버려 큰일이다. 그러니 이 책도 만약 사들이게 된다면 '읽는 책' 이 아니라 '산 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라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진다. 그때 친구는 내게 '너는 진보와는 거리가 멀다' 고 했더랬다. 이 책을 읽고 있던 친구는 '진보는 개인을 희생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나의 경우에는 '개인의 희생'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나는 맞다고 답하면서, 나 역시 내가 진보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는 내가 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보다는 자유주의자에 가깝다는 사실을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알았으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정작 틀렸을까봐 조마조마한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게 궁금해져서 읽고싶다. 엊그제 남동생과 집에 함께 들어가면서 나누었던 대화도 생각난다. '우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도 자기들이 맞다고 강하게 생각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거야' 라고 남동생은 말했고, 나 역시 그렇겠지, 라고 답했던 그 순간. 나는 다만, 내 주위에 소중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남동생과 같은 방향을 보고 의견을 같이 한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접힌 부분 펼치기 ▼
[책소개]
뉴욕대학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현재 영미권의 가장 ‘핫’한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 책 《바른 마음》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근원에 놓인 ‘바른 마음’을 발견한다. 그동안 윤리와 정의를 다룬 책들이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이트는 직접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혔다.
그가 굳이 ‘바른 마음’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은, 이 도덕이라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서의 힘과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측면을 새롭게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도덕은 사고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과 신체적인 영역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또한 집단적인 힘과 리더십의 문제, 개인의 행복이나 취향의 차원에서도 어떤 신념이나 이념보다 강력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2008년 하이트의 ‘진보와 보수의 도덕적 뿌리’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룬 18분짜리 TED 강의는 게시되자마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종교, 진화와 자기 초월의 행복’, ‘공동의 위협이 어떻게 공통의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는가’ 등 세 편의 강의는 300만이 넘는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화제를 몰고 왔다.
오랜 시간 도덕의 감정을 연구해온 저자는 2008년 TED 강의 내용을 더 확장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2012년 《바른 마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과 지식인으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으며, 학술서로는 드물게 아마존 베스트셀러 10권에 올랐다.
‘인류의 자기 이해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한 책’(뉴욕 타임스), ‘정치, 종교, 인간 본성에 관한 우리의 사고와 대화 방식을 바꿀 만한 책’(미국공영라디오 NPR), ‘도덕의 세계가 가진 풍부한 복잡성과 그것에 잠재된 융통성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 책’(커커스 리뷰) 등의 찬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적 언론들이 앞다투어 그를 주요 사상가로 선정했고, 심리학계는 물론, 정치, 경제 분야에서도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펼친 부분 접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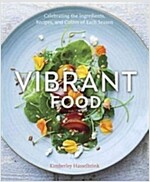
그리고 이 책은...흑 ㅠㅠ
홍콩의 서점에 들렀다 메모한 책, 《Simply Italian》의 제목 밑에는 또 한 권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Vibrant Food》가 그것이었는데, 나는 그간 나의 메모장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검색하기를 미뤄왔다. 제목만 보면 안땡겨, 그렇지만 뭔가 갖고 싶어 적어놨겠지, 그러니 안돼, 보지마, 검색하지마...ㅠㅠ
그러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검색했고 이런 표지를 맞닥뜨렸다. 아 .. 씨양.. 욕나와.. 갖고 싶어.. 심지어 알라딘에서 팔아!! ㅠㅠ 왜팔아 왜, 팔지말지, 왜왜왜왜왜!! ㅠㅠ
나는 팔아도 욕하고 안팔아도 욕하는구나 ㅠㅠㅠ
책소개를 일단 가져는 오겠지만 영어라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 책소개 읽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저건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책이라고. 그러면 내가 흥미를 뚝--- 떨어뜨릴 수 있을텐데! ㅠㅠ
접힌 부분 펼치기 ▼
[책소개]
The vivid colors of fresh produce inspire this artistic collection of whole foods recipes from the creator of the acclaimed blog The Year in Food.Kimberly Hasselbrink, photographer and creator of the acclaimed blog The Year in Food, invites you to look at ingredients differently and let their colors inspire you: the shocking fluorescent pink of a chard stem, the deep reds and purples of baby kale leaves, the bright shades of green that emerge in the spring, and even the calm yellows and whites of so many winter vegetables. Thinking about produce in terms of color can reinvigorate your relationship with food, and in this collection of recipes, Hasselbrink employs aesthetics, flavor, and texture to build gorgeous yet unfussy dishes for every season. Recipes take you on a journey through spring’s Pasta with Nettle Pesto and Blistered Snap Peas, summer’s Berry?Coconut Milk Ice Pops, fall’s Turkey Burgers with Balsamic Figs, and winter’s Sparkling Pomegranate Punch. Featuring photo pairings that celebrate not only the finished dishes but also the striking ingredients that create them?plus a photograph of each and every recipe?this book reveals an artistic picture of whole foods eating.
펼친 부분 접기 ▲
[북플]어플을 깔고나니 북플 사용자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렀을 경우 내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건 피씨버젼 알라딘 서재를 쓸 때의 '공감'의 횟수에 더해지는데, 나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질 않아 '좋아요'란 기능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사용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몰랐다. 그런데 어제, 누군가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누가' 눌렀는지를 내가 알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생겼다. 딱히 좋다는 느낌도 그렇다고 딱히 나쁘다는 느낌도 아니었는데, 다만 '누가 눌렀는지 꼭 알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역시..잘 모르겠다.
또한, 타 SNS 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에게 '친구신청'했다는 사실이 당연히 알람이 온다. 이건 피씨에서 서재를 썼을 때는 알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기능이다. 내가 신청을 '수락'하지 않아도 내 글을 보는 건 가능할 터, 나의 경우 알라딘 서재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을 즐찾하지 않고 알라딘 서재의 최근글에서 올라오는 거의 모든 글들을 읽었던 바, 상호 친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게는 괜찮다. 어차피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 내게 신청했을 때는 '너도 같이 신청해'의 의미일까? 이 역시 잘 모르겠다. 트위터는 누가 나를 추가하든 말든 별 신경쓰지 않았는데 북플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 내가 이미 알라딘을 오래 사용해오던 사람이라 다르게 생각해서일까?
북플이 스맛폰에 깔리는 순간, 그간 알라딘을 이용하던 것과는 다른 식의 접근, 다른 식의 반응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더 좋을지 어떨지도 또 잘 모르겠다. 나는 식당도 갔던 곳만 가고, 직장도 한 곳을 오래 다니고, 블로그도 사용하던 것만 사용하던 사람이라, 이 새로운 어플에 과연 제대로 적응을 해낼 수 있을지,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새로운 사람, 그들을 통해 알게되는 새로운 책들은 반갑지만, 사실은 조금 두렵다. 뭔가가 크게 달라질까봐. 나는 낯을 가리는 매우 수줍은 사람인데...
뭐, 그렇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