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오전 수업만 있었던 날,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Dhoby Ghaut 스테이션은 빨간 라인과 보라색 라인이 함께 다니는 역이고, 나는 여기에서 보라색 라인을 타고 Woodleigh 역에서 내린다. 환승역이니만큼 사이즈도 크고 사람도 많은데, 열심히 보라색 라인 타러 걸어가는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유공?' 하고 부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로이드밖에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나는 돌아보았고, 거기엔 로이드가 서있었다.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만난건 처음이고, 그게 아마 로이드는 놀랐나보다. 그래서 유공이 정말 맞는지 궁금했는가보다. 유공? 하고 끝을 올린거 보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여간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로이드, 우리 방금 학교에서 헤어졌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이드는 나한테 너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너는 저기서 타는거야? 묻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러자 로이드는 나는 저쪽이야, 하면서 빨간색 라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나랑 반대방향인데 ㅋㅋ 나 부를라고 온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넘나 귀여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아 그래 안녕~ 이러고 헤어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이드야, 내가 좋으니?
로이드야, 내가 엄마 같고 막 그러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이드는 이제 해가 바뀌어 17세가 되었겠구나. 같은 클라스의 많은 학생들이 아마도 여전히 십대일 것이다. 물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일찌감치 외국으로 유학보내는 부모들은 있었지만, 극히 드물었다. 대학 생활중에 어학연수도,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과에서 손에 꼽을만큼 적은 수였다. 없지는 않았지만, 적었다. 해외어학연수라는게 있대, 라는건 알았지만 그게 내 얘기가 될 수는 없었다. 가보고 싶어서 집에 말해보았지만 엄마는 반대했다. 도무지 해외에 혼자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였다. 나는 엄마의 말에 수긍했었다. 아마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었나보다,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오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내가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가며 이제 신입직원 면접관이 되었을 즈음에는, 입사지원자의 대부분이 어학연수 경험을 갖고 잇었다. 나는 그 입사서류들을 보면서, 아.. 만약 내가 지금 이들과 같이 학생이었다면, 내 스펙은 너무 초라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다. 어학연수 없이도 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취업했던 거구나.
지금 이곳에서 많은 십대 학생들이 혼자 거주하면서 공부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들의 부모들은 저들을 혼자 해외로 보낼 수 잇었을까 생각한다. 그들 부모에게는 나의 부모와는 다른 뭐가 있는걸까, 생각해본다. 돈을 들여서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 공부시키는 것. 그 생각을 언제, 그리고 왜 하게 됐을까. 이제 젊은 부모들에게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일까? 물론, 젊은 부모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나이든 부모라고 다 내 부모랑 같은건 아니다.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나는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속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은 분명 잇었다. 집 앞에 큰 과일 나무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그 큰 집에 청소년 주인공 엘리오(티모시 샬라메)의 부모들이 언제나 공부하는 사람을 손님들로 받아들인다는게 놀라웠다. 엘리오의 부모 모두 학자였고, 그래서 그 집은 언제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었다. 공간과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때로는 그들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어떤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가 같은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던 집인거다. 엘리오는 그런 집에서 자랐다. 아빠가 언제나 책을 읽고 손님들과 지적수준이 높은 대화를 하고, 엄마는 외국어로 된 책을 읽는 그런 집. 그런 엘리오는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집밖에 나가서도 작곡을 슥슥 해보는, 그런 학생이었다. 저렇게 공부하는 부모님과, 또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보면서 엘리오에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건 뭘까? 나는 그 환경이 참 인상적이고 부러웠다. 저런 환경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됐다. 그런 환경이라고 내가 엘리오처럼 심심하면 공부하고 습관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런 환경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말로 하는 훈육보다는,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게 중요하다. 욕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천 번 말해봤자 부모가 욕을 하면 아이도 욕을 학습하게 된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책을 읽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책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책을 읽을 확률은 매우 낮다. 물론, 내 경우엔 집에서 아무도 책을 안읽었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되긴 했지만.

'곽아람'의 [공부의 위로]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이 생각나는 책이다. 곽아람 작가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내내 노트필기를 잘해서 자신의 노트를 보고 인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이 정말 매우 놀라운데, 나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점인데, 그런데 곽아람 작가에게는 이미 어릴적부터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시를 듣고 시각적 이미지를 그려보는 데는 익숙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종종 시를 들려주고는 거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종이에 그려보라고 했다. 엄마가 즐겨 읽어주던 동시 중 정한나 시인의 <비둘기>라는 시가 있었다.
회색의 부리로 아침을 물어다 날라
벼랑 끝 바위에다 마구 비비면
잠든 바다는 한껏 기지개를 펴고
비둘기 날개 끝에서 쏟아지는 금빛 아침에
세상은 온통 은빛 햇살로 출렁인다
이 시를 듣고, 아버지가 가져다준 갱지에 태양을 물고 벼랑으로 날아드는 새를 볼펜으로 그렸던 기억이 난다. -p.87~88
어릴 적에 시를 읽어주는 부모라니, 읽어주는 데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하다니. 내게는 너무나 엄청난 환경으로 느껴진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 물론, 그런 환경에 놓였다고 누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건 아니지만 말이다.
곽아람 작가는 이 책을 '모범생을 위한 변명' 이라 얘기하는데, 정말로 모범생이었다. 나도 학창시절 모범생이기는 했지만, 공부를 못하는 모범생이었다. 흠. 이건 말이 성립이 안되나? 하여간 노트필기도 잘하고 수업도 잘 듣고, 게다가 서울대 특유의 분위기인건지 곽아람 작가 주변사람들만 그런건지, 좋은 강의가 있으면 서로 추천을 해줘서 다음 학기 강의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곽아람 작가가 들었던 수업들은, 그것이 문학에 관한 것이든 외국어에 관한 것이든 미술에 관한 것이든 다 너무나 훌륭했다. 나는 부모가 어릴 적부터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준 저 87페이지에서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이 생각났는데, 읽다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또 생각난다. 3학년 때 들었던 <독일명작의 이해> 과목 교수님은, 자신의 집필실을 개방해둔 것이다.
수강생 중에서도 특히 선생님을 따랐던 B는 "'오마토'와 '시마토' 라고 불리는 매년 오왈과 시월 마지막 토요일이 선생님의 여주 집필실에 제자들이 모이는 날"이라며 "토요일에 여주엘 가지 않겠냐?"고 했다. 선생님이 10년 전에 폐가가 된 여주의 한옥을 매입해 강의가 없는 날이면 거기서 지내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가봐야지' 하던 참이었다. 그렇게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11년 만에 다시 독일 명작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 주 토요일, 차를 몰고 여주로 향했다. 선생님은 여주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져 논밭 한가운데 자리한 외진 동네에 살고 계셨다. 전화를 드렸더니 "바쁜 사람이 어찌 왔냐?"며 깜짝 놀라신다. 마당에 석등이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처마 끝 곳곳에 풍경과 램프가 걸려 있는 아름다운 집. 선생님의 침실인 다락, 자그마한 거실 겸 서재, 손님 방, 학생들 MT 용으로 지어 붙인 방, 시렁을 얹은 주방, 상추와 미나리가 자라는 텃밭.. 쓰시던 책상과 작고한 어머님이 물려주신 재봉틀을 제외하곤 모든 가구는 주워 온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날 가장 먼저 온 손님이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와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밥을 해 먹으며 머물다 간다고 했다. 선생님이 안 계실 때도 집은 열려 있고, 오마토와 시마토 때 밤늦게 온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저마다 알아서 침낭을 찾아 눕는다고 했다. "오늘은 누가 오나요?" 여쭤보자 "나도 몰라. 매번 다르거든. 그게 재미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p.221~222
와- 제자들을 위해 집필실을 개방한 교수도 놀랍고, 그런 교수에게 정말 찾아가는 제자들도 놀랍다. 나는 대학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참 놀라웠다. 어쩌면 내가 다닌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때는 아니었다. 물론 지금 안다고 해도 내가 교수님의 집필실에 찾아갈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주어져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환경이 주어졌다고 누구나 그걸 제대로 이용하며 살 수 있는건 아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교수님의 집필실에 찾아가는 학생이 아니었고 또 지금도 아니라면, 이제는 나의 집필실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오게할 순 있지 않나.. 나는 여성주의 모임 더덕단 있을 때도, 그렇게나 사무실 한 칸을 마련하고 싶었더랬다. 지금 다시, 그 꿈이 생긴다. 나도 작업실을 만들자. 작업실을 만들어서 개방하자. 공부하는 사람,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이건 집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사적인 공간을 수시로 내어주게 되니, 작업실을 따로 마련하자. 그런데 작업실을 마련하려면 돈이 든다...

'아자르 나피시'의 책 [테헤란에서 롤리타를 읽다]는 독서 모임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는, 자신의 집을 독서 모임 장소로 개방한다. 그래서 독서 모임이 열릴 때 이 집에서 모이는데, 누군가의 집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개방하는 곳이 '내 집'인 것은, 역시 좀 저어되는 면이 있다.
그리고,
곽아람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인 작가, 미셸 자우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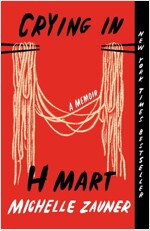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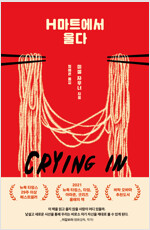
Neither one of my parents graduated form college, I was not raised in a household with many books or records, I was not exposed to fine art at a young age or taken to any museums or plays at established cultural institutions. My parents wouldn't have known the names of authors I should read or foreign directors I should watch. I was not biven an old eition of Catcher in the Rye as a preteen, copies of Rolling Stones records on vinyl, or any kind of instructional material from the past that might help give me a leg up to cultural maturity. But my parents were worldly in their own ways. They had seen much of the world and had tasted what it had to offer. What they lacked in high culture, they made up for by spending their hard-earned money on the finest of delicacies. My childhood was rich with flavor-blood sausage, fish intestines, caviar. They loved good food, to make it, to seek it, to share it, and I was an honorary guest at their table. -p.23
부모님은 모두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자란 집은 책이나 레코드로 가득찬 집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예술작품을 구경하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그럴듯한 문화시설에서 연극을 관람하는 호사를 누리지도 못했다. 우리 부모님은 아마 내가 읽어야 하는 작품의 작가나 내가 봐야 하는 외국 영화 감독의 이름 하나 몰랐을 것이다. 중학생이 된 내게 [호밀밭의 파수꾼] 구판본도 건네주지 않았고, 롤링스톤스 레코드판이든 뭐든 내가 문화적으로 서욱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어떤 학습 모델도 소개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두 분만의 방식대로 쌓인 세상 경험이 풍부했다. 두 분은 세상을 실컷 구경했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원 없이 맛보았다. 비록 고급문화에는 문외한이었지만 그 결핍을, 자신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세상 최고의 산해진미를 맛보는 것으로 만회했다. 나는 순대며 생선 내장이며 캐비아 같은 음식을 마음껏 맛보면서 풍족한 유년기를 보냈다. 부모님은 맛있는 음식을 사랑했고, 그걸 만들고 찾앚다니고 함께 즐겼으며, 나는 그들의 식탁에 초대받은 특별 손님이었다. -전자책 중에서
미셸 자우너의 부모님은 문화적 환경을 여유롭게 제공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미셸 자우어는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나의 경우에도 어릴 적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본 경험이 없고, 또 집에 책도 딱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다. 읽는 사람만 된게 아니라 엄청나게 사들이는 사람이 되기도 해서, 돈을 버는 순간부터 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책에 갇혀 살고 있다. 하하하하하. 그렇다고 보면, 환경이 언제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릴 적에 집에서 책 읽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나는 부모님이 책 읽는 모습을 본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사람이 되었던거다.
미셸 자우어가 자란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자본이 갖춰져잇지 않았던 그 환경이 나의 것과 닮았지만, 미셸 자우어는 그것에 대해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 저런 환경이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를 간혹 생각해보긴 하지만, 나는 나의 엄마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잊지 않았으며, 엄마는 미술그림을 보고 돌아오는 내게 '그거 돈 주고 보는거냐' 묻는 엄마였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엄마를 미술관에 모시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엄마가 나를 이끌었고 나를 지원했다. 어릴 적에 외국에 공부하라고 보내는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다.
곽아람의 책을 읽는게 즐겁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 나 열심히 했었노라 읽는게 신선하고 좋다. 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 안했던 일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많을텐데, 곽아람은 자신이 열심히 했노라고 말하고, 그리고 곽아람의 책은 바로 그 증거이다. 나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삼주정도 남겨두고, 아, 나 열심히 공부했어야 했는데, 사실 좀 후회하고 있다. 왜 늘 후회하는걸까?
이 페이퍼 쓰다말고 충동적으로 영상 찍었다. 사실 이만큼의 책을 읽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올려봤다.
아니, 아직 올렸다고 말도 안했는데 벌써 조회수가 10 이네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늘은 오후 수업이다. 프렌치 토스트 얼렁 해먹고 학교 가야겠다. 눈누난나~
앗 비 올 것 같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