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지만
나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지만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다! 바이닝거는 유대인으로 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었다. 가정부는 가수의 관심을 절대 받지 못하는 무명의 인물로 있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가수의 눈에 가정부는 이름 없는, 가난한 처녀일 뿐이었다. 그래서 탈출구는 죽음뿐이었다. 있을 수 없는 것은 실제로도 있어서는 안 되니까. 혐오스러운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유대인이 아닐 수 있는 현실의 길은 죽음이었다. 가정부도 마찬가지다. 가수의 눈길 한번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사느니,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부정의 길이 곧 자살이었다. 하지만, 이 길은 길이 아니다. 그 어디로도 이끌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바이닝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하던 불쌍한 처녀가 죽었다고 가수의 품 안에 안길 수야 없지 않은가. 결국 자유죽음은 ‘무의미‘하다. 이 말은 모든 경우에 남김없이 적용될까? - P61
오래전에 읽어 기억이 희미하긴 한데,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좀머씨 이야기》는 화자가 어린 아이다. 늘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는 좀머씨를 이야기하는 어린 화자. 이 화자는 피아노학원에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는데, 어느날 선생님이 코를 판 손으로 건반을 누르는 바람에 코딱지가 피아노에 묻어있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다음에 쳐야할 건반이 바로 그 건반이 아닌가. 저 건반을 누르기 싫다, 그렇다면 코딱지가 손에 묻게 된다. 그 건반을 치길 망설이노라니 선생님은 자꾸만 윽박지른다. 얼른 치라고, 치라고! 하는수없이 이 소년은 그 건반을 치고 학원이 끝나는 길에 너무 치욕스러워 죽고자 나무를 타고 오른다. 죽자, 죽어야 된다, 선생님의 코딱지라니, 수치스럽다, 치욕스럽다, 죽어야 한다! 아마 그 올랐던 나무 위에서 또다시 걷는 좀머씨를 소년은 봤던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도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소년은 죽으러 올라갔으나 죽지 않고 살아 내려온다. 내가 왜 코딱지 때문에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 왜 코딱지 때문에 죽어야 해?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코딱지 때문에 죽고자 했다면 그 코딱지는 내가 생각하는 코딱지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코딱지에 대한 치욕과 수치의 정도가 달랐던 것일테다. 야 코딱지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말도 안돼, 살아! 그러나 그 사람은 코딱지를 건드린 자기 자신을 도저히 이 세상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른다. 우리는 각자 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장 아메리의 책 《자유죽음》에서 가져온 인용문 61페이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살고 싶지 않다, 좋아하는 가수의 관심이 없는 삶이라면 내게 그 삶은 의미가 없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내가 뜯어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존재이며 정체성이니까. 가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가치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정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인데, 그러나 가정부에게 그것은 너무나 크다. 자신의 삶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장 아메리의 책에 이런 사례는 실제 인물과 소설속 인물들을 포함하여 몇 가지 더 나오는데, 시험 성적이 안좋아서 죽기를 결정하는 소년이 나오고, 소위라는 명예를 잃게 되는게 너무 치욕스러워 죽기를 결심하는 인물이 나온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사실은 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 일은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다른 더 큰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미래는 예측불허 이므로 살다보면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구나 깨달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에게도 정말 그럴까? 이미 내 앞에 닥친 이 어떤 것이 나에게 너무 큰데, 이것은 내 삶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고 싶을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견뎌내야 할까? 이런 내가 이런 삶이 싫어서 나는 없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존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죽음 일 것이었다.
나는 장 아메리가 말하는 자유죽음의 의미를 알겠고, 그것이 자신을 살해하는 자살과 다르다는 것을 알겠다. 자신의 치욕 자신의 수치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없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알겠다. 리뷰에 썼던 것처럼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은 것이 많은데, 그건 '나 자신을 학대로 밀어넣음으로써 나 자신의 주체를 확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였다. 샐리 루니의 소설 《노멀 피플》에서 메리앤이 자신을 때려달라고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말했던 일이 그렇다. 아빠와 오빠가 어린시절부터 나에게 가했던 폭력은 내 통제 밖의 일이었고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 맞닥뜨린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랑 섹스하는 남자에게 '나를 때려줘'라고 말하는 일은 내가 시킨, 내가 정한,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누군가 나를 때리는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서 내가 나의 주인임을 자각하고자 하는 일을, 그전보다 나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 이런 일들을 듣거나 읽거나 보게 되는 것은 그저 고통이기만 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너의 존재에 주체성을 부여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스며들게 된것이다.
강간판타지 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오래 그리고 늘 생각해왔다. 강간당했던 그 폭력의 시간은 고통이었고 통제할 수 없는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다면, 그러나 내가 지금 섹스하면서 강간을 당하는 설정을 만든다는 것은 그 통제할 수 없었던 시간을 벗어나 자신의 통제 안에 그것을 두려 함이겠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학살 속에서 견디어 냈으면서도 종국엔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도 나치의 학살은 내 통제 밖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끝내는 것을 나는 내가 통제하겠다, 는것. 그 지점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거다. 그러나,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거'가 없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장 아메리의 책을 읽고 이 지점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책을 읽고난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나 메리앤이 선택한 것, 강간 피해자들과 전쟁의 피해자들, 역사적으로 학대의 생존자들이 죽음을 선택한 것은, '자유죽음' 보다는 자살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그 일이 없없다면,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다. 메리앤에게 아빠와 오빠의 폭력이 없었다면, 메리앤이 굳이 주체성을 가져오기 위해 섹스중인 남자에게 '나를 때려줘'라고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에게 성폭력이 없었다면, 굳이 섹스중인 상대에게 '나는 강간판타지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전쟁이나 민족학살이 없었다면, 그들이 내 죽음을 내가 선택한다고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내가 결국 내 죽음을 선택했으므로 이것은 자유죽음인가? 하면 나는 고개를 젓게 되는 것이다. 그 죽음이 그들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의 죽음 자체에 대해 존중을 보낼 수 있을 지언정, 그러나 그것이 자유죽음인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데에는 순전히 자기가 결정했던 일들만이 채워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좀머씨의 소년과 그리고 가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가정부와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 코딱지를 눌렀던 나, 가수를 좋아하는 나, 시험을 망친 나,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음 같은 것들은 설사 본인에게 엄청난 치욕이었을지언정 그것이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아 코딱지는 좀 다르겠다) 그러나, 폭력은, 강간은, 학대와 학살은 다르다. 그것은 누군가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 것이고 그것은 내 통제 밖의 일이었으며, 그것이 '나의' 치욕이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피해자가, 생존자가 그것을 치욕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아빠가 나를 때린게 치욕스러워, 강간범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게 치욕스러워, 나는 이 삶을 끝내고 싶다, 는 그것이 내가 결정해야 하는 나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다. 그 수치는 그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가해자의 것이 되어야 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한 폭행자의 것이 되어야 하고 강간을 한 강간범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학대와 학살을 일삼은 가해자들이야 말로 수치와 치욕을 느껴야 했는데, 그런데 피해자와 생존자가 그것을 느끼고 이런 삶을 버틸 수 없다, 고 죽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살해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든 약을 먹었든, 그것을 '행한' 것은 나일지언정, 나를 그렇게 행하게 만든 것은 '나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다. 그것을 행하게 만든 것은 '가해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자유죽음이 아니라 자살, 자신을 죽인것이 되지 않나. 그러나 여기에서의 자신을 죽인것이, 정말 '나 자신'인가? 이것은 자살인가? 그래서 나는 자살과 자유죽음은 그 사이에 아주 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자살은 자유죽음이 아니고 자유죽음은 자살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소설 《다시, 올리브》에는 공부를 잘하고 인기도 많았던 여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자살하게 된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알고보니 어린 시절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것. 결국 집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에게 죽음을 내린다. 이것은 자유죽음일까? 한 여성의 삶이 중간에 끝나버려 없음이 되는 것,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죽음을 그녀에게 행한 것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죽음인가? 장 아메리도 자유죽음을 자살과 구분한다. 처음부터 그걸 다르다고 언급하고 시작한다. 자유죽음은 자살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나 역시 동의한다. 이것은 이렇게나 다르니까.
But he remembered where he was-right outside the main gorcery store here in town-when he found out that she had vinished Vassar and then killed herself. It was Trish Bibber who told him, a girl they had been in school with, and when Denny said, "Why?, " Trish had looked at the ground and then she said, "Denny, you guys were friendly, so I don't know if you knew. But there was sexual abuse in her house."
"What do you mean?" Dinny asked, and he asked because his mind was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this.
"Her father," said Trish. And she stood with him for a few momints while he took this in. She looked at tim kindly and said, "I'm sorry, Denny." He always remembered that too: Tisht's look of kindness as she told him this.
So that was the story of Dorie Paige. -p.144-145
하지만 그녀가 바사를 졸업하고 자기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기억했다-타운의 큰 식료품점 바로 앞이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녔던 트리시 비버였다. 데니가 "왜 그랬대?" 하고 물었을 때 트리시는 땅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데니, 너희 둘이 친하게 지내서 혹 알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집에서 성적 학대가 있었대."
"무슨 뜻이야?" 데니가 물었다. 자신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랬대." 트리시가 말했다. 그리고 데니가 그 말을 이해하는 동안, 잠시 그와 함께 서 있었다. 트리시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참 안됐어, 데니." 그는 그것 역시 늘 기억하고 있었다. 소식을 전할때 트리시가 보여준 다정한 얼굴.
도리 페이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책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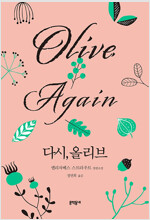

아침부터 이 긴 글을 꼭 써야했다. 혹여라도 수많은 어떤 여성들과 남성들의 자살이 자유죽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까봐, 그렇게 가해자들이 빠져나갈까봐. 너네 죽음을 너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고 제삼자가 말하게 될까봐. 그렇게 그 사이에 있던 폭력과 학대를 못본 척 할까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이 생각이 내게 내내 있었다. 어떤 '살아야 해!'는 그것이 단지 내 기준에서의 삶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어떤 '살아야 해!'는 그 수치가 네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치욕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당신의 것이라 생각해서 죽음으로 걸어가는 일을, 당신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고 말하고 싶다. 그 치욕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Mauritshuis 를 갔을 때 본 사진이 생각나 가져온다. Morad Bouchakour 의 작품 <Traces (part2)>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