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카미 하루키는 정말 에세이 잘 쓴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올 정도의 유려한 문장과 가슴을 파고드는 애잔함이 있어서는 아니다. 우리가 흔히 에세이 잘 썼어 라고 할 때의 그 느낌이 아니란 말이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으니 이게 정답이다 하진 못하겠고, 암튼 하루키씨는 그냥 그런 올림픽 관련 이야기도 참 재미나게 쓴다. 계속 읽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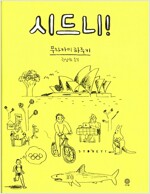
이 노오란 책을 매일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도 고백한다.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무겁고 부피도 많이 나가고. 나의 작은 백팩에 쑤셔박다가 결국 표지를 부욱... 찢어버려서 스카치테이프의 힘을 빌려 밀봉시켜 두었다. 아 그 부욱.. 소리 기분 정말...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 매일 가지고 다녔다. 심지어 미용실에도 들고 가서 읽었다. 미용실 잡지를 안 좋아해서 가끔씩 책을 들고 가긴 하는데, 남들은 다 잡지 읽는데 나혼자 책들고 있는 게 좀 쭈뼛스러워서 그냥 머리에 안 들어오는 잡지들을 졸다말도 보곤 했는데, 이번만큼은 이 노오란 책을 떡 올려놓고 오고가며 계속 읽었다.
왜? 재밌으니까. 뭐 다른 이유 있겠수?
근데 알고보면 이 책이라는 게 그렇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뭘 먹었다. 어딜 달렸다.. 이런 게 거의 매일 반복된다. 그게 얼마다 도 있고 ... 맥주는 뭘 먹었다, 저녁엔 몇 시에 잤다, 원고는 몇 장 썼다.. 이것도 매일이다. 이런 일상적이며 일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일기 비스므레한 형식의 에세이가 뭐가 좋다고 말이다...
시드니 올림픽은 기억에 없다. 무슨 올림픽은 기억에 있니? 라고 물으면... 흠.... 황영조가 마라톤 우승했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정도? (무슨 신석기 시대 얘길 하는 듯한 이 기분이란..ㅜ)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내가 시드니 올림픽을 기억했어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결과는 회심의 2루타. 순식간에 2점을 따간 뒤, 예의 노랑머리 4번타자, 김동주가 역시 깔끔한 안타를 쳐서(배트 회전이 빠르다) 승기를 굳혔다. 한국의 동메달이 정해졌다. (p282)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선수, 아니 이젠 과거형인가.. 암튼 김동주가 안타를 쳐서 우리나라가 야구에서 동메달을 따게 했던 바로 그 대회였던 거다. 웅... 그게 시드니였니? 기억이 안나. 그냥 그런 날이 있어서 내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것만 기억이 날 뿐.
하루키의 그 무심하면서도 시크한 표현력은 압권이다. 문장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하루키가 좋은 작가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루하고 별로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올림픽이라는 허영덩어리 소용돌이에서도 그만의 관점에서 뭔가를 엮어낸다는 것일 게다.
우리는 모두-거의 모두라는 뜻이지만-자신의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 약점을 지울 수도 없앨 수도 없다. 그 약점은 우리를 구성하는 일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딘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슬쩍 감춰둘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아 그런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동은 약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여 약점을 자신의 내부로 잘 끌어들이는 것뿐이다. 약점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디딤돌로 새로이 구성해 자신을 좀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얻는다. 소설가에게도, 운동선수에게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원리적으로는 마찬가지다.
나는 당연히 승리를 사랑한다. 승리를 평가한다. 승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기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깊이 있는 것을 사랑하고 평가한다. 사람은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진다. 그러나 그뒤에도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p394)
그래. 아마 올림픽이라는 것. 승자가 독식하는 그 대회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승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해도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것, 기력이 쇠하든, 실력이 안되든, 어쨌든 누군가는 자신만의 약점을 안고 지탱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재화하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
Thank you, Murakami Haru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