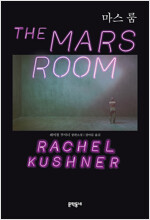
호기롭게 사서 바로 읽기 시작했지만, 다락방님 코멘트대로 그다지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었다. 시공간을 왔다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갔다 하고, 묘하게 눈에 잘 안 익혀지는 이름들 속에서 그 인생들이 헷갈리기도 했다. 그냥 어쩌면 요즘의 내 심정이 심란하고 갈팡질팡하여 그런 지도 모르겠다.
원래 이 시기가 되면, 멍때리는 일이 잦아지는데, 근간에 있었던 사건과 그로 인해 오고간 많은 말들, 공격들이 계속 스트레스가 되어 더 힘들어졌었다.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내 마음을 가르지 못했고 그게 묘한 죄책감이 되기도 해서인지, 더 잦아드는 기분이었다. 다만, 그냥 사는 게 왜 이리 힘든 지 사는 게 뭔지 정말 아무리 시간이 가도 잘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만이 짙어지던 요즘이었다.
이 책은 여자 수형소 얘기이다. 가난하고 사회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입게 된 마약사범, 살인자, 사기범 등의 이름. 그 결과로 가지게 된 장기수, 사형수, 전과자 라는 굴레. 그런 이야기이다.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하는 거다. 가난해서였을까. 못 배워서였을까. 부모가 학대를 해서였을까. 뭐였을까.. 하지만 어쨌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런 '남보다 못한' 배경 때문에 죄라는 걸 짓게 되고, 사법체계는 거기에 그 죄에 엄중한 처벌만을 내린다. 처벌을 그 개인에게 한다는 게 옳은 일인가. 어쩌면 많은 사연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연을 만들어낸 사회나 배경에는 철퇴를 내리기 힘드니 결국 죄를 짓는 '개인'에게 처벌할 수 밖에 없는 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은 하는 것 같다.
제목인 <마스룸>은 주인공인 로미 홀이 일했던 클럽이다. 여자들이 거의 헐벗은 몸으로 나와 '가짜' 애무를 하면 그 주변에 둘러 앉은 남자들이 스스로에게 '진짜' 애무를 하는 곳. 남들은 뭐라 할 지 몰라도 로미는 그 직업이 싫지 않았다. 스트립댄스를 추며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거기에서 번 돈으로 아들 잭슨을 키우는 생활. 그러다가 지미 달링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애인이 되었고 그럭저럭 재미있게 살만하다 싶은데, 커트 케네디라는 스토커를 만나 결국 집에까지 좇아 들어온 그 자를 쳐서 죽였다. 29살 나이에 종신형 두 번 추가 플러스 6년을 받아 영원히 감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오래 살 계획은 없다. 그렇다고 짧게 살겠다는 것도 아니다. 내게는 그런 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다. 문제는 계획이 있든 없든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획 따윈 무의미하다.
그러나 계획이 없다고 후회도 없는 건 아니다.
내가 마스 룸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소름 끼치는 커트 케네디를 만나지 않았다면,
소름 끼치는 커트 케네디가 나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는 마음먹었고, 그러고 나니 끈질겼다. 저 일들 중 어느 하나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콘크리트 구덩이 속 인생을 향해 달리는 버스에 타고 있지는 않았을텐데. (p26-27)
호송되는 버스 안에서 지난 인생들을 훑으며 로미는 이런 후회를 한다. 인생이, 참 그런 것 같다. 납득 안되는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다보면, 과거에 그 결과를 일으켰으리라 예상되는 여러 원인들에 생각이 닿게 되고 그 때 그걸 안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지 라는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정말 잔인한 것은, 인생은 그냥 one-way라는 것. 돌이킬 수 없는 한 방향. 후회한다 해도 영화처럼 그 선택의 순간에 돌아갈 길은 없다.
"감옥에서는 말이야,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할 수 있어. 내 말은, 진짜로는 모르지. 예측이 불가능해. 근데 그 예측 밖의 일들마저도 다 따분할 뿐이야. 비극적이고 끔찍한 뭔가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아냐. 내 말은, 물론 벌어질 수 있지. 당연히 벌어질 수 있지. 하지만, 교도소에서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이미 모든 걸 잃은 뒤니까." (p42)
감옥은 그런 곳이다. 특히 이렇게 장기수이며 무기수인 사람들에겐 더 하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이미 인생의 막장 코스에 올라탔으니까. 그런 사람에겐 외부의 사람과의 연락이 정말 간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소용없다. 애인이었던 지미 달링은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당신이 지미 달링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지 모른다. 편지에 야구 얘기를 쓰지는 않았을망정 인생이 끝장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긴 했을 것이다." (p43) 로미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뭐하러 교도소에 있는 여자랑 연인을 하겠냐고. 그렇게 그들은 점점, 어떨 땐 아주 확, 소외되어 가고 잊혀져 간다.
세상사는 우리가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복잡하다. 인간은 우리가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멍청하고 덜 사악하다. (p266)
인정.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를 담은 문구인 듯 하다. 세상사도 인간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그래서 다들 살면서 계속 실수를 한다. 작은 실수, 큰 실수. 로미 홀은 큰 실수. 근데 그게 그렇게 종신형을 살 정도로 그녀만 잘못한 일인가.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큰 실수로 그녀의 인생은 그냥 망가졌는데. 스토킹이라는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남자가, 그녀가 얼마나 두려웠을 지 얼마나 몸서리쳤을 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이다니, 심지어 아무 것도 가진게 없는 스트립댄서 여자가 흉기를 휘두르다니, 선처의 여지가 없지, 라는 판단 밖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인 나는 그 느낌을 안다. 내 일상 전부가 위협받는 듯한 그 느낌. 뭔가 내게서 소중한 것을 잃을 것 같은 느낌. 무엇보다 그 소름끼침. 그럴 때 옆에 몽둥이가 있다면 힘껏 쥐고 내리치는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우리는 그걸 정당방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걸 안다. 사회에, 남자에, 설명도 안되고 납득도 안되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지.
생각보다 대단히 훌륭한 소설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은 한 책이었다. 내내 좀 불쾌하고 잔상이 남는 이야기라, 요즘 같은 때 읽기 좋겠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겠지만, 읽고 있으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하니 다른 잡생각은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계속 소설을 읽어대느라, 7월 책은 앞의 몇 장만 뒤적이고 아직 진도를 못 뽑고 있다. 200페이지인데, 다른 때 같으면 벌써 끝냈을 분량인데 말이다. 이제 잠시 소설을 놓고 이 책을 봐야겠다. 물론 <캘리번과 마녀>는 매일 조금씩 아주 재미나게 읽고 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조만간 페이퍼를 써야지 작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