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9세기 여성 문학을 읽으면서 조증과 울증을 번갈아 경험하는 신세계 체험중이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그 깨알같은 인간 심리 묘사와 당대 풍속묘사를 통해 19세기 문학의 신세계를 열어보여주며 나를 환호하게 하더니 <노생거 사원>과 <맨스필드 파크>에서 벌써 아 이젠 좀 지겨워 한숨쉬게 하더니....
메리 셸리의 <최후의 인간>은 책을 읽는 내도록 읽기 싫어 싫어 우울함을 주다가 실소가 무엇인가를 중간 중간 알려 주었더랬다.
19세기가 너무 힘들어 잠시 21세기로 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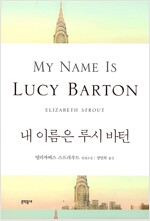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너무 좋다.
<올리버 키트리지>와 <다시, 올리브>이후 손 놓고 있다가 <오, 윌리엄!>을 읽기 위해 루시바턴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3권 다 읽고 감동의 쓰나미에 빠져 헤엄치면서 행복해 하는 중이다.
아! 이제 다시 멘탈 정비를 했으니 19세기로 돌아가보자 하면서 읽은 책이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와 제목 너무 좋지 않나?
그런데 읽으면 읽을 수록, 아니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어쩌라고 하면서 급 우울모드 다시 시작하다가
중간쯤 나온 시 하나에 갑자기 빵 터져버렸다.
명성은 변덕스러운 음식
바꿔놓는 접시에 올려
차린 식탁 한 번에 한
손님 그리고
두 번째는 차리지 않는다
남긴 부스러기를 까마귀들이 살펴보다
묘하게 깍깍대며
푸드득 지나쳐
농부의 옥수수로 가버렸고 ㅡ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죽는다 -61쪽
아 진짜! 까마귀조차 안 먹는 명성 따위에 인간들이 혹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뒤지는 스토리 ㅎㅎ
갑자기 튀어나온 에밀리 디킨슨의 유머감각에 급작스럽게 그녀가 좋아진다.
이제 또 조증모드로 돌입하여 자세를 정비하고 다시 시집을 정독하지만 다시 울증모드 돌입...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이렇게 또 알아듣겠는 시가 하나쯤 나오면 또 희희낙락
예감이란 ㅡ 잔디밭 위 ㅡ 저 긴 그림자 ㅡ
곧 해가 지겠구나 ㅡ
깜짝 놀란 풀들에게 알리는 공지
어둠이 ㅡ 곧 통과합니다 ㅡ
19세기는 정말 다채롭구나
내 얼굴은 울긋불긋 조울증 반복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