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물리치기 위해서인지 혹은 강화하기 위해서인지 알지 못한 채, 저자의 사진을 확인한다. 저자는 백인’처럼’ 보인다. 저자 소개를 읽고, 떠오르는 것들을 노트에 써본다.

오리엔탈리즘 / 에드워드 사이드
호미 바바 / 탈식민주의
도나 해러웨이 / 서구의 영장류학은 유인원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이다
스피박 / 서발턴
노트를 펼쳐 놓고 다시 책을 편다. 첫 장을 넘긴다.
선교의 목적으로 브라질 사람들을 찾아왔던 예수회 수사들이 그들에게 화가 난 이유는 신앙 그 자체에 대한 그들의 복잡다단한 관계 때문(23쪽)이었다. 너무나도 쉽게 ‘개종’의 뜻을 밝혔던 그들은 또한 너무나도 쉽게 원래의 관습으로 돌아갔다.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금지한 ‘악법’은 ‘살육, 식인, 주술사를 가까이하는 것’과 ‘일부다처’였다(56쪽). 소국의 왕이라 불렸던 사람은 선교사들의 모든 가르침, 즉 예배와 세례 등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가지만은 양보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했다. 그건 바로 적에 대한 ‘복수’(34쪽)였는데, 복수하지 못한 운명이라면 수치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다. 저자는 이러한 그들의 변덕스러움, 즉 선교사들의 요구에 100퍼센트 부응하면서도, 원래의 생활 습관을 100% 고수하는 이들의 이러한 행동양식이 ‘복종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다. 야만인이 무엇도 믿지 않는 것은 무엇도 숭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도 숭배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권력의 부재는 개종을 병참학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었다. (62쪽)
그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존재 양식인 복수와 그 구체적인 실천인 식인 행위와 관련해서는, 복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들에게 복수란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99쪽), 사회의 중추적 가치로서, 긍정적인 불완전성을 표현했다. (101쪽) 그 행위의 중심인 ‘식인’은 포획자와 그 동맹들의 집합체에게 적합한 복수의 양상이자 양식(128쪽)으로서, 장수 나아가 불사를 획득하는 여성적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29쪽).
레비스트로스는 식인을 타자와의 근본적인 동일화라는 배경으로부터 윤곽을 드러내는 불안정한 형상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배경은 사회생활의 일반적 조건이라고 할만한 배경이다(Lévi-Strauss 1984 : 143-44). 사교성(sociability)이라는 곡선의 한 극점에 무관심과 소통불가능성이 있다면, 반대극에는 식인주의가 위치할 것이다. 식인은 사교성의 완전한 결여가 아니라 사교성의 과잉을 표현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인의 중단은 어떤 의미에서 투피남바 사회의 근본적인 차원의 상실을 뜻할 것이다. 근본적인 차원이란 적과의 '동일화’, 말하자면 근본적인 변성(alteration)의 조건으로서 '타자’를 통한 자기규정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식인이 상대적으로 쉽게 포기된 것이 실은 유럽인의 도래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식인은 오로지 혹은 주로 유럽인이 식인을 혐오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포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인이 투피 사회에서 적의 위치와 기능을 점하게 되었기 때문에 포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139쪽)
레비스트로스의 해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자의 의견도 흥미롭다. 식인함으로써, 그 시체를 먹음으로써 타자(복수의 대상)와의 동일화를 이룬다는 것인데, 이를 ‘타자’와의 자기규정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인과 직접 접촉한 투피남바 사람들 사이에서 1560대 이후에는 식인주의가 존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서 아마존의 서사는 투피남바 족 신화에 매우 가까운데, 이 신화에서 인디오는 단명하고 백인은 장수한다. 백인은 장수한다는 점에서 거미, 뱀, 여자와 유사한데, 백인은 문화적 피부, 즉 의복을 갈아입으며, 이러한 기술적 지식은 불멸과 연결된다고 이해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질문’으로 돌아오고야 만다. 어째서 인디오들은 유럽인을 초자연적 힘을 가진 사람, 고도의 샤먼적 과학의 수혜를 입은 사람, ‘카라이바’로 보았을까. 단지 ‘멀리서 물 위를 건너왔기 때문에?’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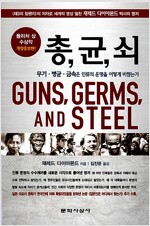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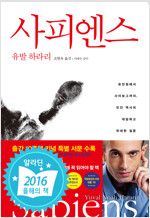
<총, 균, 쇠>로 돌아간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18쪽) 질문의 답은 35쪽에 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서로 다른 문명의 조우 과정에서 서구는 유리했다. 근대 과학의 발달, 계몽주의, 기독교의 확립 등의 이유보다, 나는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밝힌 ‘유럽인들의 탐험과 정복에 대한 야망이 어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이 탐욕스러웠다’는 평가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지점은 거기가 아니다. 다른 존재와의 만남, 다른 문화와의 충돌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적의, 공포, 혐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백인들이 신대륙의 원주민이 인간이냐 동물이냐를 고민할 때, 왜 인디오들은 그들을 ‘신적 존재’로 인정했느냐는 것이다. 백인이 인디오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삼을 때, 왜 인디오들은 기꺼이 그 대상이 되었느냐는 것이다.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유럽인의 요구를 인디오들은 왜 그리 ‘순순히’ 들어주었냐는 것이다. 충분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 내가 찾은 해답은 여기에 있다.
인디오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타자에게 부여하려는 광적인 욕망을 가지지도 않았고, 자신의 민족적 우월성을 이유로 타자를 거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타자와의 관계(가상의 양식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변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47쪽)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은 저자와 번역가와의 대담이었다. 저자 카스트루가 묻는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재규어가 나를 야생 돼지로 본다면, 나는 실제로 무엇일까? 나는 나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만, 재규어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나는 재규어가 재규어 자신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을 안다. 내가 재규어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재규어를 재규어로 본다. 주체의 위치를 누구나 차지할 수 있으므로 이 세계는 매우 위험한 세계입니다. 당신은 다른 존재와 마주칠 때마다 그것을 놓고 다투어야 합니다. (203쪽)
모두 다 맞는 말이 아닌가. 나는 재규어를 재규어로 보지만, 재규어는 재규어 자신을 인간으로 볼 테고, 나를 야생 돼지로 볼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여기, 누가 인간인가. 지금, 누가 인간인가.
그냥 읽었을 리가 없을 거라 다들 짐작하시는바, 증거자료 1호 살짝 덧붙여본다. 마트 바깥쪽에 ‘정새우’가 진열되어 있어 계산하려고 하나 들고 들어갔는데, 계산대 옆에 맥스봉이 있어 그것도 두 개 집어 들었다. 계산해 주시던 친절한 점원분이 ‘맥주는 안 하세요?’하고 물으셔서, ‘아… 네…’ 가방에 안주들 주섬주섬 집어넣으며 ‘이게 안주죠?’ 어색하게 물었더니(왜 물었을까), ‘네, 이거랑 이거. 다 맥주 안주라서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신다.
저는 포도 주스랑 먹어요, 정새우랑 맥스봉이요. 그것 좀 알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