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근두근 설렌다.
두근두근 설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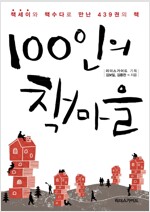
 사진: 알지랑님
사진: 알지랑님
오래도록 기다렸던 <100인의 책마을>이 지난 주말 인쇄되어 나와 오늘 내 품에 안겼다. 받기전엔 정말 나오나 싶었는데 받고보니 실감난다. 하지만 나온 거 맞다. 받고 보니 사실은 의외로 덤덤하다.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그해 가을무렵 <교지>라는 걸 만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리고 거기 들어갈 원고를 모집한다고 반장이 말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고, 내가 그렇게 글을 못 쓴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에선지 불끈 원고를 써서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뭘 썼는지는 기억엔 없지만 아무튼 나는 원고를 써서 반장에게도 아닌 복도에 지나다니시던 당시 내가 좋아했던 국어 선생님께 당당하게 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나의 최대의 목표는 최대한 그 선생님에 나의 존재가 노출되는 거였다. 그래서 괜히 안 물어 볼 것도 물어보고, 점심시간 같은 때 선생님이 교정을 어슬렁거리면 그 틈을 비집고 혹시라도 입에서 반찬냄새날까봐 사탕 하나 얼른 깨물어 먹고 선생님께 다가가 심각한 얼굴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곤 했다. 덕분에 나는 그때 국어 점수하나만큼은 좋았다.
어쨌든 그때 그렇게 선생님께 원고를 내밀고 그때부터 교지가 나오길 학수고대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난 그렇게 내기만 하면 무조건 내 글이 교지에 실릴 걸 추호도 의심해 본적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뒤에서 앞까지 목차를 뒤지고, 책장을 넘겨도 내 글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아쉬움도 아쉬움이지만, 당당히 어깨에 힘주고 국어 선생님께 달려가 원고를 냈던 내 자신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교지에 실릴 정도의 글은 어느 정도의 글을 말하는 것일까?
그후 난 다시 교지에 글 같은 건 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꽤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오늘이 그런 기분이다. 그 시절 내 글은 교지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쓴 내 글은 <100인의 책마을>에 실렸다. 실로 얼마만에 이루는 꿈이랴?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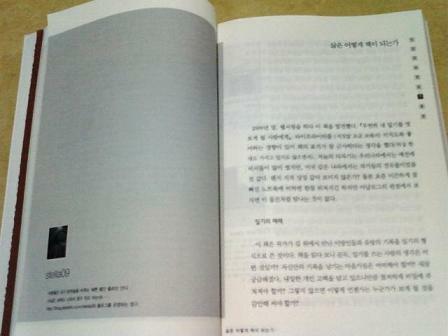
내 글은 지난 봄이던가? 그때 <일기를 쓰던지, 편지를 보내든지>란 제목으로 페이퍼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새롭게 편집해서 실은 것이다. 편집자의 손을 거치니 확실히 글이 깔끔하고 멋스러워졌다. 그전까지만 해도 난 편집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그 존재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전문가의 손길이란 이런 거구나 싶어 나름 놀라기도 했다. 제목은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다. 제목도 원래 내가 붙인 제목보다 더 멋지지 않은가?!
요즘엔 출판 사정이 좋아서 시쳇말로, 개나 소나 다 책을 내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출판 자체는 자유일지 몰라도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무 책이나 읽지 않는다. 이 책은 서평 전문 사이트인 리더스 가이드(http://www.readersguide.co.kr/)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다. 사실 10년 전만해도 책의 서평은 전문가들의 몫이었다. 그래서 누군가 책을 내면 '주례사' 쓴다고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커뮤니티가 발달이 되고, 책에 대한 공유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졌다. 이제 더 이상 전문가의 몫이 아닌게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나 역시도 그런 전문가의 의견 보단 책 읽는 사람의 서평을 참고로 해서 책을 고르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이 책은 바로 책을 읽어 본 사람의 책에 대한 가이드 겸 책에 관련된 여러가지 단상들을 정리해서 실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책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겐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어떤 이는 인터넷에서도 읽을 수 있는 걸 굳이 돈 주고 책을 사 봐야 하는 거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읽는 것하고, 책을 보는 것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하루키의 소설 <1Q84> 1권을 보면 , 덴코가 남의 글을 편집하는 과정이 나온다. 그는 워드프로세서로 고치고 그것을 프린터해서 보고, 또 다시 고치고를 반복한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종이책의 종말을 예견했던 건 확실히 넌센스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됐다. 확실히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 책으로 읽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인터넷에서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책을 내면 꼭 그냥 받아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나도 그 마음은 잘 안다. 내가 항상 그 마음을 가져왔으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난 그럴수가 없게 됐다. 원래 저자가 책을 내면 그에게 할당된 양의 책이 있다고 한다.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20권쯤? 하지만 우리는 공동저자 형식이 되서 한 권씩 밖에는 할당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한 사람당 10권은 받지 않을까 하는 야무진 꿈도 가졌었는데, 그건 물거품이 되었다. 10권 정도 됐더라면 난 당연히 이벤트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불가능하게 되었고, 만약하게 된다면 아주 간소하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나와서가 아니라, 워낙 좋은 책이니까.
출판계 속설 중 하나는, 1쇄 때 에러가 나면 그 책은 대박 난다는 말이 있다는 걸 새롭게 알았다. 그냥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면 속상하니까 위로하느라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경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 개인적으론 아쉬운 게 많았다. 무엇보다 본명으로 내 볼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과 자기 소개글을 쓰라는데 도무지 쓸 말이 없어서 빗나간 글을 썼다. 말도 안 되는. 빨리 1쇄 소진시키고 2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와락든다.ㅜ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춰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27일) 광화문 새로 오픈한 교보문고 근처 <중화>라는 중국음식점에서 조촐한 출판기념회를 할 거란다. 저녁 7시에. 나는 이날 머리 자르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이다. 성격이 성격인지라 알라디너들 오프 모임 갖자고 말도 못한다. 이 기회에 용기를 내어, 새롭게 단장한 교보문고 구경도 할 겸, <100인의 책마을>도 사고, 더불어 출판 기념회에도 날 보러 오시라고 청하고 싶다. 그런 알라디너 계시면 정말 환영이다. 7시쯤 중화에 오셔서 나 스텔라는 찾으시면 버선발로 맞이할 것이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