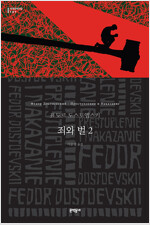처음에는 인생 책 네 권을 어떻게 고를지 암담했고, 고민되었지만 알라딘 서재 친구들이나 작가들의 <인생네권>에 자극받아 그냥 쉽고, 가볍게, 의식의 흐름대로 골랐다.
페넬로페의 인생네권은~~~

『소포클레스 비극 전집』은 고전의 전범(典範) 같은 책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인용되고, 응용되며, 다양하게 변형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가 소름끼친다. 특히 ‘오이디푸스 왕‘은 삶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인식시켜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침서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세 번 읽은 책이다. 중학교 때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는 ‘라스콜니코프’가 고리대금업자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도끼로 살해하는 것에 전율을 느꼈다. 그가 이 노파를 살해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했고, 세상의 누군가는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라스콜니코프의 주장에 동의했다. 중학생인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40대에 읽었을 땐, 라스콜니코프가 노파를 살해한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자격이 의심되었다. 그 어떤 이유에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도덕적인 면이 우선되었다. 50대를 훌쩍 넘어 최근에 다시 읽은 『죄와 벌』에서는 그저 <인간 라스콜니코프>만 보였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성마르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그와 환경적으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은 라주미힌은 저렇게도 긍정적이고 활기찬데 왜 라스콜니코프는? 엄마의 마음으로 라스콜니코프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고 싶었다.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는 내게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준 책이다. 물론 그 전에도 세상의 불공평성과 폭력, 이기심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책은 나를 한 발짝 더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은 나를 힘 빠지게도 했다. 아무리 아우성치고, 발버둥 쳐도 이놈의 자본주의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에 젖어 누군가가 희망을 얘기할 때,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관주의자가 된 듯하다. 언젠가 성당에서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이 책을 인용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이 없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ㅠㅠ
로버트 먼치의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 밤마다 읽어준 책이다. 아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 수백 번 넘게 읽었을 것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가 커 가는 모습, 그러다 엄마는 늙어가고 다시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습들. 매 순간마다 존재하는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아! 인생, 인생, 나는 늙어가고, 늙어가고.…오래된 책 냄새가 많이 나는 이 책을 다시 읽어 보니 왜 이리 슬픈지 모르겠다.
이번 생은 책과 함께 망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갈 수 밖에.
알라딘 서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