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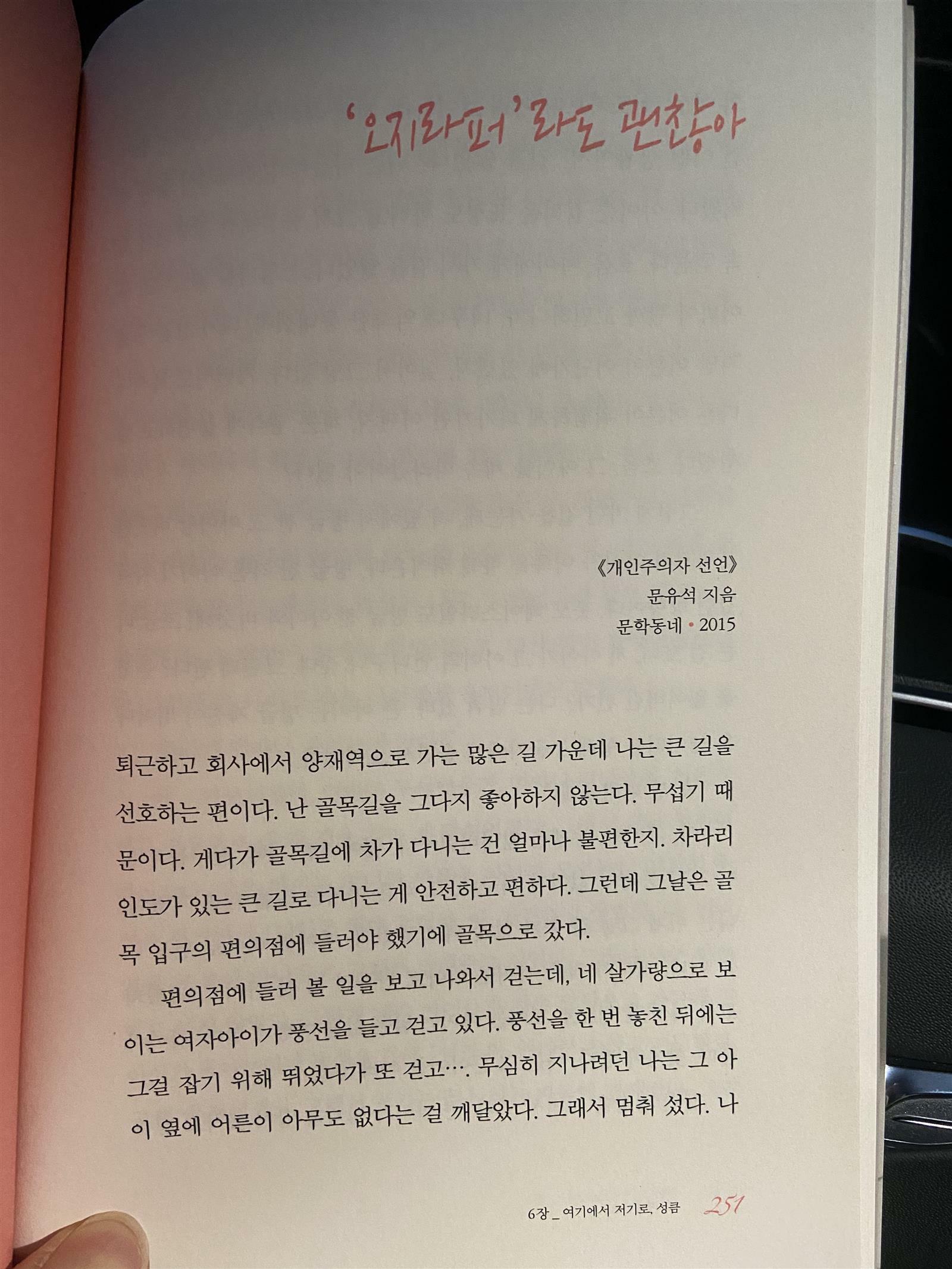
이유경작가님의 이 글, '오지라퍼'라도 괜찮아-는 세상에 오지라퍼가 얼마나 필요한지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려준다. 사실 이 글에 나온 에피소드는 결과적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오지랖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에피소드를 요약하면 이렇다(지금 책이 다른 데 있어서 기억에 의존).
네 살가량 여자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있다는 걸 깨달음 -> 불안하지만 오지랖이다 여기고 그냥 감 -> 그 아이와 닮았는데 좀더 큰 여자아이가 울면서 "동생 찾아올게!" 외치는 말을 들음 -> 으악 길 잃은 거잖아! 싶어 큰아이를 따라감 -> 동생을 찾았길래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동생 잃어버려서 많이 놀랐지?" 했는데 큰아이가 "그게 아니라, 오빠한테 사과하러 가야하는데 동생도 데리고 가야해서요. 친오빠는 아니고요."라고 함 -> 아니 대체 친오빠 아닌 그 오빠한테 왜 사과하러 가는거지?? 의문에 휩싸인 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감 -> 놀이터에서 만난 그 오빠들은 별로 무시무시하지 않았고.. 동생이 먼저 욕해서 사과를 요구하던 중이었다 -> 당황하던 와중 아이들 엄마가 나타나 사건 종결
작가님이 없었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흘러갔을 테고 엄마가 마무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위험한 줄 알고 따라와준 어떤 어른이 있었다고 기억하지 않을까? 나는 엄마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 같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위험이 닥쳤다면, 어른 한명의 관심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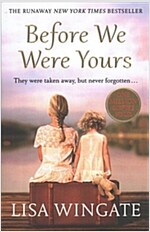
지금 읽고 있는 <당신의 손길이 닿기 전에>(원제: Before We Were Yours)는 가슴 아픈 실화를 담고 있다. 1920년대부터 1950년까지 '조지아 탠'이라는 미국 여성은 미국 테니시주 멤피스에 테네시 보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보육하다가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보냈다. 하지만 실상은 아동매매였다. 그녀는 빈곤층 부부 등을 상대로 서류 내용을 속여서 서명하게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빼앗아 갔다. 조지아 탠은 정치인 등 유명인들과 가까웠고, 심지어 멤피스 가정법원의 카밀레 켈리 판사는 이혼 가정 엄마의 친권을 금지하면서 아이들을 탠의 시설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 그러나 조지아 탠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도 전에 암으로 사망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건 종결을 원했기 때문에 그대로 종료됐다.
관련 블로그 글 참조: https://kingshandle.tistory.com/547
소설은 1939년과 현재(아마도 2016년 내지 2017년?)를 오간다. 1939년 강가에서 살던 일가족은 끔찍한 위기에 처한다. 엄마가 출산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아빠는 다섯아이를 집에 두고 엄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부모가 떠난 집에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들이닥쳐 다섯아이를 데리고 간다. 아이들은 엄마아빠를 보러 병원으로 가는 거라고 믿지만, 도착한 곳은 테네시 보육원. 순식간에 그들은 고아가 되어버렸고, 영문을 모른 채 보육원에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간다. 당시 열두살이었던 릴의 시점에서 그려지는 이 보육원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설이 정말 재미있음에도 자꾸 중단하게 된다. 릴은 동생을 하나둘 빼앗긴다. 보육원에는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악마도 살고 있다...
그 와중에 보육원에 새로 일하러 온 젊은 여성이 릴의 이야기를 듣고 밖에서 릴의 부모를 찾아내 연락한다. 실낱같은 희망. 이미 동생 셋을 잃은 릴은 남은 동생 한명을 데리고 가기 위해 탈출의 기회를 미룬다... 아아ㅏ아.. 미뤄버린 탈출의 기회는 이제 다시 오지 않아 ㅠㅠ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네 ㅠㅠㅠ 이 대목에서 또 힘들어서 중단.
그러나 그 젊은 여성의 오지랖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눈감고 귀 막고 그저 돈 받고 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면, 아니면 조금만 이기적이었다면, 조금만 동생을 덜 사랑했다면, 그녀로 인해 릴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오지랖.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오지랖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남의 집 애‘라는 말이 좋았다. 그러면 나는 ‘남의 집엄마‘ ‘남의 집 아빠‘ ‘남의 집 이모 삼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좋아하고 샘내고 안심하고 걱정하면서 ‘남의 집 애’를 같이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어떤 어린이의 ‘남의 집 할머니‘도 될 수 있다. 어린이의 초콜릿을 지퍼백에 넣어 주고, 어머니에게 어깨를 빌려 드리면서 나도 한몫을 할 수 있다. 양육자가 아니어도 ‘남의 집어른‘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엄마가 된 친구와 나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간다. 부모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나는 끝까지 제대로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친구 역시 아이 없이 나이 들어가는나의 삶을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자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다.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는 자리에, 잘 보이는 곳에 내가 가있겠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내가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해도 상관없다. 어른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는 법이다. - <어린이라는 세계>, 181쪽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이 특별히 좋았던 이유는 엄마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남의 집 어른'으로서도 '다른 집 어린이'를 따스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을 양육자(특히 주 양육자, 대부분 엄마)에게만 돌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양육자를 비난하고, "코로나로 인해 돌밥, 힘들다"는 호소에 "지 자식 밥 차려주는 것도 힘들다고 난리냐 ㅉㅉㅉ"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식이, 자기 조카가 아니라도 어린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해주는 어른들이, 오지랖이라고 한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라도 손 내밀 준비가 되어있는 어른들이 있다고.
그러고보니 나도 몇달 전 오지랖을 부려본 일이 있다.
퇴근길에 늘 지나가는 빌라단지 옆 골목에서, 아이 둘이 있다가 한 명이 썡 빌라로 달려가고 한 명이 남아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 결국 가서 물어보니, 다리를 다쳐서 못 걷겠다고 했다. 곧 돌아온 다른 한 명이 형이라고 했다. 집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못 나오니 둘이 알아서 오라고 했다고. 다친 동생쪽이 덩치가 더 컸고, "아줌마가 업어줄까?"했다가 거절당해서, 형인 아이와 내가 양쪽에서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줬다. 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다쳐서 못 걷는데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엄마는 어떤 상황인 걸까. 아직 어린 동생이 또 있는 걸까,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있는 걸까, 본인이 몸이 불편한가.. 아무튼 집 앞에 무사히 갔고 형은 깍듯하게 내게 인사를 했다.
퇴근길 그 빌라단지를 지날 때마다 그 아이들 생각이 난다. 다리는 잘 치료했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 아이들도 나를 떠올리기도 할까? 가끔은 나를 떠올리며 "그때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를 도와줬지.", 그렇게 어른에 대한 믿음을 지탱해 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세상의 오지라퍼들이여! "잘 살고 있는 비혼자들에게 '언제 결혼하냐'고 묻는 명절 친척들"의 모습으로 '오지라퍼'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자. 세상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오지라퍼다. 출동, 오지라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