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파괴, 소통 그리고 분서입문
책파괴, 소통 그리고 분서입문
지난 토요일 얼떨결에 나온 재미와 소통에 대한 꼭지의 기억이 선명치 못하고, 기우뚱한 균형의 내력도 관점이 다른 듯하다. 그래서 다시 되짚어보는데, 끌여오는 책이  [진보를 연찬하다]와
[진보를 연찬하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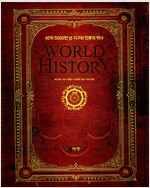 생활상의 맥락을 한눈으로 보게해주는 양장본이다. 북하우스의 HISTORY와 조르쥬디뷰의 역사는 조금 평면적인 느낌이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싶다. 견줘서 나에겐 편하다.
생활상의 맥락을 한눈으로 보게해주는 양장본이다. 북하우스의 HISTORY와 조르쥬디뷰의 역사는 조금 평면적인 느낌이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 싶다. 견줘서 나에겐 편하다.
1. 재미를 휴머니티와 동등한 가치를 둔다.[책을 봅시다란 프로그램 시리즈의 김영희 피디의 강연 주제란다. 혹 재미의 가치나 타 가치와 연결에 대해 의심하거나, 무딘 모임은 강연을 들어보길 권면한다.] 계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과 경향들은 재미없는 경향에 저항하는 것뿐이다. 위에서 아래로 퍼부어지기만 하는 일방적인 계몽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쌍방향의 계몽. 그게 바로 재미의 정체가 아닐까? 소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소통과 통합이 아닌 연대를 원한다면 필수항목으로 말한다. 사람냄새가 물씬 풍기는 재미가 계몽과 소통과 연대가 아니라 한몸이란 사실을 주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증오의 힘에 편승해서 지위재로 누려왔던 과거가 아니라, 겸손재가 아이들이 세대가 요구하는 것이다란다.
2. 더러운 '민주주의'도 좋아해야 한다. ;진보는 낡은 것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다. 새로운 인간 없이는 새로운 진보가 실현되기 어렵다. 우파는 힘을 과장하기 쉽고, 좌파는 부끄러움을 과장하기 쉽다. (우리의 수구꼴통이 아니다) 그래서 우파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라고 하고, 좌파는 부끄러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한다. 우파는 위악으로 흐르기 쉽고, 좌파는 위선으로 치장하기 쉽다. 문제는 선한 일을 하려다 보면 선한 척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눈빛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는, 행동이 소박하면 봐줄만 할 것이다. 말과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 기우뚱한 균형이 잡히는 셈이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말과 행동을 기우뚱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중간할지 모른다고 비판할 지 모르지만 정작 하는 사람은 새파란 칼날에 베일 때의 싸한 아픔의 연속이라는 몸의 고통에 마음을 주어야 한다. 아마 그것이 말과 행동의 방향을 보는 눈.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함께 봐서 몸의 영역이 겨우 보이게 될지 모른다. 한번 해보면 안다. 콧방귀끼는 짓들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다. 그래야 아픔의 공감대가 서로 열린다. 어쨌거나 우리는 개도국 보통인간으로 살아 세속화와 상품화에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니 현실을 인정하란 소리냐구 되묻지는 마라.
3. 익산 희망연대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장수 좋은 마을 멍덕골은 찾아보지 못했다. 장수 번안이 메모해놓은 것의 전부다. 연찬하는 방식은 토론의 한방법으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더알거나 깨우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읽혔다. 강독회에 논어연찬...이란 방법이 언듯 보인다. 얼개에는 큰 불만이 없지만 그물이 너무 큰 것이 아닐까 드문드문 공백이 많아 보인다.(전적인 개인소견) 그러다가 모임 생각을 해본다. 모임이란 것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모아지고 돌아가는 하나하나 조바심날 때는 모임이 벼려져 그 마음의 행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문제는 그다지 시간에 대해 열려있지 않기에 그 시간에 대한 피로도를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시간단위가 5년이 될 수도 1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피로의 축적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열심과 모임 한끝에 모여진 마음들로 끌고 나갈 수는 있지만 축적된 피로의 회복은 헌신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헌신과 열정이 가장 약한 것은 시간이다. 햇빛에 바래듯 너무 쉽게 색이 얕아질 수 있다.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무뢰하게. - 거두며 강준만님의 글이 생각난다. 연고주의나 인정투쟁의 방향전환을 말한다. 공공적 연대주의인데 지역을 더 공공연히 말하고(물론 서울 수도권 경기가 아니다) 더 출세한 사람을 따라잡자는 인정투쟁이 아니라 누가 더 기부를 많이 하고, 더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더 공익활동을 많이하는가? 학교들이 지역들이 더 더 인정받기 위해 학연지연혈연을 들먹였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우파든 좌파든 해보고 얘기해봐라. 아마 싸한 아픔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겨우 개나 걸의 공간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래 몸좌빨이라고 할까? 머리좌빨이 아니라...가슴으로 조금이라도 중심이동을 해볼까?
3. [-려고하거나], [-하는]에 대해선 그래도 동선의 궤적을 나무라지 않는 것 같다. 모임이 사람들이 모른다고, 몰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로방향에 대해 마음이 곤두서있다는 점이다. 그 곤두섬과 기우뚱한 방향이 모임을 바로 세우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방향성의 물리적인 피로도는 어떨까? 몇몇의 좌불안에서 예민하게 시작한 동선이 서서히 속력도 방향의 움직임도 줄어든다면 말이다. 문제는 그 피로도의 누적에 대해 의외로 무심한 것은 아닐까? 움직이는 한 모임은 서지 않는다. 문제는 과부하이다. 과잉의 방향이나 사명감은 어깨위에 하나하나씩 무거워지는 돌멩이의 무게다. 휴식도 동선도 과하거나 부족한 움직임도 경계가 필요한 것일게다.
[진보를 연찬하다]에 일정부분 동의1)하지만, 그 그물이 고기를 잡기에 너무 느슨하고 넓고 크다. 숭숭 다니는 고기를 잡을 길이 없다. 그물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면 헌신에 동의하지만 세목 세세목은 현실의 켜가 많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 같다. 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