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편의 성장 소설을 읽었다. 은이정의 '괴물, 한쪽 눈을 뜨다.', 김려령의 '완득이',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줘.'. 어차피 우리는 늘 조금씩 혹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니 청소년들이 나온다고 해서 굳이 성장 소설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뭐 어차피 개인적인 분류란 그 의미가 별로 없을 듯 싶으므로 그냥 성장 소설이라고 부른단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니.

은이정 작가는 이 책으로 처음 만났다. 이 책을 읽고 좋은 나머지 동화책을 사서 읽고 선물을 했다. '난 원래 공부 못해.'. 작가가 중학교 교사라 그런지 동화보다는 청소년 문학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괴물, 한쪽 눈을 뜨다.'를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 즈음의 남학생들을 괴물이라 칭하되 괴물로 보지 않는 시선이다. 누구나 한 번 쯤은 어떤 식으로든 앓고 지나가는 시기, 다만 그것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그 시기를 더 잘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그런 시선을 억지로 강요한다거나 일부를 불균형하게 미화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에 더욱 아무렇지 않은 시기로 느껴지게 한다는 방법이 맘에 들었다. 그런데 그 시기의 문을 지켜주는 문지기의 역할로 교사 한 명은 좀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든다. 좀 더 다양한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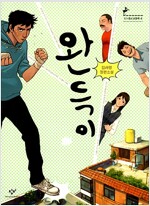 완득이는 묘했다. 표지의 강인하고 잘생긴 청년의 모습과는 달리 온갖 결핍의 총체인 주인공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작가가 뭘 이야기하려나 하는 궁금증을 느끼게 했다. 똥주라 불리는 선생님과 완득이 이 새끼로 불리는 주인공과 하다못해 동네 주민의 미친 존재감까지 어느 인물 하나 까닭없는 출연이 없다. 그런 다양한 인물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겉으로 드러나기엔 거칠기 짝이 없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왜 가슴 한켠 따듯한 기운이 퍼지는 걸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게 김려령의 힘인가 보다. 짧고도 깊은 여운. 이 책을 읽고 난 전후의 책들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렸다.
완득이는 묘했다. 표지의 강인하고 잘생긴 청년의 모습과는 달리 온갖 결핍의 총체인 주인공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과연 작가가 뭘 이야기하려나 하는 궁금증을 느끼게 했다. 똥주라 불리는 선생님과 완득이 이 새끼로 불리는 주인공과 하다못해 동네 주민의 미친 존재감까지 어느 인물 하나 까닭없는 출연이 없다. 그런 다양한 인물들의 조합이 만들어낸 겉으로 드러나기엔 거칠기 짝이 없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왜 가슴 한켠 따듯한 기운이 퍼지는 걸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게 김려령의 힘인가 보다. 짧고도 깊은 여운. 이 책을 읽고 난 전후의 책들의 존재감이 사라져버렸다.
 20대 초반 은희경의 여자에 대한 소설들이 좋았다. 지금은 제목만 기억나는 그 소설들이었지만 나는 늘 도서관에서 그녀를 찾고는 했다. 그녀가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을 때 놀라웠다. '소녀'도 아니고 '소년'을? 앞의 두 소설에 비해 두 배 가량의 두께가 되는 소설, 읽는 내내 힙합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읽게 되는 소설. 이런 소설을 그녀가 쓰다니 그녀의 태도가 존경스러웠다. 우리는 언제나 미성숙한 자아, 누군가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픈 마음이 드는 순간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방황의 시기는 사춘기 때에만 있는 건 아니지. 좋은 내용 좋은 컨셉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의 두 소설에 비해 큰 여운이 남지 않았다. 새로웠지만 새롭지 않은 느낌이랄까, 여하튼 난 그랬다.
20대 초반 은희경의 여자에 대한 소설들이 좋았다. 지금은 제목만 기억나는 그 소설들이었지만 나는 늘 도서관에서 그녀를 찾고는 했다. 그녀가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을 때 놀라웠다. '소녀'도 아니고 '소년'을? 앞의 두 소설에 비해 두 배 가량의 두께가 되는 소설, 읽는 내내 힙합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읽게 되는 소설. 이런 소설을 그녀가 쓰다니 그녀의 태도가 존경스러웠다. 우리는 언제나 미성숙한 자아, 누군가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기고픈 마음이 드는 순간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방황의 시기는 사춘기 때에만 있는 건 아니지. 좋은 내용 좋은 컨셉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앞의 두 소설에 비해 큰 여운이 남지 않았다. 새로웠지만 새롭지 않은 느낌이랄까, 여하튼 난 그랬다.
3편의 성장 소설 을 읽었다. 당분간 그 시기를 다룬 소설을 읽지 않을 것 같다. 이 세 권이면 충분하다 싶은 마음이 든다. 좋아했던 작가의 새로운 면을 보는 것, 더 깊은 면을 보는 것 그리고 처음 만난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이지 기분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