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두개의 전시를 찾았다.)
예전처럼 발걸음하기 쉽지 않아 미루다 미루다 관람을 놓친 앤디워홀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앤디워홀의 팝아트를 가장 잘 재현한 것으로 알려진 키스해링 전에 다녀왔다. 키스해링전이 열리는 소마미술관이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관계로 근처 한미사진미술관(한미약품 건물내)에 열리는 워커 에반스전까지 동선에 집어 넣었다.
9월 5일까지 소마미술관에서 열리는 키스해링 전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물론 많은 작품을 마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 아쉬움을 키스 해링 다큐로 채워야하고 키스해링의 후반기 작품들을 통해 달래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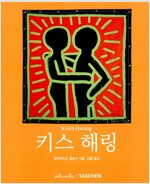

일단 키스 해링의 작품은 친숙하다. 만화같은 선으로만 그려진 그림은 아동화 같은 느낌이다.
 워커 에반스
워커 에반스
사진전을 놓고 보면 올 초에 있었던 스티브 맥커리전을 놓친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그래도 올해 살가도 전에 다녀왔으니 사진전만 두번째 발걸음 한 셈이다. 같은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워커 에반스의 사진은 좀 낯설다. 사진과 단지 관람자의 느낌일 뿐이었다. 그냥 담아낸 사진이라는 첫느낌에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당혹감은 사진의 특성과도 관련이 깊었다. 사진의 많은 부분은 워커 에반스가 미국 FSA의 의뢰를 받아 찍은 사진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제사진인 셈이라 한 눈에 밀려오는 감동은 덜한 편이다.
항상 현실은 현실같지 못하다. 현실은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 특히 1930년대 미국 농촌 풍경은 더욱 그렇다. 특히나 워커 에반스의 사진은 예술사진이라는 느낌 보다 일상사진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풍경이나 가족사진에 매진하였다.
1980년대 뉴욕의 팝아트와 1930년대 농촌의 풍경의 조화는 아이러니했다. 소비주의가 만연했던 1980년대 세계문화의 중심 뉴욕과 대공황 이후 미국의 농촌의 삶의 모습은 서로 다른 세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