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모 라피엔스의 사랑과 결혼
호모 라피엔스의 사랑과 결혼
격주간 <기획회의>(281호)에 실은 전문가리뷰를 옮겨놓는다(잡지는 아직 이미지가 뜨지 않는다). 매달 원고지 16매 분량의 서평을 싣고 있는데, 현재 정기적으로 쓰고 있는 서평이나 칼럼 가운데는 가장 긴 편에 속한다. 마감이 닥치면 부담스러운 건 여전하지만, 마음대로 고른 책에 대해서 비교적 충분한 분량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번에 고른 건 존 그레이의 <하찮은 인간, 호로 라피엔스>(이후, 2010)로 원고는 지난달 연휴기간에 쓴 듯싶다.

기획회의(10. 10. 05) 우리시대 쇼펜하우어의 제안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서구식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을 대변하는 인물 이반 카라마조프는 ‘휴머니즘’에 대해 “멀리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휴머니즘’을 의문에 부친다는 점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는 그의 정직한 고백은 휴머니즘의 한계에 대한 자인으로도 읽힌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그러한 서구식 휴머니즘과 대비시키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가 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합리적․무신론적 휴머니즘 대신에 기독교적 휴머니즘을 내세웠다. 요컨대, 휴머니즘에도 ‘나쁜 휴머니즘’과 ‘좋은 휴머니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엔스>의 저자 존 그레이에겐 그러한 구분 자체가 미심쩍게 여겨질 만하다. 런던 정경대학에서 유럽사상 교수로 재직한 그는 휴머니즘을 아예 통째로 부정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 인간중심주의로서 휴머니즘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다. 그것은 책의 원제 ‘짚으로 만든 개(Straw Dogs)’에 극명하게 반영돼 있다. ‘짚으로 만든 개’는 <도덕경>에 나오는 ‘추구(芻狗)’의 번역이다. <도덕경> 5장의 문구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추구와 같이 여긴다”에 나오는 것으로,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제물을 가리킨다. 제사가 끝날 때까지는 최고의 예우를 받지만 제사가 끝나면 바로 내팽개쳐지는 존재다. 그렇게 내팽개침은 천지의 ‘어질지 않음(不仁)’에서 비롯한다. 영어로는 ‘무자비하다(ruthless)’로 번역된다.
‘만물’은 물론 인간과 동물을 구별 없이 가리킨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동물’ 혹은 ‘예외적인 동물’로 간주하려는 것이 휴머니즘의 기본 태도이지만, 그것은 인간만의 착각이고 오류이다. 더불어, 그러한 휴머니즘의 핵심이라고 할 ‘진보에 대한 믿음’ 또한 한갓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발달하는 과학지식이 주는 새로운 힘을 사용해서 동물은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을 벗어 버릴 수 있다는 믿음”이다. 얼핏 탈종교적으로 보이는 이 믿음은, 그러나 ‘과학에 대한 신념과 종교적 희망의 혼합품’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인간만이 자기 삶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신념을 과학 결정론과 결합하기 위해 애쓰는 것도 기독교를 경험한 문화권에서만 있는 일”이라고 꼬집는다. 단적으로 말해서, 휴머니즘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이며 인류가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기독교 시대 이후의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반휴머니즘은 기독교적 세계관 비판을 더 급진화한 것이기도 하다.



저자가 변장한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의 세속 버전으로서 휴머니즘과 맞세우는 것은 역사에 대한 고대적 견해다. 즉 “역사란 궁극의 의미를 갖지 않은 채 흘러가는 일련의 순환과정”이라고 보았던 통념적 입장이다. 인류도 ‘인간이라는 동물(human animal)’에 불과함을 입증해보인 다윈의 가르침과 함께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레이는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론을 든다. 그가 ‘가장 철저한 과학적 자연주의’라고 부른 가이아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이 곰팡이 균의 삶보다 더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지구에 더 유해한 암종으로 분류된다. 현재 60억 명인 세계인구는 2050년까지 적어도 72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구는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가이아는 파종성 영장류 질환이라고 칭할 만한 상황, 즉, 인간이라는 유해 동물의 이상 대량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진단은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새로운 테크놀로지 개발이 방안으로 떠오르지만, 저자의 생각은 비관적이다. 인류가 테크놀로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을 뿐더러, 애당초 테크놀로지란 것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이러한 판단에는 깔려 있는데, 그는 ‘약탈하는 자’란 뜻을 갖는 ‘호모 라피엔스(Homo rapiens)라고 불러 마땅할 만큼 유독 파괴적인 종이 지구를 책임지는 것만큼 대책 없는 일도 없다고 본다.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지구 자원을 세심하게 살피는 인류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렇듯 비관적인 인간론의 출처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러한 입장을 저자는 ‘비관적 견해’라기보다는 ‘제몫 찾아주기’로 간주할 듯싶다. “동물들은 태어나 짝을 찾고 음식을 구하다 죽는다. 그게 다다.”라고 한다면, 인간이란 동물에게서도 다른 걸 기대할 수 없다는 쪽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제몫’이다. 하지만 우리는 개개인이 ‘인격체(person)’이며 우리의 행동은 저마다 스스로 내린 선택의 결과라고 믿는다. ‘의식’과 ‘자아’와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기만일 뿐이다. 가령, 신경과학에선 ‘0.5초 지연’ 현상이라는 걸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내부의 충동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0.5초 전에 일어난다. 즉 의식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먼저 행동할 준비를 갖춘 다음에 우리는 그 행동을 경험한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의식의 대역폭이 적기 때문인데, 일상생활에서 초당 1,400만 비트 정도의 정보를 처리한다면 의식에 감지되는 것은 그 백만 분의 1에 불과한 18비트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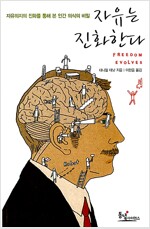


우리는 자신을 통합적이고 의식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인지과학과 고대 불교는 통상적인 자아 개념이 환상이라고 일러준다. 우리의 자아도 ‘생명 조직상의 패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가 ‘인간 종 중심주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준다. 더불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도 다른 동물의 욕구가 추상적인 모습을 취한 것일 뿐이란 사실을 직시하도록 해준다. 시인 브로드스키를 인용하여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대한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진리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좋은 삶이란 진보를 꿈꾸는 삶이 아니라 삶의 비극적 우연성을 헤쳐 나가는 삶이다. 그것은 목적 없는 삶, “어떠한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을 그저 바라보는 삶이다. ‘우리시대 쇼펜하우어’의 제안이다.
10.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