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따라 방문자 수가 많다. 요즘 뜸하게 페이퍼를 올리는데도 '눈팅' 내방객들이 많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 '그녀의 책은 거기에 없었다' 같은 제목이 선정적이어서일까?(고로 대개는 '헛걸음'을 한 게 아닐까?) '저널리스트 마르크스'란 타이틀도 자칫 선정적인 것으로 읽힐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무얼 꾸며대는 건 결코 아니며 마르크스가 저널리스트로 쓴 기사모음집이 최근에 펭귄복으로 출간됐고 그 편집자인 레드베터가 한 잡지에 그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옮겨올 따름이다. 개인적으론 마감을 제때 지키지 못했다는 마르크스의 에피소드에서 매번 마감이 지나서야 가슴을 졸여가며 가까스로 원고를 마무리짓고 있는 나의 처지가 오버랩되어서이다. 그게 말하자면 나와 마르크스의 드문 공통점이겠다. 차이점? "누군가 마감 독촉을 할 때 가장 좋은 글을 썼다"는 마르크스와 달리 나는 매번 '가장 좋은 글을 쓸 뻔 했는데!'라며 한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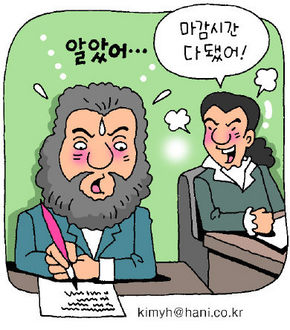
한겨레(07. 10. 23) "기자 카를 마르크스는 마감 안 지켜’
그는 열정적인 언론인이었다. 굶어죽는 사람들의 고통을 황색지 기자 못지않게 선정적으로 묘사했고, 급진주의적 성향으로 편집자들과 종종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마감 독촉에 시달린 뒤에야 좋은 글을 썼다는 점에서, 그는 천생 언론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름아닌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다.
마르크스의 언론인 생활에 대한 책을 집필한 미국 언론인 제임스 레드베터는 미국의 진보적 주간지 <더네이션>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1852~1862년 <뉴욕트리뷴> 런던 통신원 생활이 마르크스의 사상적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며, 마르크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철학자나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기자로서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진보지 <뉴욕트리뷴>은 발행부수 20여만부의 세계 최대 신문이었다. 신문에는 10여년간 마르크스가 쓴 글 500여개(4분의1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대필)가 실렸다. 이는 오늘날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의 7분의1을 차지할 정도의 분량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신문사의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어떤 편집자는 그의 글 앞에 “마르크스는 매우 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 그중 일부는 우리와 매우 다름”이라는 ‘편집자 주’를 붙이기도 했다. 마르크스 역시 엥겔스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신문사에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이따위 신문사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은 구역질이 난다”고 불평한 적도 있다.
당시 여행 제한으로 영국에 발이 묶여있던 마르크스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대영도서관에서 유럽 각국의 신문을 섭렵하며 미국 독자들이 접할 수 없었던 유럽의 최신 소식을 전달했다. 여기에 그의 역사에 대한 조예와 엥겔스의 특기인 군사적 지식이 버무려져, 마르크스의 칼럼은 ‘유럽 정치의 주요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는 글’이라는 평가까지 들었다. 1857년 마르크스는 영국 중앙은행이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특종’ 기사를 썼다. 아편무역과 노예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통렬한 비판은 그의 글 중에서도 가장 ‘마르크스적’인 것으로 꼽힌다.
레드베터는 마르크스가 언론인 생활을 하며 얻은 사실(팩트)이 그의 사상 발전의 거름이 됐다고 지적했다. 레드베터는 또 “마르크스는 누군가 마감 독촉을 할 때 가장 좋은 글을 썼다”며 “공산주의자동맹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1848년 2월1일까지 <공산당선언>을 쓰라는 강력한 독촉 편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그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서수민 기자)
07. 10. 23.

P.S. 기사의 타이틀에선 '카를 마르크스'라고 해놓고 본문에선 '칼 마르크스'라고 쓴다('카를'은 물론 'Karl'을 독어식으로 읽어준 것이다). 아마도 기자와 데스크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데, '카를'이라고 티낼 것 없이 그냥 통용되고 있는 '칼'로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게 내 생각이다(찾아보니 프란시스 윈의 평전이 품절됐다. 마르크스에 관한 전기로는 가장 평이 좋은 책이 아닌가 싶다). '한나 아렌트'를 굳이 '해나 아렌트'라고 적어놓아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건 '원칙의 실천'이 아니라 '고집의 과시'로 여겨지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