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이 잘 안 읽히는 요즘이다.
일이 좀 밀려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두권 모두 책장이 휙휙 넘어가는 책들이 아니어서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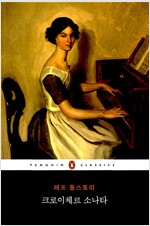
10월의 어느 일요일.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주부에게 주말은 그저 세끼 밥상을 차려야 하는 날.
나야 평일이나 주말이나 비슷한 시각에 일어나지만 그건 나만 그렇고, 남편과 아이는 그렇지 않다. 늦게 일어난 두 사람, 아침 차려낸지 얼마 안되어 또 점심. 그렇게 점심까지 먹고 나더니 남편은 또 잠. 아이는 컴퓨터 삼매경.
혼자 산책이나 하자고 집을 나섰다.

해바라기와 가을은 좀 안어울리지만 저렇게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찰칵.

이 무당벌레는 점이 별로 없어서 특이하다.

빈땅이 여기 저기 많은 우리 동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느닷없는 텃밭이 나타나고 거기엔 대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무가 반짝반짝, 작고 탄탄하다.

가을엔 유난히 보라색 계열의 꽃이 많은 것 같다. 보라색 브로치처럼 생긴 이 꽃의 이름은 물론 모르고 ^^.


천변을 따라 이 꽃이 집단을 이루어 잔뜩 피어있었는데 흰색과 붉은 색 섞여 있는 비율이 꽃마다 같지 않다.
'고마리'가 아닐까 하는데 (자신없음).

이꽃엔 흰색 부분이 거의 없다.

나는 코스모스가 일제히 활짝 피었을때보다 이 상태일때가 제일 끌린다. 삶의 여러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면 과연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을까.

가운데 진한 밤색 부분이 있는 이것은 갈대도 아니고 억새도 아니었다.


산딸나무 단풍든 모습은 처음 보기에 찰칵. 열매처럼 단풍도 빨갛게 드는구나.

요기로 돌아가면 우리 집이 있는 동.

아파트 주위에 돌아다니는 고양이인데 주인이 없는 것 같다. 위의 저 고양이 말고 몇마리 더 있다.

산책할때마다 멀리서 보면 꽃이 핀줄 아는 나무. 잎 색깔이 꽃 만큼 확실하게 붉다.

떨어진 잎도 아름답네.

들깨를 심었다가 깨 털고 남은 가지인가보다. 바짝 말리면 옛날엔 땔깜으로 좋았다던데.
이런걸 다 구경할 수 있는 곳에 나는 살고 있구나.

동네에 체육고등학교가 있다. 가다보니 어느새 이 학교 운동장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쭉 뻗어있는 길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찡하다. 아니, 아무때나 찡하다 요즘은.

미술시간에 배웠던 소실점 생 나게하는 지점. 이 길로 쭉 걸었다.

이렇게 생긴 나무는 가까이 가보지않고도 대뜸 느티나무일거라 생각하게 된다.
크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푸근해보이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책에 나오는 나무는 아마도 이런 나무가 아니었을까. 남의 얘기 잘 들어주게 생긴 나무.
전체가 다 나오게 찍어보았다.

잎은 반짝거리고 열매는 동글동글, 먹어보고 싶게 생겼다.

하지만 안 먹었다.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오니 또 슬슬 저녁을 준비해야할 시간.
일요일이 아니라 밥요일이야 밥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