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여동생은 자신이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있음을 얘기한 적이 있다. 이 나이 즈음에 결혼하고, 이 나이 즈음에 아이를 낳고, 하는 등의 일들을. 또 한 후배 녀석은 이러이러한 직장에 취직하고, 자리잡히는 대로 결혼하고, 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대로 살고 있음을 보기도 했다. 그런 녀석은 하나가 아니라 둘 씩이나 된다. 나는 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들 이렇게 언제까지 뭘 하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는걸까? 일단 계획을 세우면 실천하게 되니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할까? 그렇다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나는 뭐지? 이런것들이 내게 한동안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 뒤로도 어느 때에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되는대로 살고 있다. 다만, 죽기전에, 그러니까 살면서 이것만은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것들 중에 센트럴 파크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보기 라든가 프란세시냐 꼭 먹어보기 등은 내 의지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허락한다면 가능한 것이었단 말이다. 그러나 '숀 마이클스의 레슬링 경기 관람하기' 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숀 마이클스가 몇 년전에 은퇴를 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미국에 가서 숱한 관중들 틈에 섞인채로, 숀 마이클스를 응원하는 디엑스 티를 입고 꺅꺅 소리지르며 숀 마이클스랑 하이파이브를 해보고 싶었다. 목이 쉬어라 응원해보고 싶었다. 미친듯이 팔짝팔짝 뛰어서 땀으로 흠뻑 젖고 싶었다. 막연하게 언젠가는 가능할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숀 마이클스의 은퇴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였다. 충격이었고, 어쩔수없이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멍해졌었다. 아, 레슬링 선수니까, WWE 선수니까, 은퇴를 해야한다는 걸, 경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걸, 내가 망각하고 있었다. 가수라면 좀 더 오래 노래부를 수 있을테지만, WWE 선수는 다르다. 나는 이제 설사 경제적 여유와 시간과 체력이 허락해도 숀 마이클스의 경기를 관람할 수는 없다. 아, 이건 정말이지 예상하지 못한 절망.
갑자기 이 일이 떠오른 건, 지난 주말 남동생과 동네 뒷산에 산책 갔다가 나눈 이야기 때문이었다. 숀 마이클스와 팀을 이루어 경기를 하던 '트리플 에이치' 조차 은퇴 얘기가 돈다는 거였다. 아! 그래서 떠올랐다. 내가 나의 목표(?)중에 하나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기했었던 사실을. 아, 이제 WWE 에 대해서는 끝이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하자 남동생도 아주 속상해했다. 그러게, 나는 왜 숀 마이클스 경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 아 진짜 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지난번 한국에서 경기가 열린다고 했을 때 참가자 명단에 숀 마이클스가 없다고 해서 볼까말까 망설이다 말았는데, 그때라도 가봤어야 했을까. 속상하다. 우린 함께 속상해했다.
요즘 직장생활이 재미없다. 물론 재미있었던 적은 없다. 그런데 요즘은 지겹고 지긋지긋하다. 나는 요즘 일을 관두면 내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있다. 일단은 한동안 포르투갈에 장기체류를 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 직장생활의 지겨움이 폭발할듯 해서, 포르투갈 말고 또 어디가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여행 서적 몇 개를 뒤적였다. 여행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부르짖었으면서도,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생각나는 건 결국 여행 뿐인걸까. 지난 한 달간 읽은 여행서적이 여태 살아오면서 읽은 여행서적과 비슷한 권 수를 기록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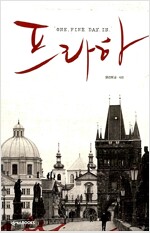

『도시를 보다』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여행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 다른 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도시에 대한 열망으로 들춰보았다. 나쁘지 않은 책이었다. 나는 도시의 높은 빌딩과, 그 빌딩이 이루는 빌딩숲을 사랑한다.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만, 또 가끔은 고개를 들어 이 빌딩은 어느 높이까지 솟아있나를 보곤 한다. 상점들이 즐비한 도시가 좋고, 도시 한 복판과 귀퉁이까지 사람들이 차있는 모습들도 나를 살아 있게 한다. 스타벅스 라는 누구나 다 아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러나 가장 자유롭게 혼자일 수 있음을 사랑한다. 그래, 나는 언젠가 또 여행을 가고 혹은 정말 어딘가에 장기체류를 하게 된다면, 그곳 역시 도시로 정하겠어,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 책은 노점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린다.
『런던 디자인 산책』은 런던의 일상과 런던에서의 디자인이 잘 어우러진 책이다. 그래서 사진을 보는 즐거움을 준다. 나는 디자인의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신선함 보다는 일상쪽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들의 우체부와 우체통이 그들의 산책이 좋았다.
『one fine day in 프라하』는 저 네 권들중 가장 실망스런 책이었는데, 그건 책의 저자와 내가 원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인듯 하다. 여행을 가는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휴양을 위해 누군가는 관광을 위해 갈것이고, 누군가는 그 지역의 역사를 알고 싶고 누군가는 그 지역의 일상을 보고 싶을 것이다. 나로 말하자면 휴양과 관광을 위해 가기 보다는 내 삶을 잠시나마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싶기 때문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일상을 겪고 싶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프라하라는 곳에 반해서 프라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에 열중한 것 같았다. 그곳의 성당 사진을 찍은 사진이 많고 그래서 그곳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다. 과거가 있으니 현재가 있는건 분명하지만, 내가 여행기에서 바랐던 것은 그런것이 아니라서 아쉬웠다. 저자의 사진은 쓸쓸하거나 고독했고 조용했다. 내가 원하는 건 .. 맛있는 음식 사진이었는데.. ( ")
『런던의 어떤 하루』는 위에 언급한 『런던 디자인 산책』을 이미 읽고 시작했기 때문인지 익숙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반가웠다. 마치 내가 이미 런던을 조금은 알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렇지만 이 책 역시 런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줄 뿐 내가 원하는 바와는 거리가 좀 있었다. 난 좀 더 많은 음식 사진을 원했는데(응?), 이 책의 음식 사진들은 그다지 내 흥미를 끌지 못했다. 말 그대로 런던을 여행하기 위해서라면 이 책은 유용할 것 같다. 런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마켓과 극장 쇼핑센터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그렇지만,
피터팬을 패터팬 이라고 쓰다뇨, 움베르트 푸코의 [장미의 이름] 이라뇨, 이런건 좀 너무하잖아욧!!!!!!!!! 잠깐 헷갈렸잖아, 아, 움베르토 푸코였나;; 하고!! 이러지마욧!!
역시, 아직까지는 포르투갈이 짱이구나. 장기체류는 포르투갈로. 그런데 직장은 언제 그만두나. 그만두면 뭐해먹고 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