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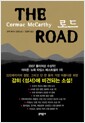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책이 출간되자마자 지금까지 줄곧 이 소설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원작자로만 알고 있었다. 원작으로든 영화로든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기에 그냥 알고만 있었던 원작자. 이 작품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 같다. 당최 어떤 내용인지 호기심이 일었다. 내가 본 그의 소설은 [로드]가 처음이다.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대단한 작가였다. 내겐 이 한 권의 책으로 작가의 낯선 이름이 익숙한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만은 확실하다.
길은 모름지기 떠남을 위해 존재한다. 그 길 위에 남자와 소년이 서 있다. 걷고 또 걷고, 묵묵히 남쪽 바다란 목적지를 향해 걷는 두 사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모습이란 황폐와 참혹 그 자체이다. 생명의 흔적은 쉽게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은 죽어 있다. 그렇게 망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보이는 거라곤 온통 타버린 흔적과 남겨진 재와 먼지. 검은 밤의 이미지가 세상 한가운데 떡 하니 버티고 서 있다. 추위와 배고픔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다. 살아 있기에 움직여야 했고 죽기 전까지는 그런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현실이 그러니까 말이다.
사실 이렇게 글로써 사람을 암울한 느낌에 젖게 하는 내용인 줄 알지 못했다. 글을 읽는 동안 내심 불편한 감정이었다. 그와 동시에 색다른 재미에 끌려 책을 놓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작가의 문체가 상당히 좋았다. 명료하고 간결한 동시에 시적인 언어를 읽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서 이야기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다. 극한의 상황에 놓인 남자와 소년에게 무엇이 그들의 희망이었을까? 어떤 것이 그들의 희망일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길 위의 두 사람이 살아남아 연명하고 생을 이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려지는 면이 이 이야기를 더 진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 각인될 것 같다.
이야기 초반에서 느껴지던 막막함이 중후반까지 계속된다. 하지만 마지막 단 한 번 타오른 희망이라서 그런지 더 절실하게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리라. 모든 문명과 자연은 파괴되고 쓰러졌지만, 남자인 아버지와 소년인 아들 사이에서는 끝내 파괴되지 않았던 인간애 같은 것이 어쩌면 근본적인 구원의 핵심 및 참된 구원의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죽임이란 진실은 명백히 존재한다. 꼭 그만큼 선과 아름다움도 명백히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불'을 운반한다는 상징이 갖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좀더 생각해봐야겠다. 남자와 소년의 대화도 인상깊고, 앞서 말했듯 작가의 문투가 인상깊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발현된 강렬함이 이 소설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