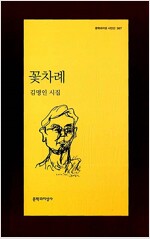
자연과 미래 세대. 자연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존재할 거의 영속적인 존재라면, 미래 세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살아갈, 즉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줄 존재다.
이렇게 자연과 미래 세대는 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연이 없다면 인간도 존재하기 힘들고, 미래 세대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할 두 존재인데, 과연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답은 부정적이다. 마치 현재가 전부인양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된다.
누군가는 지구의 절반을 자연의 영역으로 남겨두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자연의 영역까지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자연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다른 사회적 영역도 남겨두기는 커녕, 그들의 영역도 우리가 끌어쓰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김명인의 시집 [꽃차례]를 읽다가 '리프트'라는 시와 '꽃밥 가까이'라는 시를 만나 자연과 미래 세대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임을 생각하게 됐다. 자연이 파괴될수록 미래 세대도 살아가기 힘들어질텐데...
우리를 영속되게 해줄 존재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이 시들을 통해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프트
산꼭대기로 산꼭대기로 밀치며 밀고 오던 인파들이
쉼 없이 퍼올리던 눈의 함성들
슬로프를 굴리던 힘찬 발들 어디로 갔나
정적을 태우고 허공 중에 멈춰 선 리프트 아래로는
이 빠진 줄 몰랐을 잔디밭 비탈이
붉은 잇몸을 드러낸 채 가파르게 흘러내린다
나는 여기서 봄을 보낸 적이 없으니
지난겨울을 전생처럼 들춰보는 것
저 속살은 그러니까 오리털 파카나 방한 바지로
겨우내 가려놓았던 설원의 상처거나
이별의 흉터리라, 넘어지면
벼랑까지 굴러갈 것만 같았던
눈사람의 자취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산줄기가 닳도록 왕왕대던 스피커 아예 입 다물었다
녹음의 계절이 여기선 사막 같다
삭막한 꽃들을 활짝 피웠거나
리프트 기둥 타고 칡넝쿨 바짝 치켜들었다 해도
한 철에만 열리는 축제의 깃발 저들이 어떻게 대신할까
추위를 불 지피던 화창한 웃음소리 어느새
따가운 햇살 속으로 잦아들었다
김명인, 꽃차례. 문학과지성사. 2009년. 70-71쪽.
봄이나 여름에 스키장 근처를 지나가 보면 황량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겨울에 북적이던 사람들로, 하얗게 쌓인 눈으로 가려졌던 상처가 훤히 드러나 보인다. 마치 학창시절 머리가 길다고 이발기계(일명 바리깡)로 한줄로 깎였던 머리처럼.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자연으로 보면 자신의 신체 일부가 뭉텅 잘려나간, 또는 깎여나가는 일. 그런 상처를 다른 풀들, 꽃들로 애써 감춰보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떻게 겨울에 인간들이 채운 그곳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 겨울이 한 철이라 슬픈가? 아니면 나머지 세 계절을 황량한 상태로 지내야 하는 자연이라 슬픈가? 우리가 자연과 함께 하는 방법이 어떤 일일까? 그들의 영역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만, 자연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봐야 한다.
꽃밥 가까이
세상 모든 밥벌레들은
한 끼니 제 밥상 가까이 다가앉기 위해
얼마만큼 수고 속으로 내몰리는가
제 힘으로 밥상 한번 차려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이 꽃 저 꽃 기웃대는 벌들도
예 아니다 싶으면 한참 동안 허공 맴도는데
서른세번째 회사에 이력서 바치고 축 처져
고시 방으로 돌아가는 길,
나도 일 막(幕) 내리기 전
서둘러 밥그릇 생(生)에 나를 알선시켜야 한다
생계라고 사로잡는 게 눈먼 일당이라면
허방에 거미줄 쳐놓고 빈 손금이나 더듬는
이 애벌의 시간도 간절하게 절절하게
씨앗을 품고 파종의 때 기다리는 중,
모래는 눈물 따윈 간직하지 않으니
낮잠 늘어지게 재워둔
깔깔한 햣바닥이나 깨워 하늘 사막까지
핥으며 가볼까, 온몸에 가시 세운
선인장 깔고 앉아 거기서라도 터 잡아야지
나비의 일터가 꽃이라면
쑥밭이라도 좋으니 내게도 꽃 이울 터전을 다오
일생일대의 호접무(胡蝶舞) 펼쳐보일
무대에서 자꾸만 밀쳐내는 건
이 환한 봄날이 뉘게나 꽃 시절 아니므로!
김명인, 꽃차례, 문학과지성사. 2009년. 84-85쪽.
자연의 일부를 우리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리프트'라는 시와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꽃밭에서 먹을거리를 찾지 못해, 쑥밭이라도 좋다고 절규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드러난 이 시에서 어떤 공통점이 느껴진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존재들의 영역을 많이 침범하고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할 영역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하여 화창한 봄날에 꽃을 즐기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온몸에 가시 세운/ 선인장 깔고 앉아' 거기서라도 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절규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우리들 생활을.
우리는 영속할 존재이기 때문에, 영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에서 마치 미래는 없다는 듯이 모두 써버리면 안 된다. 이 시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미래 세대들의 절망이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
우리가 그들을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아직 늦지 않았다고, 이제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자연과 미래 세대들이 계속 신호를 주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