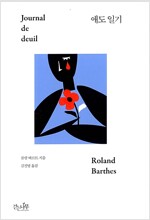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쓰고, 읽고, 고친다.
되풀이하는 것만이 살아 있다.
되풀이만이 사랑할 만하다.
되풀이만이 삶이다. - P162


<초급 한국어>의 마지막 장면에서 문지혁은 미국 뉴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학기가 끝난 후 탑승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며 한국으로 돌아온다.
<중급 한국어>에서는 문지혁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양육하며,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되풀이되는 일상과 강원도 한 대학교의 글쓰기 강의에서 다루는 문학작품 이야기와 코로나를 겪으며 나로 돌아가는 소설을 쓰는 과정이 담담하게, 잔잔하게, 소소한 웃음과 함께(주로 딸 은채가 주는^^) 펼쳐진다.
"지혁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선생님은 내 말을 잘랐는데, 말을 잘랐다는 사실보다 이 말은 보통 정말로 기분 나쁜 말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나는 긴장했다.
"난 솔직히 걱정된다. 니가 책 낸 사람이 될까 봐."
솔직히 나는 그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지? 난 이제 책 낸 사람이 될 건데? 그가 말한 ‘책 낸 사람‘이 ‘작가‘의 반대편에 있는 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다. 책을 내면 작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적어도 그의 세계에서, 책을 낸 모든 사람이 작가는 아닌 것이다. 제대로 등단해서, 제대로 된 출판사에서, 제대로 된 작품(아마도 장르문학은 아닐)을 내지 않는 사람은 책을 낸다 하더라도 작가가 아닌 책 낸 사람에 머문다. 책 낸 사람과 작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 - P150
문지혁은 그가 낸 소설에 대해 애매하다는 평을 듣는다. 그의 위치에 대해 애매하다는 말을 듣는다. 등단하지 않은 작가로서 ‘작가’와 ‘책 낸 사람’ 사이의 경계에 선 애매한 위치,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상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만 멋지고 근사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플롯을 짜고, 비유를 고민하고, 문장을 다듬고………… 이런 게다가 아니에요. 좋은 글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글은 뭐예요? 내가 잘 아는 글입니다. 나를 잘 드러내는 글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글이에요. 그러러면 어쩔 수 없이 나 자신, 내 주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텍스트예요. - P154
에세이 같은 소설이다. 문지혁이라는 이름으로, 주변인을 반영하여 소설을 쓴다는 건, 본인과 주변인을 소설 속에 가둘 수 있는, 소설적 이미지에 고착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문지혁 작가는 본인의 삶을 텍스트화하여 마침내 경계를 넘어 '작가'의 세계로 이동한 것인가.
문지혁의 글쓰기 강의 과정에서 다루는 문학작품들에 대한 얘기가 좋았다. 특히,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A Small, Good Thing]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다. 거기 나오는 세가지 빵에 대한 해석. 첫번째 빵인 케이크와 두번째 빵인 시나몬롤은 기억이 나는데 검은 덩어리 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인상이 깊지 않은 빵이지만 문지혁이 설명하듯,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다수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 특별한 생일 케이크나 달디단 시나몬롤처럼 강렬한 인상을 주지 못하지만 매일 무난하게 특별한 맛없이 그냥 먹는 검은 빵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게 인생이라고. 되풀이되는 일상 같은 빵이라고.
두 번째 빵은 늦은 밤 앤과 하워드 부부에게 빵집 주인이 대접하는 시나몬롤빵입니다. 찾아가지 않은 스코티의 케이크를 두고 부부와 감정 대립을 벌이던 빵집 주인은 스코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오븐에서 갓 구운 따뜻한 시나몬롤빵과 방금 내린 커피를 대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마 뭘 좀 먹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 갓 나온 따뜻한 롤빵을 드셔 보세요. 계속 먹고 힘을 내야 합니다. 이럴 땐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요."
‘어 스몰 굿싱(A Small, Good Thing)‘이라는 소설의 원래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작지만 좋은 것. 대단치 않지만, 쓸모가 있는 것. 이 제목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시나몬롤빵인 셈이죠. - P215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단 걸 많이 먹으면 물리거든요. 롤빵으로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한다 해도 결국은 더 큰 허기와 갈증이 찾아옵니다. 이전보다 더 공허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검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뜯어 먹기 힘들지만, 맛은 풍부한 인생 그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기쁨도 슬픔도 행운도 불운도 쾌락도 고통도 모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좋다, 싫다’가 아니라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도 절망도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부는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은 이 빵을 먹죠. 더 이상 먹지 못할 정도로 먹습니다. 먹는다는 건 그걸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검은 덩어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 P220
<초급 한국어>를 쓸 때는 후속편에 대한 생각 없이 썼지만, <중급 한국어>는 후속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마 <고급 한국어>는 아니고 <실전 한국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목 진짜 한글 교본 같지만. ㅎㅎ <중급 한국어> 마지막 페이지에서 잉태된 둘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한 학기 글쓰기 수업을 같이 들은 듯한 재미난 소설이다.
문지혁의 강의에서 다룬 소설들과 수강생이 선물한 그림책 첨부.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애러비]
안톤 체호프의 단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커트 보니것의 소설 <제5도살장>
카프카의 <변신>
요르크 슈타이너, 요르크 뮐러의 그림책 <난 곰인 채 있고 싶은데…>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
롤랑 바르트의 <애도 일기>
폴 오스터의 짧은 소설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 문지혁 작가는 오스카 와일드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