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마감 날짜를 맞추기 위해 어제까지 바빴고, 오늘 알라딘에 글을 올리려고 책을 골라 놓았다. 한꺼번에 하려니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발췌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일이 있어 세 권만 골라 생각나는 대로 발췌해 본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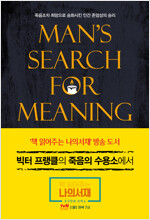
빅터 프랭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명쾌한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다. 한번은 나이 지긋한 개업의 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까?(168쪽)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말했다.
“오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겁니다.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대가로 지금 선생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내게 악수를 청한 후 진료실을 나갔다. 어떤 의미에서 시련은 그것의 의미―희생의 의미 같은―를 알게 되는 순간 시련이기를 멈춘다고 할 수 있다.(168~169쪽)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려면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 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123쪽)
⇨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열심히 책을 읽을 수 있으리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리라.
2.

나희덕, <저 불빛들을 기억해>
냄새에 대한 반응 역시 가장 즉각적이다. 불쾌한 냄새가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거나 코를 틀어막고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며 두리번거린다. 냄새는 어떤 소리도 없이 퍼져가는 침묵의 자극이자, 어떤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투명의 자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냄새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 누군가에게는, 특히 그 냄새의 출처가 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다.(131쪽)-‘타인의 냄새’에서.
영화 <기생충>에서 냄새는 계층 간의 위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호로 등장한다. 박 사장 가족은 자신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외부인들에 대해 독특한 냄새를 감지한다. 결국 기택은 자신의 냄새에 대한 박 사장의 태도에 순간 살인을 저지르고 만다. 그 장면을 본 후로 냄새와 계층의 관계를 자주 떠올리게 된다. 타인의 냄새에 반응하는 태도도 신중해졌다.(131~132쪽)-‘타인의 냄새’에서.
⇨ 인간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사람을 죽이는 참극을 저지르기도 하는 존재다. 참극을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참극이 벌어진다. 아니 영화보다 현실에서 더 인간의 잔인성이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 실제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굶어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고, 산모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건도 있었고,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고, 아동 학대 사건도 있었다. 인간의 밑바닥은 상상을 초월한다.
3.

알퐁스 도데,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는 예전에 ‘별’이란 소설로 처음 만났다. 그것도 좋았지만 이 책에 담긴 마지막 수업, 소년 첩자, 어머니들, 베를린 포위 등은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설이라서 감탄하며 아껴 가며 읽었다.
순간, 광장의 깊은 고요를 깨고 무서운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무기를! 프러시아 군인들이 나타났다!”
마침 그때 프러시아군의 행렬 선두에 있던 네 명의 창기병 병사들은 저 위 발코니에서 키 큰 노인 하나가 팔을 휘저으며 비틀거리다가 푹 꼬꾸라지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브 대령이 진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48쪽)-‘베를린 포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