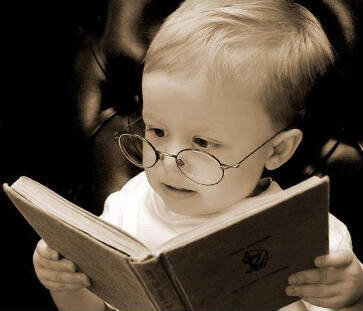
# 1. 교수에게 묻기 전, 제자들에게
오늘도 어느 출판기획자의 책상엔 정체불명의(?) 학술외서들이 놓여 있을 것이다. '연구형 '기획자라면 본인이 직접 인터넷 바다를 헤엄칠지도. 그리고 이런 말을 할지도. "그래, 학술서가 어렵지만 요건 내면 그래도 찾아서 사 보겠지..". 그리고 '주변 참조형'기획자가 있을 것이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교수에게 구조 요청. "교수님, 김길동입니다"로 시작하는 안부 인사. 그리고 용건으로. "아..교수님 몇 년 전에는 푸코가 좀 붐이다 싶더니, 요새는 영 경향을 모르겠네요."(여기까지만 읽어도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 이 바닥에 도가 튼 학자도 있을 듯. 계속)" 평소 교수님의 깊고 다양한 독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최근 연구하시는 주제가 신선하더군요. 관련하여 교수님 대학원생들이 읽을 만한, 그리고 인문사회쪽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탐낼 만한 좋은 학술서 없을까요?" 물론 이 가상의 대화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다. 암튼 내가 이것을 상상해 본 건 인문사회 서적 시장 중 학술서. 이 '학술서'란 놈은 정말 누가 읽느냐의 문제다. 난 이 바닥에 정녕 대학원생들의 현실이 있는지 궁금하다.
# 2. "요즘 대학(원)생들 참 책 안 읽어"에 괄호 없애기
공대나 경제경영쪽 사람들의 이야기는 모르겠다. 내가 대학교때부터 근 10년동안 공부한 문화연구 바닥을 포함해 인문,사회쪽 공부하는 사람들의 독서 실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마디 거들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요즘 대학생들 참 책 안 읽어"라는 진부한 말에 '원'자를 넣어도 된다고 본다. 대학원생들 책 읽을 시간이 있던가. 정말 경험해보니 그랬다. 현실적인 대안은 푸코의 《성의 역사》를 읽는 것보다, 푸코의 《성의 역사》를 다룬 국내 연구자들의 논문을 읽어보는 것이다. 그게 대학원생들의 현실적 독서일 것이다. 커리큘럼에는 한 주마다 시도해야 할 무시무시한 레퍼런스 소화 명령이 적혀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책만을 깊이 팔 수 있겠나. 사람들은 바쁘다. 생각할 것도 많다. 돈 벌려면 당장 놓인 연구도 해야 한다. 책은 사고 싶다. 그러나.
# 3. '수다장'으로 변하는 강의 시간
모든 수업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바닥을 소개하면 수업은 '수다장'이었다. 매주 책 리뷰를 적어오는 것이 과제지만, 어렵다. 안 읽힌다. 그래서 일단 책의 대강을 훑는다. 그리고 관련된 인생담을 적는다. 자신이 주의깊게 보는 사회 현상을 깊게 기술한다. 그러면 수업 분위기는 오늘 배우기로 한 부르디외의 '장 이론'이나 푸코의 '권력론'이 아니라, 자신이 주의깊게 본 요즘 사건들에 책 내용을 조금 얹는다. 결국 3시간 정도의 수업은 각자 삶을 한탄하는 분위기로 바뀐다. 그러면 남는 것은 없다. 교수는 자신을 도발할 견해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무참히 짓밟힌다. 그래서 예리한 교수들은 불시에 책을 읽었는지 검사하기도 한다. "자네 알튀세르가 말한 이데올로기를 설명해볼 수 있겠는가" 제자들 일동 침묵. 고개 숙이기.
# 4. 유일한 기대, '세미나' 그러나.
간혹 '열혈 모드'인 대학원생이 있다.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면 "정말 이 책은 누가 읽을까"라고 관련 출판기획자도 의문을 갖는 책들을 읽는 수요가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요즘 세미나라는 것이 어찌 그리 끈기있게 유지되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교수가 읽어오라는 그 명령의 긴장감이 사라지니 스스로에게 맡긴 그 열혈 모드의 자유 의지는 이내 식고 만다. (대부분 세미나를 주도한 사람이 먼저 지쳐 모임을 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일단 책은 팔리겠지만, 지식이 유통되고 소비되지 않으니 관련 책들을 사 볼 수 있는 다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결국 요즘 인문,사회 대학원생들의 대안은 대학원 밖 좋은 인문사회 강좌들을 등록하여 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이다. (언제 한 번 이 문제를 깊이 이야기해보고 싶다. 지금 대학원 바깥의 인문사회 강좌들의 융성이 대학원생들에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일단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밝혀두고 싶다)
# 5. 결국 문제는 학문 사회다
근데 이 문제를 개인의 불성실로 탓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학문 사회다. 대학원생들 열심히 산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탐독하고 싶은 원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휴학이라도 해야 하나. 비싼 돈 들여 왔는데 나이도 생각해야지) '학술적 성과'를 대변하는 논문 작성. 여기에 교수들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지만 정작 고생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대학원생들이다. 교수가 이것 좀 도와줘,라고 하는 건 양반이다. 교수가 다 시키고, 이름 얹어 놓는 상황은 다반사. 그러면 이 친구들의 독서 시간은 누가 보장해주는가.
'논문중심주의'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원생들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분명 '논문 찍어내기'를 강요하는 이 현실은 고쳐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사회. 내가 읽고 의문을 갖는 이 학자의 생각을 교수 그리고 동료들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6. '독서 운동'이 필요한 곳은 대학원이다
고로 나는 주장한다. '독서 운동'이 있어야 할 곳은 대학원이다. 이건 학문 사회를 압박할 안과 밖의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유 너머'같은 곳은 책 깊이 파고 싶은 사람들을 그들의 공간으로 모이게만 하지 말고, 대학원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제자들과 밥 한 끼 하면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니?"라는 질문 하나 던져보려는 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인문사회 출판 브랜드들은 마냥 책만 내지 말고, 자신들의 학술서를 팔아줄 현실적 독자인 '대학원생'들의 독서 실태 파악을 분명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출판사들은 무슨 책을 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하기 전, 지금 대학원생들이 읽는 책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활에 들어가야 한다. 언제까지 슬라보예 지젝의 힘에만 의존할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