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모시고 지리산 쪽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벚꽃이 지고 난 한국의 아름다운 길들은 연초록으로 뒤덮여 있었다. 언젠가부터 난 화려하게 핀 꽃보다 초록과 연초록이 어우러진 푸름이 좋다. 그 푸르고 연한 잎들이 만들어내는 싱그러움에 더 마음이 간다. 엄마도 연신 좋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산에 초록이 눈처럼 내려와 있다고....엄마는 시인이다.
엄마와 헤어질 때, 엄마가 막 우셨다. 나도 오면서 울었다. 나중에 어떻게 보내드릴지 막막하다. 집에 오니 딸아이가 격하게 나를 반긴다. 엄마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고 보고 싶었다고 했다. 나를 위해 연어장덮밥도 해주어 감격했다. 그런 딸아이가 강의 듣는 노트북 앞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난 그녀의 등짝을 찰싹 때린다. 잠 깨고 정신 차려 강의 들으라고 잔소리를 시작한다. 완벽한 일상의 복귀다,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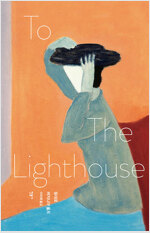
하필 이번 여행에 가져간 책이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이다. 울프의 문장은 그냥 대충 읽어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책을 거의 읽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밑줄을 그으며 다시 집중해 읽는다. 울프의 글은 ‘자기 만의 방’을 읽고 소설은 처음 시작했다. 젊었을 때 읽지 않았던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이지만 나이 든 지금 읽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문장들을 읽으며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그들은 등잔을 닦고 심지를 손질하고 손바닥만 한 뜰에서 갈퀴질을 하는 것 말고는 소일거리가 없어 하루 종일 몹시 지루하게 앉아 있을 테니까......
한 주, 또 한 주가 지나도 늘 한결같이 부서지는 황량한 파도를 보라보고, 그러다가 거센 폭풍우가 물려와서 창문이 물보라에 뒤덮이고 새들이 등대에 부딪치고 등대가 흔들리고 바다로 휩쓸려 갈까 겁이 나서 문밖으로 얼굴도 내밀 수 없다면?-p11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온 나에게 이 문장은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같다.
한 번씩 책을 살 수 있는 비용이 지불되는 직장에 다니는 언니는 그 금액으로 항상 나에게 책을 사 준다. 이번에도 책을 고르라고 해서 알라딘 이웃님들이 포스팅한 글 중에서 체크한 것들 중에서 골랐다.
내 돈으로는 살 것 같지 않은 책으로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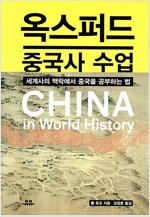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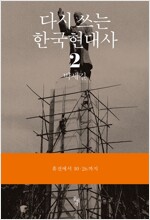

그리고 지인에게 미리 받은 생일 선물,



쌓여있는 책무더기 속에서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