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의 양식이란 무엇인가:
테오도르 아도르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 주네, 글렌 굴드, 그리고 자크 라캉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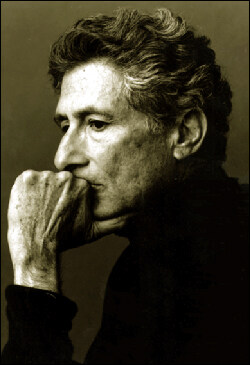
▷ 먼저, 흑백의 사진 한 장: 일반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지식인(intellectual)'의 초상[만]이 지닌 도상학적(iconographic) 요소들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게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이 사진 역시 그러한 도상학적 '함정'들로부터 그리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사실, 이 역시 그 사실 자체로 '매력적'이라는 점, 바로 그것이다(마치 오리엔탈리즘을 '의식적으로' 역이용하는 어느 '동양인'이,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러한 역이용에 대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부반응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하나의 '매력'인 것처럼).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러한 '매력'ㅡ혹은 어쩌면 '마력'ㅡ이란 기실 '모순적 내포 관계'라고밖에는 부를 수 없는 어떤 관계의 형식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매력에 대한 '모순적' 느낌이 지닌 내용(contenu)과 형식(forme)은ㅡ그것이 '모순'을 대상으로 하는 '모순'의 감정이라는 바로 그 점에서ㅡ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에드워드 사이드, 『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장호연 옮김), 마티, 2008.
▷ Theodor W. Adorno, Gesammelte Schriften, Band 17: Musikalische Schriften IV,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3.
1) 얼마 전 여름 옷 입듯이 주섬주섬 혹은 여름 땀 훔치듯이 후루룩 읽어내려갔던 책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On Late Style)』였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ㅡ물론 이 책 전체를 떠받치는 일종의 시도동기(Leitmotiv)라고 부를 수 있을 아도르노(Adorno)에 대한 서론을 뺀다면ㅡ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와 글렌 굴드(Glenn Gould)에 관한 장들(고로, 소위 '음악'에 관한 장들), 그리고 장 주네(Jean Genet)를 다룬 다소 '회고록적'인 장이었다. 어쩌면 나에게 이 인물들의 '말년' 또는 '후기'가 가장 흥미로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사실 동어반복(!) 수준의 사족(蛇足)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이드의 이 '미완'의 연구서가 가장 흥미로웠던 이유는, '시간'과 관련된 비평적 방법론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말단적'이고 가장 '부차적'일지도 모르는 것, 곧 개별적인 인물에 대한 연구에 있어 거의 '수사적'으로 따라붙고 '관습적'으로 다루어지는 '말년' 또는 '후기'라는 시기 구분에 대해ㅡ혹은 그러한 시기를 구획하는 '분류법'에 대해ㅡ일종의 '메타비평'을 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작은 책이 지니고 있는 미덕이다. 이 책은 아도르노의 말년을 다루는 책도 아니고 베토벤(Beethoven)의 후기 양식을 연구하는 책은 더 더욱 아니다. 사실 이 책의 '주제의식'은 사이드가 책의 초입에서부터 인용하고 있는 아도르노의 다음과 같은 한 구절 안에 이미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다:
객관은 파열된 풍경이고, 주관은 그 속에서 활활 타올라 홀로 생명을 부여받는 빛이다. 그는 이들의 조화로운 종합을 끌어내지 않는다. 분열의 원동력으로서 그는 이들을 시간 속에 풀어헤쳐 둔다. 아마도 영원히 이들을 그 상태로 보존해두기 위함이다. 예술의 역사에서 말년의 작품은 파국이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35쪽.
독일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Objectiv ist die brüchige Landschaft, subjektiv das Licht, darin einzig sie erglüht. Er bewirkt nicht deren harmonische Synthese. Er reißt sie, als Macht der Dissoziation, in der Zeit auseinander, um vielleicht fürs Ewige sie zu bewahren. In der Geschichte von Kunst sind Spätwerke die Katastrophen.
ㅡ Adorno, "Spätstil Beethovens", Musikalische Schriften IV, p.17.
영역은 따로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독일어만으로 번역한다면 나는 아마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후기 베토벤은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깨지기 쉬운 풍경은 객관적이며, 그러한 풍경이 그 안에서 홀로 타오르는 빛은 주관적이다. 그[후기 베토벤]는 이들 사이의 조화로운 종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는 분열의 힘으로 작용하여 이것들을 시간 속에서 서로 떼어놓는데, 이는 아마도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예술의 역사에서 후기 작품들은 곧 파국이다.
왜 나의 번역은 거의 언제나 이렇듯 번잡스럽고 어수선한가 하는 오래된 의문은 여기서 일단 구석으로 밀어 제쳐두자(가장 먼저, 잡설에 다시 잡설을 더하게 되는, '설상가상'의 위험, 그리고, 자문에 다시 자답을 하게 되는, '중언부언'의 위험이 있으므로). 말년의 양식 또는 후기의 스타일에 천착하는 사이드의 통주저음(basso ostinato)이라 할 것은, 바로 아도르노의 저 문장, 곧 "예술의 역사에서 후기 작품들은 곧 파국"을 의미한다는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이 문장을 주제 악구로 삼아 이를 다양하게 바꿔나가는 일종의 변주곡(variations)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 이렇듯 사이드의 책 속에서 일종의 '음악적' 형식을 발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즐겁다, 그렇기는 하다. 하지만 이 책 속에는 일견 사소해 보이지만 전체를 통틀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속임수' 하나가 숨어 있는데, 사이드는 미적인 완성과 조화로운 해결로서의 말년에 대비되는, "비타협, 난국, 풀리지 않은 모순"을 드러내는 말년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양식의 요건으로서 특별하게 흥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두 번째 유형의 말년성이다. 나는 조화롭지 못하고 평온하지 않은 긴장,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비생산적인 생산력을 수반하는 말년의 양식을 탐구하고 싶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29-30쪽.
내가 여기서 일종의 '속임수'라고 언급한 것은, 말하자면 사이드 특유의 이론적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다. 사이드는 마치 말년성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자신은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한 부분만을 언급할 계획인 것처럼 쓰고 있지만, 사실 그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종류의 말년성, 곧 완성과 조화 또는 해결과 평온의 시기로서의 말년은 그것이 지닌 '조화로운' 특성들 바로 그것 때문에 사이드가 강조하고 있는 '말년성(lateness)'의 요건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그가 문제 삼고 있는 '말년성'의 요건에 부합되는 말년이란 결국 '화해불가능성'으로서의 마지막 시기[들], 완성과는 거리가 먼 '파국'으로서의 후기(後期/後記)[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말하자면, 말년성이 문제가 되는 한에서 그것은 결국 '파국'과 '불연속성', 곧 '불가능성'으로서의 말년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 고로 사이드는 다른 여러 가능한 말년의 형식과 대비되는 '문제적 말년'들만을 특수하게 문제 삼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말년성 그 자체를 하나의 '문제적' 주제로 보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데에 있어서 '말년성'의 논의가 이러한 '보편화'의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덧붙이자면, 이러한 '보편화'의 기제가 갖는 중요성은 일종의 뒤틀린 귀류법을 상정해볼 때, 곧 사이드에게 '그렇다면 요절한 예술가에게도 말년성이란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가상의 문답법을 가정해볼 때, 더욱 확실한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나의 속임수, 하나의 함정은 사실 이렇듯 '소극적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은폐된 적극성'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그러므로 문제는, '완성'의 말년과 '미완'의 말년 사이를 가르는 골, 혹은 '조화'의 후기와 '파국'의 후기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극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불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을 수밖에 없는ㅡ따라서 'unique'라는 형용사가 품은 뜻 그대로의 의미에서ㅡ'말년성'이라는 징후적 현상의 '유일한' 특성들 바로 그것이다.

▷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과 함께 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모습. 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두 개의 오페라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이행', 다시 말해 <엘렉트라(Elektra)>로부터 <장미의 기사(Der Rosenkavalier)>로 옮겨가는 어떤 '퇴행' 혹은 '복귀'가 슈트라우스의 말년성에 대한 하나의 징후가 된다.
2) 개인적으로 먼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데 먼저 말해두고 싶은 점은, 슈트라우스에 대한 사이드의 저 논의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살로메(Salome)>와 <엘렉트라>의 작곡자로서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곧 바그너(Wagner)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저 반음계 어법과 악극이라는 예술적 형태의 완성과 발전에 깊이 천착했던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무슨 이유에서 다분히 모차르트(Mozart)적인 18세기 오페라의 양식으로 '복귀'하고 '퇴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이미 먼저 품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살로메>와 <엘렉트라>를 들은 후 미처 채 가시지 않은 감동과 격정이 <장미의 기사>와 맞닥뜨렸을 때 겪게 되는 일종의 당혹감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나의 이런 느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껴보지 못한 독자에게는 오히려 사이드의 이 글이 다소 '사치스러운' 음악비평,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에 대한 인상은 독자와 청자마다 각자 천차만별이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일반적'인 인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ㅡ사이드 또한 다른 말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시피ㅡ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마지막 보루, 혹은 후기 낭만주의 말기의 마지막 완성자 정도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상적 '편견'은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동시대의 여러 '혁명적' 전환의 시도들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특히나 쇤베르크(Schönberg)의 12음 음악과 비교했을 때 더욱 강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도르노조차도 자신의 '신음악'의 철학에 대한 논의 안에서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Stravinsky)를 비교하고 있지,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아도르노는 슈트라우스의 음악을 비난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기까지 한다(아도르노 전집 16권, Musikalische Schriften III 참조)). 그렇다면 이러한 슈트라우스의 '말년성'을 우리는 단지 하나의 단순한 '퇴행' 내지 '안착' 혹은, 가장 좋게 말해서, 거장 작곡가가 지닌 천재성의 유희ㅡ비유하자면, 슈트라우스는 때로는 바그너 스타일로, 또 때로는 모차르트 스타일로도 작곡할 수 있었던 작곡의 '달인'이지 않았나 하는 일종의 '체념'ㅡ로서만 받아들여야 할까. '비평가'로서의 사이드가 후기 슈트라우스 음악의 '메타음악적' 성격 안에서 찾아낸 대답은, 말하자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며, 이것이 바로 사이드가 생각하는 슈트라우스적 말년성이 지닌 '파국'의 형식이었다. 이에 관해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웠던 단언이지만, 이 비평적 혜안만은 높이 사고 싶어진다):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작곡가들이 담고자 했던 형이상학적 진술을 가볍게 무시하며, 음악에 아무런 불평도 싣지 않아 귀에 유쾌하게 들리고 그 때문에 놀라움마저 안겨준다. 말년성과 부조화의 감각이 지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으며, 슈트라우스의 말년의 음악은 그가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적합한 선택이었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79쪽.

▷ 2005년 시즌에 로스 앤젤레스 오페라의 레퍼토리로 공연되었던 <장미의 기사>의 몇몇 장면들.
3)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말년성'에 천착하면서 '18세기 양식으로서의 복귀'를 발견하고 기술하는 사이드의 가장 근본적인 기조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한 음악가의 개인사 또는 전체적인 음악사의 서술에 있어서 우리가 지극히 '관습적'이고 '제도적'으로 전제하게 되는 일직선적인 발전 단계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띠고 있다. 따라서 말년성이라는 문제는ㅡ특히나 이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대한 서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인데ㅡ전기와 중기와 후기 등 시기 구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의 예술적 결단과 행동의 양식을 파악하고 서술할 수 있는 하나의 '범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기준에서 볼 때 사이드의 이 책이 갖는 '비평적' 중요성이라 할 것은, 바로 '말년' 또는 '후기'라는 시기 구분의 용어를 단순한 시간적 구획이나 분류로서가 아니라 이렇듯 일종의 기술적/개념적 범주로서 뜻매김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바꿔서 말하자면, 사이드의 비평 언어 안에서 '말년성'이란 곧 칸트(Kant)적인 의미에서의 'Kategorie'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특히나 <장미의 기사>는 슈트라우스에게 가장 먼저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걸음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분기점'으로서의 말년성이 시기적/시간적 구속을 넘어서는 어떤 추상성/비시간성의 형식으로 작용하게 됨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슈트라우스적 말년성이 주는 '은밀한 매력'이라고 할밖에.


▷ 주네의 초상: 정체성을 '포획'하고 '분쇄'하기 위한 '가변적' 정체성, 혹은 파국으로서의 연대(連帶). 오른쪽 사진은 주네가 버로스(Burroughs), 긴즈버그(Ginsberg)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걷는, 좀체로 보기 드문 또 하나의 1968년 '명장면'을 담고 있다.
4) 주네에 관한 사이드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은 크게 두 줄기로 요약될 수 있다(그런데 이 두 줄기가 실은 같은 뿌리를 갖는다는 사실이 곧 드러난다, 그것도 아주 'bittersweet'하기 그지없이). 첫째, 사이드와 주네의 이런저런 만남이 남긴 일화들과 그에 관한 회고적 서술이 주는 어떤 즐거움, 둘째, 정체성의 개념을 파괴하는 행위 안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극명히 드러내고 있는, 주네의 초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어떤 괴로움: 사이드는 데리다(Derrida)에 관한 섭섭함을 고백하며 다소 '애교스러운'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사르트르(Sartre)에 대해 강한 정치적 불만들을 토로하기도 하는 등 사상가들 사이의 만남이 발생시키는 이런저런 일화와 이면들의 재미를 전해주고 있는 반면, 때로는 알제리인들 사이에, 때로는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 서 있었던 주네의 초상을 제시하면서 사이드 자신을 주네와 '등치'시키기도 하고 또 그와 모종의 거리를 두기도 하는 등 '경계인'의 고통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 것이다. 주네와 사이드 자신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경계[인]적' 특징이란, 곧 그들의 지적 궤적이ㅡ물리적인 의미에서든 정신적인 의미에서든ㅡ일종의 '여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ㅡ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물리적 의미에서든 정신적 의미에서든ㅡ자신의 도시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를 거의 떠나지 않았던 저 칸트의 '지적' 여정과는 전혀 다른 경로와 밀도를 보여준다(칸트의 이 '떠나지 않음'이 여기서 비난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라는 점을 끝내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고색창연한 나의 노파심이란!). 사이드는 주네의 희곡 『병풍들(Les paravents)』을 통해서 이러한 [주네의] 여정이 지닌 어떤 '목적의식'을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섬뜩하고 집요하고 때로는 코믹한 연극적 과정도 보이는 이 희곡의 위대성은 단지 권력과 역사를 가진 프랑스 제국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세심하고 논리적으로 발가벗겼다는 데 있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25쪽.
추측을 해보자면, 사이드는 어쩌면 주네의 희곡 『병풍들』 안에서 '정치적 아르토(Artaud)'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르토 자신의 '여정'도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한 경로를 노정(露呈)하고 있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이들을 대할 때 느끼게 되는, 다소 정서적으로ㅡ그리고 개념적으로ㅡ'이국적인(exotic)'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어떤 감정의 실체 또한,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기분이 된다. 그런데 이 '이국적'인 질감의 정서, 그래서 '이질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이 특수한 '코스모폴리탄'의 정체성은 과연 말 그대로 하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이런 질문을 새삼 던지는 이유는, 이 '이국적'인 정체성이란 다소 거칠게 말해 일종의 '非유럽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것이 나에게 '이국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정서가 사실 한 번의 '여과 과정'을 더 거친 복합적인 과정의 산물이므로, 말하자면 이는 '비유럽적 유럽인'의 정체성이 '동아시아'에 속한 한 개인(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가에 대한, 내 나름의 '정서적' 답변이기 때문이다). 조금 뒤이어서 사이드는 주네에게 있어 정체성이 갖는 의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다소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체성은 우리가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혹은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어떤 것이다. 문화의 논리와 가족의 논리가 여기에 더해져서 정체성의 위력을 증대시킨다. 주네처럼 비행을 저지르고 격리되고, 또 권위를 위반하는 재능이 있고 이를 즐기는 사람은 그로 인해 자신에게 부과된 정체성의 희생자이므로, 그에게 정체성은 결연하게 반대해야 할 무엇이다. 무엇보다 주네가 선택한 알제리와 팔레스타인 같은 장소를 볼 때, 정체성은 더 강력한 문화, 더 발전한 사회가 자신보다 못하다고 판결된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자신을 부과하는 과정이다. 제국주의는 정체성의 수출품이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28-129쪽.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저자 혹은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의 저자로서의 면모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주네의 모습을 사이드 자신의 또 다른 초상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일종의 '회고록적' 또는 '자서전적' 작업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사이드가 이 글에서 '선택'한 주네의 작품이 바로 『사랑의 포로(Un captif amoureux)』라는 사실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사이드의 마지막 책들 중의 하나인 이 '말년의 양식'에 대한 연구서가 주네의 저 회고록적이고 자서전적인 'swan song'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맞닥뜨릴 때 갖게 되는 묘한 '기시감(déjà-vu)' 내지 '동시성(synchronisme)'은, 이 글을 읽는 과정 안에 숨겨진 또 하나의 묘미라고 말하고 싶다. 한 명의 '이국인'으로서, 자신보다 하나의 '여과 과정'을 역방향으로 더 거친 또 다른 '이국인' 주네를 바라보는 사이드의 심정은, 아마도 『사랑의 포로』에 대한 독해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바라본 주네의 '말년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렇게 심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다소 '감상적'인 추측 한 자락, 이렇게 남겨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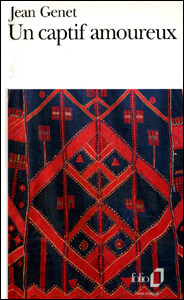
▷ Jean Genet, Œuvres complètes, tome 5, Paris: Gallimard, 1979.
▷ Jean Genet, Un captif amoureux, Paris: Gallimard(coll. "Folio"), 1995(1986¹).
5) 여담이지만, 여기서 주네의 희곡 『병풍들』의 주인공 이름이 '사이드(Saïd)'임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작은 묘미가 될 것이다. 사이드가 이 등장인물 '사이드'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천착하고 있는 '배반'의 주제, 이탈하고 위반하는 것으로서의 부정적/파괴적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따라서 이 책의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배반자' 또는 '위반자'로서의 정체성이란 어쩌면 '여행자'와 '관광객'의 정체성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여행자'란 단순히 '방관자'일 수만은 없다. 마치 벤야민(Benjamin)의 산보객(flâneur)이 그러한 것처럼, 또는 어쩌면 소설가 구보 선생의 일일이 그러한 것처럼. 사이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따라서 주네는 정체성을 넘나드는 여행자, 혁명적이고 끊임없이 선동적이기만 하다면 자신과 무관한 대의명분에 기꺼이 몸 바치려고 밖으로 떠나는 관광객이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29쪽.
이는 사실 에둘러 도달한 사이드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이집트와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대학에서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사이드에게, 주네가 드러내는 '말년성'의 형식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외부성의 거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오래된 개인적 의문을 다시금 발음해보는 것일 뿐: 왜 소설가의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며', 왜 비평가의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비평가의 대상이 언제나 '자기 자신'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반론은 물론이고, 소설의 영역에서도 문학상이나 특집호에 의례적이고 관습적으로 따라붙는 소위 '자전적' 소설이란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반문 또한 전혀 별다른 공격이 되지 못한다. 소설가와 비평가라는 '정체성' 개념에 대한 이런 종류의 '보편화'에는 '숙명적'인 어떤 것이 있다. 이러한 '숙명'에 있어서는, 저 두 정체성이 각기 자신만의 것으로 품고 있는 '진실성'의 형식만이 문제가 된다. 소설가의 정체성이 갖는 진실성이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이며, 반면 비평가의 정체성이 갖는 진실성이란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에 기대어 자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형식'인 것, 말하자면 이것이 근대문학적 정체성에 대한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리(theorem)이다. 따라서ㅡ사이드의 말대로ㅡ이러한 정체성의 수출품이 무엇보다 "제국주의"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저 정체성이란 먼저 '근대성이 생산해낸 상품'인 것이다.


▷ Jean-Paul Sartre, Saint Genet. Comédien et martyr
(Œuvres complètes de Jean Genet, tome 1), Paris: Gallimard, 1952.
▷ Jean-Paul Sartre, Saint Genet: Actor and Martyr(trans. by Bernard Frechtman),
New York: George Braziller, 1963.
6) 주네의 이름 위에는 언제나ㅡ부정적인 의미에서든 긍정적인 의미에서든ㅡ저 사르트르의 이름이 지닌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는 인상을, 나는 오래 전부터 일종의 '경련'처럼 갖고 있었다(이후 바타이유(Bataille)의 주네 비평을 접하고, 또 『조종(Glas)』에서 데리다가 헤겔(Hegel)을 씨실 삼고 주네를 날실 삼아 짜나간 '직물(texture)'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러한 사르트르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그림자가 여전히 내게 강력한 '잔상'으로 다가오는 현상은 지금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여러 '정황적'이고 '역사적'인 요인들을 배제한다면, 아마도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위의 책, 곧 불어본으로 700쪽에 달하고 영역본으로도 600쪽을 훌쩍 넘겨버리는 사르트르의 『聖 주네』가 지닌 강렬한 존재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다만 언제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은 바로 사르트르의 이 책이 갈리마르 출판사의 주네 전집 1권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배우이자 순교자'로서의 주네에 대한 사르트르의 '넘치는 애정'을 생각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도한 처사, 혹은 더 나아가서 주네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역차별'이라는 생각까지 머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맥락에서, 사이드가 인용하고 있는 주네의 몇 마디 말들이 나를 한껏 미소 짓게 했음을 고백한다(같이 읽으며 함께 미소를 머금었으면 하는 마음 한 자락, 그 미소가 비록 '썩소'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르트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네는 자신에 대한 방대한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 약간은 거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 친구가 나를 성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래도 좋아요."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 편을 강력하게 드는 사르트르의 입장에 대해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파리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할까봐 두려워하는 겁쟁이입니다." 7년 후[사이드와 주네의 이 만남이 있었던 것은 1972년이었다ㅡ람혼] 파리에서 시몬 드 보부아르와 사르트르가 주최한 중동 지역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나는 오랫동안 내가 존경해온 서양의 위대한 지성이 시오니즘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깨닫고는 주네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래서인지 사르트르는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고통을 참아야 했는지 세미나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20쪽.

▷ 글렌 굴드, '지식인 비르투오소(virtuoso)'의 초상.
7) 책을 읽는 사람이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Vice versa, of course!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가끔씩 이 두 종류의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왔다는 사실이다. '두 종류의 인간'이라고 아예 분류하고 서로 격리시키기까지 해버렸으므로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이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딱 그만큼, 뛰어넘기가 극히 어렵다(나의 이 문장 형식에 주목하기 바란다: 나는 결코 "사람들이 이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은 사실 쉽게 뛰어넘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또한 "사람들이 이 장벽을 뛰어넘기가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장벽은 그리 만만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결코 없다). 나의 어조와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한 다소 한탄 섞인 어조로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늘날 문학계 지성과 일반 지식인들은 음악 예술에 대한 실용적 지식이 거의 없고,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음악 기초이론을 배우는 경우가 드물며, 카라얀과 칼라스 같은 몇몇 유명 연주자들의 음반을 구매하는 것을 제외하면 음악 실제에 관한 한 사실상 문맹이다. 서로 다른 연주와 해석 및 양식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모차르트, 베르크, 메시앙 음악에서 화성과 리듬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69쪽.
이 말에 누군가는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반성에 가까운 안타까움 한 조각을 마음 속에 머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이 문장들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착잡한 상념들은, 말하자면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경계'라는 지역적 문제에서부터 '계급 갈등과 교육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책 읽기의 능력과 악보 읽기의 능력을 서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ㅡ그러므로 이는 '능력[들]'과 그것[들]의 결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다소 부박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ㅡ'음악적으로' 사고하고 쓰고자 하는 어떤 시도, 곧 '음악을 사유할' 수 있기 위해 행하는 어떤 노력에 다름 아니다(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는 어떤 '결합'과 '복합'의 문제가 아니다). 말하자면, "지식인 비르투오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이드의 문제의식이란 나에게 이렇게, 이런 걸음으로, 이런 그림자로 다가오는 어떤 물음 한 자락이다: 지식인 비르투오소란 무엇인가. 나는 예전에 이러한 종류의 '정체성'을 사군자를 그리고 거문고를 뜯는 선비의 자리에 비유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러한 정체성이 주류와 비주류, 본류와 지류, 본업과 취미를 나누는 분류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먹으로 난을 치고 풍류 가락을 읊조리는 것을 단순한 선비의 망중한이나 심심파적으로 치부한다면ㅡ어떤 현상이 역사적으로 '그러했다'라고 말하는 일과 그러한 현상의 비유를 통해 어떤 개념을 재정립하는 일은 서로 별개의 문제임을 따로 밝히고 지나가는 것 또한 나의 저 빌어먹을 노파심의 발로일 텐데ㅡ'지식인 비르투오소'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란 실로 요원하다. 그것은 어쩌면, 이미 실로 오래되고 낡아빠지게 돼버린 단어 하나, 곧 '총체성(Totalität)'이라는 단어의 너덜거리는 한 자락을 얻기 위한 도정에 다름 아니다(하지만 이러한 총체성이 아무리 너덜거리고 낡아빠진 '시대착오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게는 참으로 소중한, '드물고 고귀한' 여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문제적 말년성을 드러내는 굴드의 '문제적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사이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더 정확하게는, 아무리 해도 다음과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
그가 비르투오시티를 의식적으로 재설정하고 재정립하여 도달하려 한 결론은 일반적으로 연주자가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여 담론을 만들어내는 지식인들의 영역에 속한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76쪽.
이 문장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라는 부사이다. '일반적으로', 곧 여기서는 '뭉뚱그려'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는 것, 또한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는 '뭉뚱그려' 말하지 않고서는 이를 달리 쓸 수 없었다는 것,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모호한 '비언어(非言語)'의 지점이다. 곧 굴드가 목표로 했던 지점은 "언어를 사용하여 담론을 만들어내는 지식인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단은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언어'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섬세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사이드가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굴드가 비르투오소로서 거둔 성취의 극적인 면은, 그의 연주가 명백한 수사학적 양식을 통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악 연주자들이 시도하지 않고 어쩌면 시도할 수도 없는 특정한 유형의 진술로서도 전달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전문화 시대, 반인본주의적인 원자화 시대에 연속성, 합리적 지성, 미적 아름다움의 가치를 주장하는 진술이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88쪽.
이러한 "특정한 유형의 진술"은 물론 "대부분의 음악 연주자들"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술'과 '서술'을 업으로 하는 자, 곧 책을 읽고 쓰는 자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굴드의 말년이 지닌 '매력'은, 바로 이러한 모호함과 경계성에, 곧 가장 합리적인 지성이 빛을 발하는 미(美)의 가치를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성으로, 가장 언어적이지 않은 언어로 '진술'하는 것에 있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굴드의 '말년성'이 지닌 파국의 성격을 나름대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닐까 하는 것. 이어서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결국 굴드에게 바흐의 음악은 도처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느 부정과 무질서에 맞서는 데서 본질적인 힘을 과시하는 합리적 체계의 등장을 보여주는 원형 같은 것이다. 이것을 피아노로 실현하려면 연주자는 스스로를 소비하는 대중이 아니라 작곡가와 일치시켜야 한다.
ㅡ 『말년의 양식에 관하여』, 188쪽.
이 문장들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던 부분은 바로 "이것을 피아노로 실현하려면"이라는 말이었다. 굴드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부정과 무질서에 맞서는 데서 본질적인 힘을 과시하는 합리적 체계의 등장을 보여주는 원형" 같은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저 "원형"이란 그 화려한 수사와 엄청난 무게감에 비할 때 너무나 '단순한' 것이다. 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오로지 '피아노로써[만] 실현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언어가 아니라 피아노로써 '실연(實演)'하고 또 '실현(實現)'해야만 한다. 내가 굴드의 모호함 또는 경계성, 혹은 굴드의 말년성만이 지닌 파국의 성격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말하자면 '지식인 비르투오소'의 파국적 성격이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스스로를 [...] 작곡가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식인 비르투오소의 이 '선택적 책무'가, 연주자가 연주에 임할 때 작곡가의 '의도'나 '정신'과 혼연일체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따위의 '랑만적인' 지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고 싶다. 굴드가 뛰어난 '비르투오소'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연주의 과정을 통해 작곡의 과정이 새롭게 "창안"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굴드가 생각했던 [바흐적] '인벤션(invention)'의 진정한 의미였다. 연주 자체가 선사할 수 있는 희열과 더불어 '작용 중인 현재(le présent en acte)', 곧 '작곡 중인 작품'을 가장 '현재적으로' 드러낸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지식인 비르투오소'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다시 묻게 되는 저 오래된 질문은 실로 간단하고 단순하다: 책 읽는[쓰는] 자와 음악 듣는[만드는] 자는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헤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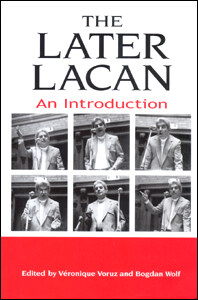
▷ Véronique Voruz, Bogdan Wolf(eds.), The Later Lacan: an Introduc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8) 내가 사이드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새롭게 떠올려보게 된 책은 작년 뉴욕 주립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논문집 『후기 라캉: 입문(The Later Lacan: an Introduction)』이다. '실재계(le réel)'에 대한 강조와 집중으로 거칠게 요약되는 이른바 '후기' 라캉을 사이드가 말한 '말년성'의 형식으로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소박한 물음 때문이었다. 특히나 이 책은 '임상' 분야와 관련하여 '후기' 라캉적 요소들이 어떻게ㅡ신경증(neurosis)의 영역뿐만이 아니라ㅡ정신병(psychosis)의 영역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에서 따로 일독을 요하는 긴요한 책이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라캉의 '말년성'이 지닌 파국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넓은 의미에서 사상사 서술의 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사이드에게 보편화된 말년성의 문제가 바로 그렇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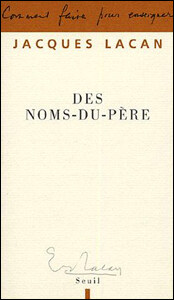
▷ Jacques Lacan, Le séminaire livre XXIII. Le sinthome,
Paris: Seuil(coll. "Le Champ freudien"), 2005.
▷ Jacques Lacan, Des noms-du-père,
Paris: Seuil(coll. "Le Champ freudien"), 2005.
9) 간단히 말하자면 문제는 이런 것이다: 라캉의 '후기' 또는 '말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라캉에게서 '말년성'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파국'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일까. 가장 먼저 라캉의 위상학(topologie)을 떠올려보자. 'S(symbolique)'에 찍혔던 강조점이 이제는 'R(réel)'로 옮겨지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곧 기표와 상징계로부터 향유와 실재계로 좌표축이 이동한 것인가). 혹은 물음을 조금 바꿔보자면, 프로이트의 '말년'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 그의 지형학(Topik)을 한 번 떠올려보자. '후기' 프로이트의 어떤 '이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곧 전의식(vorbewußt)과 의식(bewußt)과 무의식(unbewußt) 사이를 가르는 분류법으로부터 '그것(Es)'과 '자아(Ich)' 그리고 '초자아(Überich)'라는 새로운 범주들에 대한 집중으로 나아가는 노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곧, '언어적'으로 바꿔 말하자면, 이것은 형용사 형태의 기술어 범주로부터 명사/대명사 형태의 기술어 범주로의 이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말하자면 여기서의 문제의식을 이루는 요체는 '지젝(Žižek)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 바꿔 말해 '말년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라캉의 모습이다. 왜 이것은 말년성의 문제로 소급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왜 이것은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이라는 테제로 정식화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먼저, 마르크스(Marx)에 대해 엥겔스(Engels)가 그러한 것처럼, 다시 말해 곧 '마르크스주의'의 효시가 마르크스 자신이 아닌 바로 엥겔스일 수 있는 것처럼, 라캉에 대해 지젝 또한 '라캉주의'라는 하나의 사조에 있어서 엥겔스와 비슷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 한 자락 던져본다. 물론 엥겔스와 지젝의 차이가 분명하고도 섬세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텐데, 말하자면 나는 '교조 없는 교조주의'ㅡ어쩌면 '메시아 없는 메시아주의', 혹은 죽은 데리다가 산 지젝을 '호명'하듯 던지는 괴담 또는 농담 한 자락ㅡ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물음을 슬쩍 던져보는 것은, 다시 한 번 말해서,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인데, 노파심에서 저 예의 '설상가상'과 '중언부언'의 첨언을 다시 삽입하자면, 물론 이는 이른바 '순수한' 형태의 라캉ㅡ또는 '라캉주의'ㅡ을 추출하고 분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10) 무엇보다 라캉주의에 대한 지젝의 영향력이 지닌 중요성은, 라캉의 언어, 정신분석의 언어를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정치적' 언어로 바꾸어놓았다는 점, 곧 라캉의 이론을 하나의 정치[학] 이론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점, 더 나아가 완결된 '구조'를 지닌 하나의 '비평 언어', 곧 하나의 '철학 언어'를 '정립'했다는 점에 있다는 것에는 누구도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단어와 그것의 용법에 민감하고 예민한 이들은 내가 쓴 두세 단어들에서 약간의 껄끄러움을 느낄 법도 한데, 내 생각에 그것은 [완결된] '구조'와 '정립'이라는 단어들 때문이 아닐까 한다. 물론 지젝이 라캉의 '이론'을 하나의 '체계'로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어떤 도표와 범주들로 그것을 환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구조'와 '정립'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언어'로 말하자면, 지젝은 끊임없이 라캉을ㅡ그리고 헤겔을ㅡ'환기'시킬 뿐이다. 나는 '정립'의 행위가 이러한 '환기'의 형식이라고, 그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환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내게는 바로 '구조'이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읽고 쓰고 해석하는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ㅡ말하자면, '사후적으로(nachträglich)'ㅡ그러한 구조의 '정립'에 가닿게 되며, 그러한 한에서 우리는 그 과정과 산출의 형식을 '정립'과 '구조'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말하자면 현대의 이론 영역에서 지젝이 차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 곧 철학자 아닌 철학자, [정치]이론가 아닌 [정치]이론가, [영화]비평가 아닌 [영화]비평가라는 모호한 '경계[인]적' 지위는 바로 이러한 지젝 식의 '구조'와 '정립'ㅡ곧 '환기'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출되는 하나의 '인상'이라는 생각이다(이 점에 있어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에 대해서도 또한 비슷한 '존재 규정'의 근거를 제시해볼 수 있을 텐데, 물론 가라타니의 경우 그가 가장 강력하게 '환기'시켜주는 것은 바로 마르크스, 그리고 근대성(modernity)의 문제이겠지만). 지젝의 초상을 이러한 '정립'과 '구조'의 또 다른 형태, 곧 '환기'로서의 체계라는 새로운 형태에서 바라볼 때, 그가 지속적으로 천착해오고 있는 독일 관념론 체계에 대한 끈질긴 [재]해석의 시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내가 앞서 거칠게나마 요약했던 지젝의 특성은 사실 라캉 안에서도 이미 잠재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글과 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현시'되어 있기까지 한 것. 지젝에 대한 '존재 규정'은 사실 라캉 그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라캉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이었던 것. 말하자면, 라캉 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라캉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 마치 마르크스가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 다음으로, 천연색의 사진 한 장: 지젝은 발을 걷어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리고 있는 것인가. 바꿔 말해, 그는 입고 있는가 벗고 있는가, 혹은 그는 감추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라는 물음. 말하자면,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을 말하면서 지젝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ㅡ어쩌면 '유명론자(nominalist)'의 입장에서ㅡ저 어구 안에 이미 '지젝'이라는 이름이 그 자체로서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니 그보다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젝'이라는 이름을 발설하지 않고서는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이라고 하는 부정어법 그 자체가 도대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그 점들이 나를 홀리고 매혹시킨다. 라캉의 '말년성'이 도달한 곳은, 어쩌면 이러한 지젝의 '청년성'이다.
11) 혹자는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의 영역, 곧 지젝에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고 놓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임상'의 영역이 아닌가 하고 되물을 지 모른다. 곧 이는 라캉 이론이 지닌 '비제도적' 힘들과 '가능성'들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정신]의학계 안에서 라캉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일종의 '불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 '치료'와 '교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라캉 이론의 근본적 입장을 생각해볼 때, 설사 '임상'에 대한 라캉 자신의 끊임없는 환기와 강조를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 '임상'이 이른바 의학 제도 내적인ㅡ혹은 의학의 내부적 '이데올로기'로서의ㅡ'치유'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반드시 상기하도록 하자. 오히려 라캉 이후 그 이론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이론가들의 작업은 이러한 편협한 정의의 '임상'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코 프로이트에게서도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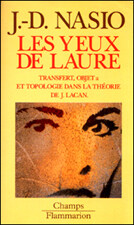
▷ 브루스 핑크, 『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옮김), 민음사, 2002.
▷ 브루스 핑크, 『 에크리 읽기 』(김서영 옮김), 도서출판 b, 2007.
▷ Juan-David Nasio, Les yeux de Laure,
Paris: Flammarion(coll. "Champs"), 1995(1987¹).
12) 라캉의 '말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의 위상학적 요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강조점의 변화로만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라캉의 '말년성', 그 파국의 실체는 바로 [정신]의학의 내부적 이데올로기로서의 '임상'이라는 영역에 대한 부정과 파괴에 있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는 라캉 자신이 여러 차례 행한 임상에 대한 강조와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게 라캉의 '말년성'이란, 곧 '치료/교정'의 '병리학적' 담론으로부터 '주체/윤리'의 '정치학적' 담론으로의 어떤 결정적 '이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이 바로 정신의학에 대해서 언제나 '파국'의 정체성과 효과를 갖게 되는 '말년성'의 실체인 것. 이는 실로 사상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이라는 정식이 내게 중요하게 되는 것은, 라캉을 읽는 데에 있어 '지젝'이라는 항을 소거해버리기 위함이 아니다(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건 오히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이는 곧 지젝 이전에 '이미-언제나' 비평의 언어, 윤리의 언어, 정치의 언어, 철학의 언어가 되고 있는 라캉으로 '돌아가자'는 것, 곧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을 통해 '지젝을 경유해서 온 라캉'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사상사적 '예비학(Propädeutik)'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나의 이러한 '예비학적' 욕망이란 실은 어쩌면 지극히 '후설(Husserl)적'인 일종의 '근본주의(Radikalismus)'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이른바 '라캉으로의 복귀(retour à Lacan)'는 임상이라고 하는 협의의 영역이 지닌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자는 것도 아니고 라캉 이후 후학들의 '인문학적' 세례를 배제한 '순수 라캉'을 새롭게 추출하자는 것도 아니다. 라캉의 '말년성'은 '실재계'라는 영역을 통해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것, 그러므로 그의 '말년'과 그의 '후기' 이론은 어쩌면 그 자체로 하나의 '평행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le réel'이란 무엇인가, 'jouissance'란 무엇인가, 'sinthome'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이러한 라캉의 '말년성'이라는 지평에 섰을 때에만, 그때야 비로소 지젝의 '청년성'이 보이게 된다. 내가 '지젝을 경유하지 않은 라캉'이라는 정식으로 '경유'하고자 하는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고로, 이제서야ㅡ이 잡설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겨우 이제서야ㅡ나는 이렇게 '환대'의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되었고, 또 건네고 싶어지는 것이다: "실재계의 사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

▷ 그리고 다시금, 흑백의 사진 한 장: 저 손짓은 단순한 오케이 사인일까, 그도 아니라면 저 손 자체가 돈에 대한 '환유'라도 된단 말인가. 사진의 기표는 내게 '프랑스'와 '붓다'를 동시에 의미하는 '佛'이라는 문자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었으니, 그리하여 라캉의 이 사진 한 장은, 내게 그 자체로ㅡ그리고 물론, 문자 그대로ㅡ일종의 '상형문자(hiéroglyphe)'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13) 해롤드 핀터(Harold Pinter)의 1996년 작품 『재는 재로(Ashes to Ashes)』에 등장하는 두 인물 데블린(Devlin)과 레베카(Rebecca)의 대사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데블린: [...] 다시 시작하자.
레베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시작했어... 오래 전에. 우리는 시작했지.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우린 다시 끝낼 수는 있지.
데블린: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끝낸 적이 없잖아.
레베카: 아니, 끝낸 적 있어. 끝내고 또 끝내고 또. 그리고 우리는 또 끝낼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데블린: '끝내다'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야? 끝은 끝낸다는 것을 뜻해. '또' 끝낼 수는 없어. 당신은 한 번 끝낼 수 있을 뿐이야.
레베카: 그렇지 않아. 당신은 한 번 끝낼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또 끝낼 수 있지.
ㅡ 해롤드 핀터 전집 9권(오경심 옮김), 평민사, 196쪽[번역은 일부 수정].
'한 번 끝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끝낼 수 있는 것', 그러나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것', 나는 데블린과 레베카의 이 대화가 저 '말년성'에 대한 하나의 훌륭한 알레고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한 번 돌이켜보자면, 사이드가 농담 삼아 혹은 다소 반어적인 어조로 자신을 "아도르노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추종자"라고 말했던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말하자면 그 둘은 모두 음악에 '대해'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적으로' 쓰고 있는 몇 안 되는 저술가들일 터. 그런데 '음악적으로' 쓰고 '음악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지독히도 진부하게 들리는 '낭만주의적' 물음의 형식 사이로 살짝 엿보이는 어떤 오솔길이, 나에게는 가장 지난하고도 고되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동시에 가장 '매혹적'이고도 가장 '색정적'인 것임에야.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니 이 '전체-아님(pas-tout)'은, 마치 주네를 에둘러 도달한 사이드 자신의 저 '자서전적' 고백처럼, 에둘러 고백하게 된 나의 '제국주의적' 정체성ㅡ혹은 임화(林和)의 저 유명한 표현을 차용하자면, 나의 '이식된' 정체성ㅡ에 대한 자가진단에 다름 아닌 것이 되고 있는데, '지식인 비르투오소'를 향한 '도착적' 음악 작업, '비평[가] 아닌 비평[가]'을 향한 '혼성적' 글쓰기의 작업 등등, 이 뒤틀린 자서전적 욕망의 '해소법'ㅡ혹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향유법'ㅡ에 대한 천착이 아마도 나의 '말년성'ㅡ시간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엄밀하게 형식적인 [의]미에서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잡스러운 생각이, 다시금 하나의 고백이 낳은 또 다른 고백이 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인 것. 이처럼 내게는, 말들이 말들의 꼬리를 집어 삼키고 다시금 내뱉기를 반복하는, 몇 마리인지도 모르는 뱀들이 뒤엉켜 이루고 있는ㅡ혹은 부수고 있는ㅡ'하나의' 정체성이, '문제적 매력'으로서, 곧 '불가능의 말년성'으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한 번만 더 다시 돌이켜보자면, '매력적인 말년'의 사이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저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그렇게.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