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로넨버그의 귀환: 폭력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
1) 두 인물이 저지른/저지르는 범죄와 폭력의 동선을 보여주는 초반부는, 어쩌면 히치콕(Hitchcock)에 대한 오마주, 혹은 타란티노(Tarantino)에 대한 패러디처럼 보인다. 오랜만에 돌아온 데이비드 크로넨버그(David Cronenberg) 감독의 <폭력의 역사(A History of Violence)>의 이러한 도입부는, 사실 히치콕의 저 '맥거핀(MacGuffin) 효과'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실로 오랜만에, 영화 <사이코(Psycho)>의 저 유명한 도입부 시퀀스들을 떠올려보라). 사실 타란티노도 과거 자신의 각본(로드리게즈(Rodriguez) 감독의 <황혼에서 새벽까지(From Dusk till Dawn)>)에 히치콕의 '맥거핀'을 멋지고 황당한 방식으로 도입했던 '전과'가 있다. 이 '맥거핀'에 이끌려온 관객에게 크로넨버그가 던지고 있는 '영화적' 질문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과연 저렇게 총을 잘 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한 자락. '일반적인' 액션 영화의 문법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지는 않는다: '왜, 주인공은 수백 발의 총알을 남김 없이 피해가는데, 나쁜 놈들은 맞은 것 같지도 않은 총알에 온몸을 날리며 오버 하면서 죽어가는 거지?', '왜, 주인공은 팔이나 다리에 총알을 맞았을 때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스토리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거지?' 사실 <폭력의 역사>의 주인공 '톰'의 영웅적인 행동에서 관객이 처음으로 놓치게 되는[혹은 '놓쳐야만 하는'] 포인트는, 이런 '당연한' 질문들의 '자연스러운' 부재, 영화가 영화가 될 수 있는 그 지극히 당연한 '부재'의 조건들에 대한 물음이다.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 '가능조건'에 대한 물음들 속에 이미 '톰'의 정체가 숨겨져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크로넨버그는 장르의 '문법' 자체로 이미 하나의 '트릭'을 실행하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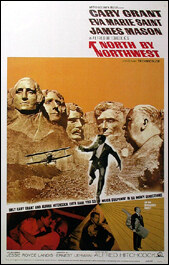
▷ 크로넨버그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먼저 히치콕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던 것들: '맥거핀'과 '오인'.
2) 영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오해가 있다. 왜 우리의 '적'들은 우리의 주인공 '톰(Tom)'을 '조이(Joy)'로 '오해'하는가? 사실 <폭력의 역사>의 중심선을 이루는 이러한 '오해'는ㅡ또 다시 한 번 더ㅡ히치콕의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North by Northwest)>의 '오해'와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이 두 영화가 가리키고 있는 대척점들은 다음과 같다: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을 '그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 크로넨버그가 다루고자 하는 오해는 바로 후자의 '오인(méconnaissance)'이다. 이 문제는 사실 '도펠갱어(Doppelgänger)'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사람'으로 '오해' 받는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또 의식하고 있다. <폭력의 역사>가 제기하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식/무의식의 이항적 문제 혹은 어떤 병리적인 성격을 띠는 '신비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름[들]'이라고 하는 지극히 '물질적' 기호들 안에 놓여 있는 어떤 '신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비유하자면, 이는 '지킬과 하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마르크스의 '화폐론'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 영화 안에서 '톰'과 '조이'라는 이름, 그리고 '스톨(Stall)'이라는 성(姓)에 대한 대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neo-nominalism(?) 철학자'로서의 크로넨버그는 이 문제를 그리 쉽사리 놓치지 않는다. '정체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는 '가족'의 모습 또한, 예를 들자면, 큐브릭(Kubrick)의 <샤이닝(Shining)>에서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지극히 '실재적'인 것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폭력의 역사>의 주인공 '톰'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이름, 곧 '두 얼굴 아닌 두 얼굴'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크로넨버그는 <스파이더(Spider)>(2002)ㅡ그 '심각한 무게감'에 호응하는 '재미'는 떨어졌던ㅡ이후 조금 '쇠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폭력의 역사> 역시 '전성기'의 크로넨버그를 떠올려본다면 조금 '약한' 감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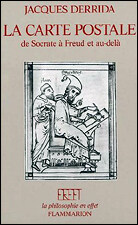
▷ Jacques Lacan, Écrits, Paris: Seuil(coll. "Le Champ freudien"), 1966.
▷ Slavoj Žižek, Enjoy Your Symptom!, New York, London: Routledge, 2001(1992¹).
▷ Jacques Derrida, La carte postale,
Paris: Flammarion(coll. "La Philosophie en effet), 1980.
3) 하나의 '절대적' 명제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편지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착한다(une lettre arrive toujours à destination)"는 것(Écrits, p.41).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청산될 수밖에 없다. 톰이 피하려고 했으나 다시 만나게 되는 저 '살의의 단층' 역시 바로 이러한 '채무의 청산'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는 언제나 수신자에게 도착한다, 도착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만을 지적하자면, 지젝(Žižek)이 '단순화'하고 있는 것처럼, 데리다(Derrida)가 꼭 '편지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순진하게 묻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데리다의 저작들 중에서도 특히나 그의 '뇌'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의 '절창(絶唱)'이라 해야 할 저 '우편엽서'ㅡ이 '우편엽서' 역시, 언제나, 언젠가, '수신자'에게 도달할 것이 아닌가ㅡ의 내용은 그저 그렇게 '단순화'시켜 요약할 수 없다는, 짧은 반론 한 자락만을 언급한 채 지나가기로 한다(언제나처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각의 저자가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의도된 '단순화'라는 오류에 대한 '본능적' 경계, 그리고ㅡ그러한 '경계'의 일환으로ㅡ각각의 저자를 '무식하리만치' 또박또박 읽어나갈 수밖에 없는 독서하기의 지난함,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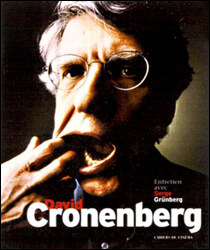
▷ Serge Grünberg, David Cronenberg, Paris: Cahiers du cinéma, 2000.
4) 이 영화는, 물론, 폭력에 대한 '일반사(一般史)'가 아니다. 제목 그대로 폭력에 대한 '하나의(a)' 역사/이야기(history/story)일 뿐이다. 폭력의 역사/이야기는 곧 '그의 이야기(his story)'가 된다. 이 영화가 폭력 이야기로서의 '보편성'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체성' 안에서일 뿐이다. 그런데 떠올려보자면, 크로넨버그의 '보편성'이라 할 것은 사실 언제나 크로넨버그 영화들의 저 지독한 '단독성'으로부터 연유하고 있었다는 생각 한 자락. 크로넨버그에 대한 책으로는 카이에 뒤 시네마에서 출간된 위의 인터뷰를 추천한다. 고향인 캐나다에서 찍었던 그의 초창기 영화들에서부터 이 책의 출간 당시 최신작이었던 <엑시스텐츠(eXistenZ)>(1999)에 이르기까지, 크로넨버그의 육성 그대로 영화에 대한 그의 '사유'를 읽어낼 수 있는 소중한 책이라는 생각이다. 일독을 권한다.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