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러시아 혁명사 1 』, 거름, 1987.
▷ 『 러시아 혁명사 2 』, 거름, 1987.
1) 먼 기억 한 자락. 대학 다닐 때의 일이다. 평소 흠모하며 따르던 선배 하나가 내게 넌지시 물었다(그런 선배는 내게는 정말 드물다): "람혼아, 만약 혁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혁명에 투신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니?" 때는 연세대학교 안에 고립되어 있던 한총련이 '초토화'된 직후였고, 그때 나는 아직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의 신분일 뿐이었다. 무던히도 책 속에 파묻혀 살던 시절이었다. 걸신이 들렸다는 표현이 아마 맞을 것이다,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읽던 시절이었으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다(비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음악만 들었다). 수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반면 책 속에 나오는 말들은 오히려 생생히 살아 있었다(실로 끔찍한 '쌍생아'와도 같은 이러한 '후일담'의 재판은, 말하자면 반복강박적인 것일까). 시간은 흘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해가 되었고, 신입생들에게 마르크스의 책을 선물해주는 동기와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참을 수 없는 경멸감을 느끼며 그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단적인 예로 당시 내가 썼던 글 중에는 '마르크스'와 '맑스'라는 표기법의 차이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기호학적' 고찰이라 이름할 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러한 지극히 '미시적'인 작업 역시 그러한 경멸감의 한 표현일 뿐이었다). 동아리나 학회에서 '자행'되는 학습은 '정치적 마초'들만을 양산하고 있을 뿐이었다(나는 심지어 페미니즘 학회 안에서도 '페미니즘적 마초'들이 양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선배의 저 질문을 떠올리며, 저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겉으로는 '혁명'을 말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이 '혁명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마르크스/엥겔스 저작 선집을 신입생들의 고운 두 손에 쥐어주면서도, 오히려 저들은 전혀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틈틈이 <자본>을 읽었고 고등학교 책상 서랍 안에 항상 계간지 <이론>을 넣어두고 쉬는 시간마다 꺼내보았던 나에게, 저들의 마르크스에 대한 거의 '종교적인' 숭배는 오히려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인민에게 아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그 아편은 '마르크스'라는 종교라고 해도 상관 없었는지 모른다). 그 스스로가 '시대착오적'인 한 인간에게는, 어떤 교의를 혁명을 위한 '초급 과정'으로 이해하고 전수하고자 하는ㅡ그리고는 모두 다 '뗐다고' 선언하곤 하는ㅡ저들의 '시대착오적' 행동은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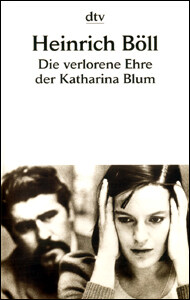

▷ Heinrich Böll,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Münche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95(Köln: Kiepenheuer & Witsch, 1974¹).
▷ 하인리히 뵐, 『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김연수 옮김), 민음사, 2008.
2) 가까운 기억 한 자락. 벌써 수개월 전이지만, 2008년 5월 8일자 중앙일보를 읽으면서 몇 가지 메모를 해둔 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학생 집회 참가 종용하는 세력 많다."(4면) 10면의 작은 상자 기사 하나는 아예 이런 소제목을 달고 있었다: "촛불 집회 고교생 '김정일이 더 위대' 발언도"... 그 중 압권은 35면 한쪽에 위치한, 제갈량의 고사를 인용해 한껏 멋을 부린 한 칼럼이었는데, 그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뿌리깊은 나무처럼 고요해 결국은 좋은 꽃과 열매를 맺으려 힘을 쏟아야 할 우리 청소년이 쉬이 흔들린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싼 비판이 수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상한 호소력을 발휘해 도심의 촛불 시위대로 나서게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들의 평정심을 흔드는 사람들이 더 문제다. 배우는 젊은이에게 평담함과 고요한 마음을 가르치진 못할망정 편견과 예단을 주입해 부추기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지, 또 뭘 원하는지 정말 알고 싶다." 결국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의 평정심이 흔들리고 있음을 역으로 고백하고만 결과가 되어버린 이런 칼럼과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수도 없이 봐야만 했다. 허울뿐인 변명과 판에 박힌 거짓말들,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망령의 부활 역시 수도 없이 목격해야만 했다.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에 대한 인상이 이러한 세태 위로 겹쳐지면서,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착잡한 기분으로 저 카타리나의 '희비극적' 살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쓰린 마음이 되었다. 뵐의 언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말하자면ㅡ현실과 허구의 황색 언론들이 지닌 유사성은 물론이거니와 저 카타리나의 '살인' 역시ㅡ, 정말이지 "의도한 바도, 우연의 산물도 아닌, 그저 불가피한 일일 뿐이다(weder beabsichtigt noch zufällig, sondern unvermeidlich)."


▷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 칼 마르크스 전기. 첫째 권 』(김라합 옮김),
소나무, 1989.
▷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 『 칼 마르크스 전기. 둘째 권 』(김라합 옮김),
소나무, 1989.
3) 먼 기억 또 한 자락.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의 일이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후배 하나가 내게 넌지시 물었다(이런 후배 역시 내게는 매우 드물다): "람혼, 선배는 자신이 맑스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이 뜬금없는, [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단 후에,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맑스주의자'일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답했다. 돌이켜보면, 실로 '선배스러운' 비겁한 대답일 뿐이었다. 스스로를 어떤 '~주의자'라고 선언하는 것은 얼마나 편협하고 옹졸한가, 하지만 또한 동시에 얼마나 아름답고 단순한가. 이 두 극단적인 규정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진자가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어지럽게 왕복하고 있었다(지젝은 어느 강연에서 그의 라캉주의가 지닌 어떤 교조적 '편협함'을 지적하는 한 청중을 향해 화를 낼 정도로 흥분하며 당당하게 자신은 '라캉주의자'라고, 그렇다고, 그뿐이라고 일갈한다, 오히려 그는 그 청중에게 반문한다, 왜 '데리다주의자'들에게는 데리다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읽지도 않고 잘도 떠들어댄다. 어떤 '~주의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지, 또한 얼마나 아름답도록 단순한 일인 지 모른 채로, 그저 어떤 '~주의'라는 것에 대해 쉽게 말하고 쉽게 단정해버린다, 그것도 편협하고 옹졸한 방식으로 그렇게 해버린다. 방대한 분량의 책에는 으레 몇 군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오식들을 계속 고치면서, 나는 라비노비치(Rabinowitch)의 『혁명의 시간(The Bolsheviks Come to Power)』을 최근 몇 달 동안 틈틈이 되새김질하며 읽었다. 이런 과정에 으레 따라붙게 될 수밖에 없는 연상작용의 결과로, 나는 다시금 서가에서 옛날 책들을 하나씩 꺼내들었다. 줄이 쳐져 있는, 그때는 왜 이곳에 줄을 쳤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책의 책장들을 넘겨보면서, 나는 내 자신의 '법 앞에서'ㅡ카프카를 기억하라!ㅡ다시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람혼, 당신은 '맑스주의자'입니까, 혹여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 먼저, 당신은 무엇보다 어떤 '~주의자'였던 적이 있습니까?"


▷ 알렉산더 라비노비치, 『 혁명의 시간 』(류한수 옮김), 교양인, 2008.
▷ 스보로프(Suvorov), 『 레닌주의의 재해석 』(유명훈 옮김), 세계, 1988.
4) 풍경 한 자락. 어제는 일이 있어 실로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다. 10년 넘는 세월을 뵈어온 은사님이 오래 품어두었던 편지칼(paperknife)과 문진(paperweight)을 품에서 꺼내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들을 받아드는데, 왠지 코끝이 찡했다. 단순한 감사의 감정과 감동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를 나오면서, 여전히 학교 한 구석의 정원을 고집스레 손수 손질하고 계신 은사님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계단을 오르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이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느낌 때문에 오히려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저녁이 어슴프레 내리깔리기 시작하는, 이제는 마치 열대우림 같은 곳이 되어버린 학교를 뒤로 하고,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를 쫓듯이 가쁜 숨으로 그곳을 빠져나왔다. 어떤 회상과 뒤섞여버린 풍경 한 자락은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언젠가 내 지음(知音)이 창안했던 저 촌철살인의 명언처럼, 때때로, 머리는 몸에 좋지 않다.

5) 잡설 한 자락.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다면,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 가장 '극적(劇的/極的)'인ㅡ어쩌면 '선적(禪的)'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을ㅡ진리를, 지금의 이 시점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던 자들에게 닥친 위험을 생각하면서, '위기'는 없다고 외치던 자들에게 닥친 위기를 떠올리면서ㅡ그리고 더불어 어떤 '확률(0.0......01%)'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던 자들이 내건 또 다른 도박적 확률(7%)을 생각하면서)ㅡ,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행할 수 있는, 행해야만 하는, 어떤 '혁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불가능성(impossibilité)'으로서의 혁명이다. 어쩌면 이런 '혁명'이란, 여전히 말 그대로 편협하고 옹졸한 동시에, 딱 그만큼 아름답고도 단순한 것일 수 있다. 나는 저 작디 작은 칼 한 자루와 가볍기 그지없는 추(錘) 한 덩이로 무엇을 자르고 또 무엇을 붙들어맬 수 있을까, 라는 새삼스러운 질문 한 자락. 하지만 질문[들]은 언제나 생성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누가 굳이 물어봐주지 않아도.
ㅡ 襤魂, 合掌하여 올림.
서지 검색을 위한 알라딘 이미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