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우연한 기회로 김려령 작가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그땐 동화책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로 밖엔 작가님을 알지 못한 때라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작가님께 얼마나 큰 실례였던가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가님에게서 읽었던 섬세함, 따뜻함, 슬픔, 명랑함을 오래 기억했다. 이후 <완득이>를 읽었고 사실 깜짝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득이> 속에도 김려령이라는 사람은 작품 전반에 실려 있었다.
오랜만에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다. <너를 봤어>. 제목을 보는데 너무 읽고 싶어졌다. 너를 너무나 보고 싶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 도대체 '너'는 누구길래,,,,,,
똘재야, 너를 봐서 너무 행복했다.
가장 간단하게 독후감을 말하라면 이 문장이다. 수현의 질척이는 가족사를 읽으면서 그리고 가족의 죽음에 대한 낯선 대응을 보면서도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아마 어느 순간부터 나 역시 수현을 온마음으로 사랑한 모양이다. 예쁜 아저씨 정수현을, 그리고 수현 안에 숨어 있는 나를 몹시도 사랑한 모양이다. 가여워한 모양이다. 똘재가 나타나서 정말 좋았고, 그녀가 수현을 받아주어 다행스러웠고, 수현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주어 고마웠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 독자가 이 소설을 읽고 한번쯤 웃고, 한번쯤 울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위로받은 듯한 웃음을 여러 차례 지었고 세번 크게 울었다. 에필로그에서 두 번, 작가의 말에서 한 번. 그 중 가장 크게 운 것은 작가의 말이었다. 이 소설은 앞의 모든 것들이 켜켜이 쌓여 마지막에 그 모두를 느끼게 하는 소설이었다.
책을 마무리하던 때가 밤이었다는 것이 큰 이유였을까, 아닐 것이다. 전혀 외롭지 않은 밤이었고 울 생각 따윈 하지 않던 시간이었다. 속지에 영재와 도하가 남긴 짧은 인사말에서 터진 울음은 그 밤 내내 한참 이어졌다.
마지막까지 우리였던, 영원히 그러할
당신을 애도하며, 서영재
당신에게 키스를, 윤도하
사랑합니다.
2013년
다음 날 책꽂이에서 <우아한 거짓말>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몇년 전의 자리에서 작가가 자전적 이야기라고 했던가 아끼는 이야기라고 했던가 했던 기억이 나서 <가시 고백>을 뒤로 하고 <우아한 거짓말>을 읽기 시작했다. 천지의 죽음은 좀 이르게 왔다. 봉인된 실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봉인된 눈물이 툭툭 터져 나왔다. 그러다 역시 작가의 말에 이르러 펑펑. <완득이>를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아프면서 슬프고, 슬프면서 아름답고, 아름답기에 결코 절망적이지 않은, 끝에 여운으로 남는 행복감이 있었다. 물론 <완득이>도 그랬다. 다만, 이 두 편의 소설은 마치 김려령이라는 사람의 속에서 그 모든 감정을 싹싹 긁어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아마 다음에 읽을 작가님 소설을 읽다보면 또 맘이 변할 것 같다. 아직 남은 속이 있어서 아직 읽지 못한 소설에서 또한번 그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말이다. 작가의 말마저도 아름다웠다. 작가의 말에 자신의 남은 속을 다 긁어내어 독자에게 주는 것 같았다. 그러하기에 어느 소설을 읽어도 다 사랑할 것 같다. 아프고 슬프고 아름다고 행복한 느낌.
내일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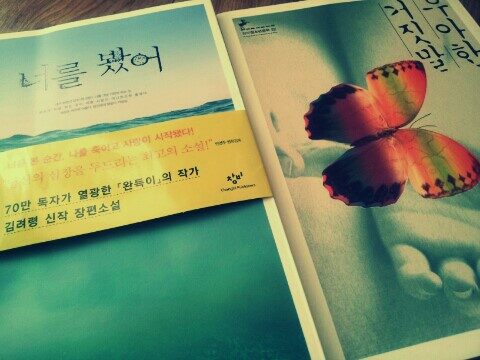
내가 수많은 당신을 죽이며 갈망했던 것이 결국 사랑이었나보다.------이 책을 펼친 당신이 한번쯤 웃었으면 좋겠고 한번쯤 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작은 사랑이 당신에게 가 닿으면 좋겠다.
「너를 봤어」작가의 말 중.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하고 근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버렸다면 보지 못했을, 소소한 기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애초에 나는 큰 것을 바란 게 아니니까요.
「우아한 거짓말」작가의 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