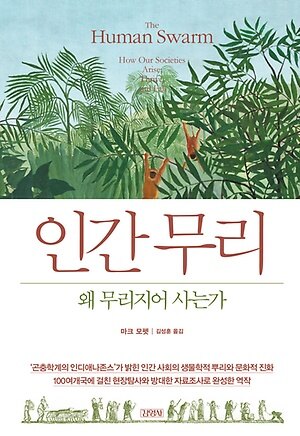-

-
인간 무리, 왜 무리지어 사는가
마크 모펫 지음, 김성훈 옮김 / 김영사 / 2020년 8월
평점 :



【 인간 무리, 왜 무리지어 사는가 】
_마크 모펫 / 김영사
2007년 샌디에이고 근처의 한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개미들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각각 수십억 마리 규모의 아르헨티나개미 초군집 두 무리가 자기네 구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 책 지은이의 목격담이다. 이 책의 밑바탕이 된 개념이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수십억 마리의 개미들은 태극기도 안 들었는데, 아군과 적군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인간은 어떻게 무리를 이뤄 살게 되었을까? 무리를 이뤄 사는 것의 장점이 많을까? 단점이 많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란 무엇일까, 국가란 무엇일까?로 넘어가게 된다. 사회의 일원이 되고 말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에 가깝다. 외부자들이 어떤 조직사회에 받아들여지기까지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린다. 미국의 이민사회만 봐도 알 수 있다. “가족을 제외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위해 맞서 싸우고 목숨도 바치는 제휴관계(affiliation)가 바로 우리 사회다.”
이 책의 지은이 마크 모펫은 개미를 비롯한 곤충의 사회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인간 행동진화학 까지 분야를 넓힌 하버드대학 인간진화생물학과 연구원이다. 지은이는 ‘인간은 왜 무리지어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자연사(史)로부터 선사시대를 거쳐, 문명이 걸어온 지난한 궤적(수메르의 진흙 벽에서부터 세상을 뒤덮은 페이스북까지)을 추적했다. 사회가 얼마나 필연적인 존재인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등 사회의 기원과 유지 및 해체과정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생물학, 인류학, 심리학, 그리고 덤으로 약간의 철학에서 최근에 밝혀진 내용들까지 살펴본다.
사회의 가치를 밝혀내는데 동물 모형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대다수의 눈에는 현존하는 국가들(그 규모를 떠나서)의 형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가라는 틀이 잡히기 전 사람들은 집단 형태로 사회를 이뤄 지구 위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을 뿐이다.
지은이는 이 책을 9챕터로 나눠서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척추동물 사회 알아보기, 포유류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의 관계, 동물들의 이동과 집단의 성공여부, 대부분의 포유동물 사회가 하나로 뭉치려면 구성원들끼리 서로 얼마나(앎의 깊이와 숫자)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곤충들의 사회학, 농업발달 이전의 인간 종의 사회는 어땠을까를 짚어본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정체성 분화는 계속해서 분할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수렵채집인 집단 방식대로 분할되기보다는, 각 민족 집단이 선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리적 경계를 따라 잘게 쪼개지는 경우가 많다.”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다. “기본적으로 애국심이란, 특정 국가를 두고 내가 태어났으니 그 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확신이다.” ‘국뽕’의 사전적 의미로도 손색이 없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