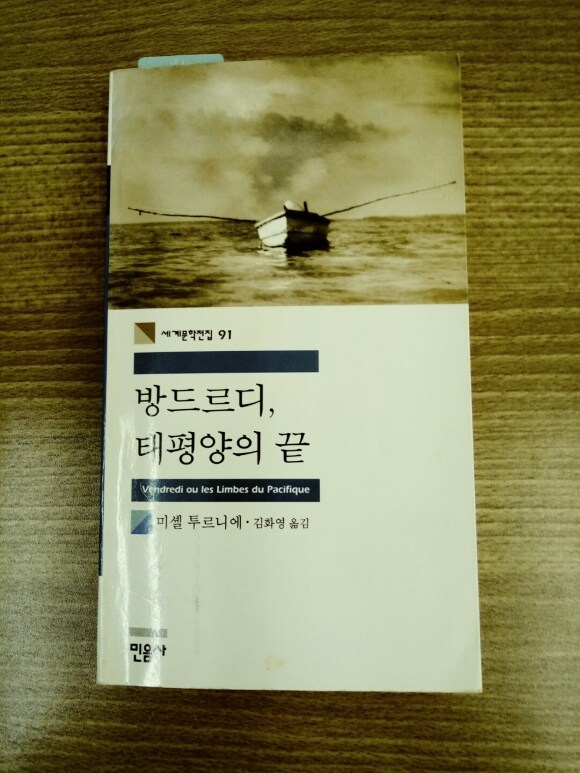-

-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91
미셸 투르니에 지음, 김화영 옮김 / 민음사 / 2003년 11월
평점 :



【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 】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91
_미셸 투르니에 (지은이), 김화영 (옮긴이) | 민음사 | 2003-11-20
| 원제 Vendredi ou les Limbes du Pacifique (1967년)
“그는 여러 날 동안 섬의 지도를 만들고 그의 답사가 진척되어 감에 따라 그 지도를 보충하고 완성했다. 그는 첫날 치욕스러운 ‘탄식의 섬’ 이라고 무거운 이름을 붙였던 이 땅을 다시 명명하기로 결심했다. 성서를 읽으면서 종교적으로는 절망이 더할 수 없는 죄악이며 희망이 신앙의 세 가지 미덕 중의 하나라는 신기한 패러독스를 알게 되고 깊은 인상을 받자 그는 이제부터 그 섬을 스페란차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음악적이고 밝은 이름이었으며 더군다나 그 옛날 그가 요크 대학교의 학생이던 시절 사귀었던 어떤 정열적인 이탈리아 여자와의 추억을 상기시켰다.”
미셸 투르니에가 이 소설을 쓴 목적은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뒤집어 다시 쓴 소설이라고도 한다.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썼을까?
주인공의 이름은 같다. 로빈슨 크루소다. 난파를 당하는 상황까지 같다. 원조 로빈슨과 여러 상황이 겹쳐진다.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소모가 많은 일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혼자 있으면 주의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로빈슨의 고독한 일상은 그의 정신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골몰한 한 가지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겨 가는 일마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 대목에서 로빈슨이 느낀 한 가지 생각은 ‘타인의 존재감’이다. 지금까지 타인은 나의 생각을 흩어놓거나 상처를 주는 존재로만 받아들였는데, 절대 고독의 상황에 처하자 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타인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주의력 전환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길을 찾아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움직이던 로빈슨은 자신이 이름까지 붙여준 섬이 완전한 무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원주민들의 특별한 의식을 훔쳐보게 된 것이다. 그 의식은 섬뜩했다. 무당으로 보이는 존재가 무리 중에서 누군가를 지목하면 그 무리가 지목당한 자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는 광경을 숨어서 본 후 떨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서 방어태세를 갖춘다. 그리고 얼마 후 같은 의식을 멀리서 다시 보게 된다. 그 때 지목당한 자가 도망을 친 방향이 공교롭게 로빈슨이 숨어 있던 곳이었다.
로빈슨과 탈주 원주민의 동거가 시작된다. 로빈슨은 그 원주민 청년에게 ‘방드르디’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에 나오는 영어 이름 ‘프라이데이’나 여기의 불어 이름 ‘방드르디’는 모두 금요일이라는 의미이다. 로빈슨은 그 원주민이 자신이 있는 쪽으로 도망쳐온 날이 금요일이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있던 로빈슨이 금요일인 것은 어찌 알았냐고 따져 물으려다 참기로 한다. 로빈슨이 가끔 제정신인 듯해서 안 건드리는 것이 좋겠다.
다니엘 디포의 ‘프라이데이’나 미셸 투르니에의 ‘방드르디’나 로빈슨이 하인 또는 노예 부리듯 하는 것까지 같이 나간다. 도대체 어디쯤에서 갈라질 것인가? 어떻게 다시 쓰겠다는 이야긴가? 로빈슨과 방드르니는 주종 관계였다가 방드르니가 몰래 담배를 피다가 로빈슨이 난파된 배에서 옮겨온 화약통 40개에 불을 내고, 그 이후 두 사람은 주종 관계가 흐지부지 된다. 이 부분이 원조 로빈슨과의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보면 주종 관계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이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상황에 두 사람은 아예 벌거벗고 생활한다. 그러던 중 난파된 후 처음으로 한 배가 섬에 다가왔다. 로빈슨이 유심히 보니 영국 배였다. 드디어 배가 도착한 후 “오늘이 며칠입니까?”하고 선장에게 묻고 답을 받은 후 날짜를 계산해보니 그새 28년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로빈슨은 그 배를 타고 섬을 탈출할 수 도 있었지만, 섬에 그대로 남기로 결정한다. “그는 ‘버지니아호’(로빈슨이 타고 있다 좌초된 배이름)에 올랐던 저 신앙심 깊고 인색했던 청년보다 지금이 더 젊었다. 그는 그 내부에 부패와 쇠퇴를 향한 어떤 충동을 내포한 생리학적 젊음으로 젊은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이 그에게는 최초의 시작이었으며 세계사의 절대적인 시작이었다.” 표현이 좀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생각이다. 아마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겁이 나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다시 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나?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테니 익숙한 이곳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작가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가? 로빈슨 크루소라는 캐릭터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서구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그대로이다. 백인, 서양인, 영국인 그리고 기독교인. 아울러 서구의 문화유산을 한 몸에 받은 상징적 인물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작가 자신이기도 한 이런 모습이 싫었던 것이다. 문명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가학적이라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리라. 소설의 후반부엔 자연이 문화를 지배하고, 방드르디가 로빈슨을 가르친다. 원시성이 문명을 극복하는 스토리다. 따라서 책의 제목도 로빈슨은 감춰지고 방드르디가 앞에 나섰다.
#방드르디
#태평양의끝
#미셸투르니에
#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