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산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다. 장난처럼 'winter is coming.'이라고 말하며 웃었는데, 정말 겨울이 왔다. 다시 장난처럼 내년 봄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내 뼈를 훑고 지나가는 찬 바람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을 느끼게 한다.

여름 이후 책도 대충 읽고, 일도 대충 하고, 노는 것도 대충 하고, 운동도 대충했다. 아니, 하고 있다. 원래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막상 시작하면 열심히 하곤 했는데, 계절이 추워지면 겨울잠을 자야하는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번 주에도 모든 걸 열심히 하려다가 감기에 걸렸다. 감기 기운을 느끼자마자 병원에 달려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다. 어차피 일주일 아플 거라면 좀 편하게 아프자 싶어서.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를 다시 봤다. 문득 원작 소설이 궁금해서 앤 라이스 소설을 대량 샀고, 미드 '트루 블러드'를 이제서야 보고 샬레인 해리스 소설을 읽기 시작했다. 어쩌면 나는 '뱀파이어'라는 존재를 지나치게 환상적인 존재로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뱀파이어가 나오는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뮤지컬이든 보다보면, 그들의 외모나 탄생 여부를 떠나 존재 자체가 가진 비극성 때문에 연민과 동경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걸 어쩌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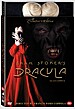
처음에는 모든 악의 집합체 같은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동정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린 뱀파이어. 이 '걸어다니는 시체'가 나를 사로잡은 건 코폴라의 영화 때문이었고, 브램 스토커의 소설 때문이었다. 나중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도 보고, '뱀파이어 다이어리', '문라이트', '트와일라잇', 뮤지컬 '드라큘라'(od, 체코) 등을 보며 더 빠져들긴 했지만, 마치 첫사랑 같은 건 코폴라의 '드라큘라'-게리 올드만-이다. 400년이라는 시간의 대양을 건너 온 남자.

뱀파이어, 드라큘라를 파고들다 보면 블라드 체페슈라는 인물을 빼 놓을 수가 없는데, 처음에 난 이 인물보다는 괴테의 '코린트의 신부'를 더 좋아했다.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줄 알았던 종교가 오히려 사랑을 훼방놓고 삶을 파괴하여 기어코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어버린 한 신부의 울부짖음이 너무 비극적이었으니까.
뱀파이어를 보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기만적인 존재인지 알게 된다. 먹이 사슬 최상위권에 있으면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도륙하거나 이용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마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삶들이 인간을 위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심지어 같은 인간끼리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피를 먹이로 삼는 뱀파이어라는 포식자가 등장하자 그들을 극악한 존재, 신이 용서하지 않는 존재 등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이며 배척하고 욕한다. 뱀파이어가 인간에게 하는 짓이란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이 다른 동,식물들에게 하는 짓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데 말이다.
하지만 '사랑'과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 또한 많기에 세상은 또 살아갈만하지 않나 싶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며, 다름을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다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르기 때문에 폭력으로 제거할 것이 아니라 말이다.
뱀파이어나 요정, 늑대인간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며, 자신을 숨긴다면 더 더욱 우리가 알 수 없을테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만약 그들이 소위 '커밍아웃'을 한다면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될까... 인간들의 과거인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것이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