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아직 20대였던 시절에 쓴 글을 옮겨놓는다. 대학원 강의의 기말 페이퍼로 쓴 것인데 무더운 장마철에 학교 연구소에서 1박 2일 동안 썼던 기억이 떠오른다(날밤을 샌 건 아니고 커다란 강의용 책상 위에 드러누워 눈은 붙였었다). <어느 망명작가의 참인생>(청하, 1988)이라고 국내에는 소개된 나보코프의 첫 영어소설 <세바스챤 나잇의 참인생>에 대한 '읽기'인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키는 대로 써나간 글이어서 자랑할 만한 구석은 별로 없지만 내겐 기억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글이고 나보코프에 관해 쓴 가장 긴 글이기도 하기에 보존해놓는다(각주는 본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나보코프의 영어본 일부 표지들은 본문과 무관하게 집어넣었다). 작품을 읽은 독자라면 약간의 흥미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라면 굳이 애써서 읽어볼 필요는 없겠다. '망명작가' 나보코프에 관한 개인적인 흥미를 적어놓은 것이니까...

OPENING
0.1. “반어적인 과학ironic science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할일을 줄 수는 있다. 영원히.” 존 호건, <과학의 종말>(까치, 1997), 222쪽.
아침에 이런 걸 읽다가, 나는 반어적 과학으로서의 문학비평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이번엔 거꾸로 말이다. 즉 문학비평은 최소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할일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주지 않는다. 정말 그런 듯싶으니 이를 어찌할까. 할일은 주어지지만, 정작 거기에 상스sens, 즉 의미와 방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런 것이 일종의 일시적인 무기력증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우리가 처한 사태의 본질이라면 정말 어찌할까. 나는 또다시 아주 친숙한 근심에 발목이 잡힌다. 장마철이어서일까?
0.2. 나보코프에 대한 기억이 이젠 희미해지질 즈음에, 이런 자리에 불려나와서 몇 마디 해야 하는 것은 일종의 고역이다. 네댓장쯤 쓰다가 다시 고치고 지우고 짜깁기하면서 나는 벌써 진을 다 빼버렸다. 사실 그럴 만한 여유도 재간도 없는 처지에, 남들이 뜯어먹지 않는 부분을 골라서 뜯어먹으려니 이 고생이지 싶다. 하지만 뒤져보면, 이미 먹을 만한 부분은 다 거덜나 있다.(이 글에서 몇 마디 주석을 달려고 하는 The Real Life Sebastian Knight이 대충 어떻게 뜯어먹혔는가에 대해서는 Vladimir Navokov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p. 634 참조.) 그러니 정성이 갸륵하지 않고서야 새로운 것이 얻어질 리 만무하다. 대략 입막음의 글이라도 작성하고자 일을 벌이긴 했지만, 이미 예전의 정(신)력은 아닌 모양이어서, 나는 지레 지치고 지레 나앉는다. 이래서야 어디 밥은커녕 죽 구경이라도 하겠는가? 참으로 걱정은 걱정이다.
0.3. 어제 나는 무얼 했던가? 아니 지난주에 난 무얼 했던가? 막바지까지 <어느 망명작가의 참인생 The Real life of Sebastian Knight>(이하 <참인생>, 텍스트로 사용한 것은 V. Nabokov, The Real Life of Sebastian Knight (Penguin Books, 1995); <어느 망명작가의 참인생>, 권택영 옮김(청하, 1988)이다. 본문에서는 국역/영어의 쪽수만 표기하며, 국역의 경우 일부 수정해서 인용한다.)을 읽었다. 그리고 이제와서, 또다시 마감에 닥쳐 이렇게 몇 자 적어내려 가고 있는 것이다. 계획은 이랬다. 나보코프의 초기 러시아 소설과의 연관성 속에서 <참인생>을 읽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제서야 나는 이 작품을 손에 들었고, 불과 몇 분 전에야 손에서 놓았다. 그리고 그새 다시 손에 들지 않았다. 한번 읽은 것이다. 소설에 관한 나보코프의 지론은 읽고 또 읽으라는 것이다. 한 대담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소설은 읽고 또 읽는 거지요. 아니면 읽고 읽고 또 읽든가요. You can only re-read a novel. Or re-re-read a novel.”(Charles Nicol, "The Mirrors of Sebastian Knight," L. S. Dembo (Ed.), Nabokov: The man and his work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7), p. 85에서 재인용.)
뭔가 적어가며 읽긴 했지만, 한번 읽고 모든 걸 손아귀에 다 틀어쥘 수는 없는 법이다. 하물며 무슨 연관성이랴? 해서 계획은 남아나지 않았다. 그저 나는 <참인생>을 비교적 자세히 읽음으로써 나보코프의 입이나 일단 틀어막아보기로 했다(그리고 비로소 읽기 시작해야지!). 바로 옆에선 푸줏간 주인 같은 나보코프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나의 이런 꼴을 쳐다보고 있지만, 별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이지. 자신의 체험에 충실할 밖에. 이런, 벌써 몇 시간이 지나갔다. 또 어느새 자정을 넘긴 것이고. 하여간에 나는 나보코프에 대해 쓴다. 쓰기 시작한다. 일단은 이 “무의미의 부메랑boomerangs of nonsense”(218/149)을 던져보는 것이다... Hello, Mr. Nabokov!.. 어쿠!

SCENE 1
1.1 <참인생>(1938)은 마지막 러시아어 장편인 <재능Gift>(1936)에 바로 이어진 소설로서 일단 나보코프의 작가적 경력에서 경계에 자리한다. 이 경계를 지나면서 그는 러시아어 작가에서 영어 작가로 변신한다. 나보코프에 관한 가장 방대한 두 권짜리 전기는 각각 ‘러시아인 시절’과 ‘미국인 시절’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Brian Boyd, Vladimir Nabokov: The Russian Years (London, Chatto & Windus, 1990), Vladimir Nabokov: The American Years (London, Chatto & Windus,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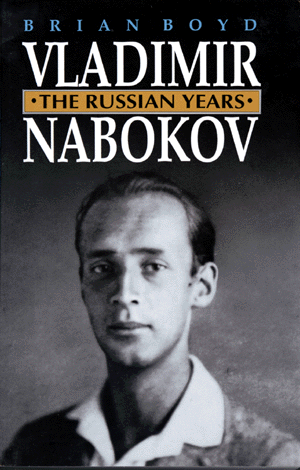
아무리 재능있는 작가라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가적 장래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참인생>은 나보코프의 약한 고리이다.(Field 같은 이는 <참인생>을 가장 허술한weakest 작품으로 평하기도 한다. Vladimir Navokov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5), p. 634.)
이 시기에 나보코프는 점차 암울해지던 유럽을 떠나 영국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계획한다. 즉 영어-사용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한다. (John Lanchester, "Afterword," The Real Life of Sebastian Knight, p. 178.)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이 제2의 데뷔작은 자못 비장한 의의를 가진다. 한 직업작가의 밥숟가락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염려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
1.2. 모두 2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참인생>의 1장에서 화자인 ‘나’(브이V)가 존경해 마지 않는 노장 비평가 사우스 케징턴South Kesington이 세바스챤 나잇Sebastian Knight의 때이른 죽음을 접하면서, “가엾은 나잇! 그는 두 시대를 살았지, 먼저는 엉터리 영어로 글을 쓰는 멍청한 작가로, 나중엔 멍청한 영어로 글을 쓰는 엉터리 작가로 말이야. Poor Knight! he really had two periods, the first - a dull man writing broken English, the second - a broken man writing dull English.”(12/6)라고 말하는 부분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이 ‘고약한 농담nasty dig’의 대상에 나보코프라고 걸려들지 말라는 법은 없다(더구나 자신이 놀던 물이 아닌 데야!) 이것이 그 염려의 내용이 될 수는 없을까. 과거에 그는 똑똑한 러시아어 작가였지만, 이제는 한낱 엉터리, 멍청이 ‘영어’ 작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 그럼 어떡해야 하나? 가장 자신 있는 걸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걸로 밀고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건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 바, 나보코프의 지능이 우리보다 못할 리가 없다. 때문에 그가 이전에 쓴 러시아어 소설들에서 주제와 구성뿐만 아니라 많은 모티브를 <참인생>에 빌려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참고로, J. W. Connolly는 Nabokov's Early Fi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220-222에서 <참인생>에 나타난 <재능>의 그림자를 몇 가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나’와 ‘세바스찬’의 관계(<참인생>)가 ‘나’와 ‘표도르’의 관계(<재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그는 에셔M. C. Escher의 그림 <드로잉 핸즈Drawing Hands>(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있는 두 손)의 이미지로 이해한다. 이때 작가 나보코프는 이 두 손을 그리고 있는 제 3의 손이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은 작가-화자(‘나’)와 인물-작가(세바스챤)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사실 <참인생>은 바로 이 ‘나’(브이)와 세바스챤의 정체성, 그들의 관계에 대한 수수께끼/퍼즐 풀기에 다름아니다.

1.3. 허구적 인물과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러시아어 소설에서 나보코프의 작가-예술가로서의 자기탐구와 자기확인에의 요구가 빚어낸 것이다. <재능>은 이러한 탐구의 정점으로서, 이 작품은 주인공 표도르가 결국 나보코프와 같은 작가적 반열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형상화함으로써 그것을 일단락짓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전기적 이력을 놓고볼 때, 우리는 이 <참인생>에서 나보코프가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할지에 대해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바, 그것은 영어 작가로서 러시아어 작가 못지 않은 장래성(재능)의 확인/확보 문제이다(따라서 이것은 <재능>의 반복이자 번안이다). <참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포르 레크노이로 분한 나보코프란 주장도 있다.(“Nabokov's novel has one "real" character, Nabokov himself, who poses as Paul Rechnoy.", Charles Nicol, op. cit., p. 91.)
이 작품에서의 화자-작가인 ‘나’는 나보코프의 그러한 기대의 대리인이다. 이 작품이 ‘나’가 이복형인 세바스챤의 전기를 완성하는 여정의 형식이면서, 동시에 세반스챤을 닮아가는, 세바스챤이 되어가는 여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나보코프답지 않은 염려와 나보코프다운 기대 속에 <참인생>은 놓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나보코프의 생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이다.

SCENE 2
2.1. “1938년 프랑스 파리의 어느 단칸방 아파트. 당시 가난한 러시아의 망명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문제의 소설 한편을 탈고한다. 1940년 미국 이주 후 영어로 출간되어 “찬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호평과 함께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책이 아니냐”는 혹평을 받은 이 소설은, 우리들의 책읽기 방식에 중대한 도전을 던진다.” 여기까지는 국역본의 광고인데, 문제는 우리들의 책읽기 방식이 아니라 바로 나보코프 자신일 테다(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울” 수 있겠지).
2.2. 세바스챤 나잇(1899-1936)이라는 러시아 태생 영국작가가 5권의 소설을 남기고 36세의 나이로 죽는다(한편으론 이 6이란 숫자는 브이를 상징하는, 대변하는 숫자인데, 이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아래 이복동생인 나, 브이는 이복형의 출판매니저였던 굿맨Goodman의 전기 <세바스챤 나잇의 비극 The Tragedy of Sebastian Knight>이 결함 투성이임을 발견하고 세바스챤의 새로운 전기를 쓰고자 유품들을 뒤적거리고 생전에 세바스챤과 가까웠던 인물들을 찾아가 얘기를 들으며 자료수집에 전력을 기울인다. 그렇지만 결국 대단한 무얼 얻지는 못하고 그런 과정을 그럭저럭 기술하여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이 <참인생>이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세바스챤 나잇과 작가 나보코프 사이의 많은 유사점이다.(John Lanchester, op. cit., p. 177-8.)
1899년은 나보코프가 태어난 해이고 1936년은 <재능>을 쓰고 러시아어로는 절필한 해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어 작가로서는 생명이 끊어진 해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세바스챤 나잇을 나보코프의 러시아어-작가적 분신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바스챤은 영어로 창작을 했으니까 정작 나보코프와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차이는 그저 일종의 은폐전략에 불과할 테다. 그것도 보일 거 다 보이는 은폐전략 말이다.
2.3.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독자는 저자와의 게임에서 승부를 기대할 수 없다"(권택영, "쓰면서 지워가는 소설", <어느 망명작가의 참인생> 역자 해설, 255쪽.)는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를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세바스챤이다, 아니 세바스챤이 나다, 아니 아마도 우리 둘 다 우리 둘이 다 모르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다. I am Sebastianm or Sebastian is I, or perhaps we both are someone whom neither of us knows.”(251/173)
이 문장에서 ‘나’(브이)는 나보코프의 영어-작가적 분신이다. ‘나’ 브이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때의 V는 Vladimir Nabokov가 아닐까. 그는 나보코프의 일부이기 때문에 풀네임은 갖지 않는다. 한편, 세바스챤이 브이에게 보낸 편지에 Sevastian이라고 서명돼 있는 것은 이 둘의 분신성을 보강해준다. 러시아어 철자 ‘B’가 지닌 이중성(‘B’이면서 ‘V’)이라는 글자퍼즐을 나보코프는 인물퍼즐과 겹치게 만들고 있는 것.
그리고 이들이 둘 다 모르는 어떤 사람은 바로 나보코프인 것이지. 이 두 분신은 모두 전체-나보코프Total-Nabokov의 일부이며 장기말/기사knight이다. 이 점에서 굿맨이 세바스챤을 “그는 완벽한 포우저였다. [H]e was the perfect ‘poser’.”(141/97)고 본 것은 조금 다른 문맥에서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다. 브이와 세바스챤, 두 인물-작가는 모두 나보코프 자신이자 그의 가면이며 포우저이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만이 내가 나름대로 읽은 <참인생>의 내용이다. 즉 나보코프의 작가적 경력 속에서 <참인생>이 차지하는 의의와 성격을 브이와 세바스챤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

2.4. 이런 맥락에서 브이가 성 다미에르St Damier 병원에서 얻은 깨달음 이해할 수 있을까. 먼저 옮겨본다. 그것은 이렇다. 나보코프 자신은 <참인생>을 탐탁찮게 생각한 모양이지만, 이런 대목 같은 부분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통찰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영혼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라고나 할까.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향수>에서 도미니크가 어린 아들의 뒤를 좇으며 걸음을 맞추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얼 더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영혼이란 오직 존재의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만일 당신이 영혼의 맥박을 발견하여 따라간다면 어떤 영혼도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된 영혼, 어떤 수의 영혼들 속에서 그들 모두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부담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충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세바스챤 나잇이다.
[T]hat the soul is but a manner of being - not a constant state - that any soul may be yours, if you find and follow its undulation. The hereafter may be the full ability of consciously living in any chosen soul, in any number of souls, all of them unconscious of their interchangeable burden. Thus - I am Sebastian Knight. (250/172)
브이와 세바스챤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자면, 여기서의 ‘영혼’은 ‘언어’란 뜻으로 번역해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영혼)이란 바로 언어가 아니겠는가. 그럴 경우, 브이의 깨달음은 언어(영혼)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즉 그것이 교체가능interchangeable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언어(영혼)의 맥박과 리듬을 잘 찾아내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 소설은 견습작가인 브이가 세바스챤의 행적과 작품세계를 더듬어가면서 이 이복형의 맥박(리듬)을 배워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 소설의 끄트머리에 와서 브이(=영어 작가로서의 나보코프)가 마침내 자신의 반쪽half-brother인 세바스챤(=러시아어 작가로서의 나보코프)을 따라잡은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대신하게 된 것이다.(그의 브이는 승리의 브이이다).
2.5. 이러한 결말의 의미는 작품의 초반부(4장)에서 브이가 세바스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서적 동질감과 이질감을 대비시켜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언젠가 나는 두 형제가 테니스 챔피언으로서 경기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두 사람이 치는 힘은 완전히 달랐다. 그러나 경기장을 휩쓰는 행동의 리듬은 정확히 같았다. 만일 그 두 개의 리듬을 그릴 수만 있다면 똑같은 그림이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바스챤과 나도 역시 공통된 리듬을 가졌으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렇다고 나와 세바스챤이 마음의 풍요와 재능의 일면이라도 공유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글쓰는 방식을 나는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 재능의 높이에 다다를 수는 없지만 나를 도와줄 어떤 심리적 유사점들을 나도 갖고 있다는 것에 자신을 얻은 것이다.
Once I happened to see two brothers, tennis champions, matched against one another; their strokes were totally different, and one of the two was far, far better than the other; but the general rhythm of their motions as they swept all over the court was exactly the same, so that had it been possible to draft systems two identical designs would have appeared. I daresay Sebastian and I also had some kind of common rhythm. (...) This is not meant to imply that I shared with him any riches of the mind, any facets of talent.(...) I cannot even copy his manner{...] I feel that inspite of the toe of his talent being beyond my reach certain psychological affinities which will help me out. (43-45/28-30)
브이와 세바스챤의 관계는 이 인용에서 테니스를 치는 형제의 관계를 닮았다. 즉 두 작가는 힘과 기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작의 리듬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에 세바스챤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브이에겐 세바스챤을 따라갈 만한 바탕(=심리적 유사성)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바탕이 결국에 가서는 “나(브이)=세바스챤”이라는 당당한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
전기를 쓰기 위해 세바스챤의 아파트에서 유품을 뒤적이다가 브이가 발견한 러시아어 문구 “언제나 찾아야 할 당신의 방식 [T]hy manner always to find...”(48/32)을 마침내 그는 찾아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바스챤의 맥박이고 리듬이며 “특이한 글쓰기 방식queer way”(50/33)이다. 브이는 작가로서 세바스챤의 뒤를 이을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이것이 이 소설의 결말이 뜻하는 바이다.

SCENE 3
3.1. 다시 인용하겠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대목이어서 조금 더 거창한 해석을 덧붙여보기 위해서이다.
영혼이란 오직 존재의 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만일 당신이 영혼의 맥박을 발견하여 따라간다면 어떤 영혼도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떤 선택된 영혼, 어떤 수의 영혼들 속에서 그들 모두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부담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충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세바스챤 나잇이다.
여기서 ‘맥박’은 한 영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생의 리듬이다. 이 리듬의 공유를 통해서 영혼은 서로 교환(교체)되고 합일된다. 이것을 통해 브이(그리고 나보코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동시화cosmic synchronization라는 형이상학이다. 이때의 동시화는 곧 시간적인 동시성의 구현인데, 이에 의해서 개체적, 개별적 존재가 지닌 시간의 단속성(=불연속성)과 유한성은 극복될 수 있다. 즉 우리의 영혼은 불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보코프가 시간을 믿지 않는다고 한 것 은 이런 맥락에서 음미해볼 수 있다.( V. Nabokov, Speak, Memor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67), p. 139.)

3.2. 20세기 전반기 서구 형이상학의 주조음은 시간에 대한 것이다(대표적인 철학자로 베르그송과 화이트헤드를 들 수 있다). 즉 시간은 이 시기의 주된 관심거리이면서 이런저런 입장들을 찍어내는 거푸집이다. 이 시기에 시간이 문제된 것은, 비로소 그것이 과거-현재-미래라는 일직선적인 공간화로부터 이탈하여 제값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시간, 순수한 지속으로서의 시간은 이때부터 서구 형이상학이란 유구한 깡통에 흠집을 내고 그것을 찌그러뜨리기 시작한다. 이때의 형이상학이란 바로 기하학적 사유(=공간에 대한 사유)로 특징지어지는 것인바, 개념화되지 않는 어떤 것, 그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으로서의 시간 앞에서 제대로 기운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형이상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시간이 낳는 불안은 실존적인 차원의 것이면서 동시에 인식론적인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불안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3.3. 저마다의 생애가 시간-내-세계에서 그것을 초월하기 위한 필사적인(더러는 게으른) 도주라고 한다면, 전기bio-graphy는 바로 그 도주의 궤적이다. 전기는 한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는 생애를 이야기(=형태)의 장속으로 끌여들여 가시화함으로써 시간에 저항한다. 이것이 한가지 대처방법이다. 그리고 신화가 있다. 이때의 신화는 저마다의 생애를 ‘동일한 것의 영원한 되돌아옴’의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것의 고유성과 유한성을 희석시킨다. 신화는 비유컨대, 모든 이의 생애를 닳고 닳은 동전의 그것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이것이 또다른 대처방법이다. 그리고 나보코프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들 모두의 시간(=리듬)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인이 만인의 영혼이 되고, 마스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나보코프가 말하는 동시화synchronization의 세계이다.
이 동시성의 세계에서 “오직 단 하나의 참 숫자는 하나이고 나머지는 그저 반복일 뿐이다. The only real number is one, the rest are mere repetition.”(<잃어버린 재산Lost Property>)(127/89) 즉, 저마다의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죽음이 있는 것이며, 이 전체로서의 하나는 시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기에 결코 시간-내-존재로서의 유한성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나보코프의 게임으로서의 소설은 형이상학으로 승격된다.

3.4. 세바스챤의 네번째 소설 제목인 ‘잃어버린 재산’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패러디한 것인바, 여기서 ‘재산property(=고유성)’이란 말과 ‘시간’의 대응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비록 명시적인 형태로는 아닐지라도, 이미 나보코프는 하이데거-데리다가 지적하게 될 인간의 종언, 인간의 고유성의 종언을 미리 앞당겨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데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말이다.
인간의 종언은[시작과 끝]은 존재의 사유와 그 언어 안에 처음부터 언제나 지시되고 등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는 텔로스와 죽음과 유희 안에서 ‘끝’의 이중적 의미를 변주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유희를 읽어갈 때, 다음과 같은 연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의 끝[완성]은 존재의 사유이며, 인간은 존재 사유의 끝[목적]이며, 인간의 끝[정점]은 존재 사유의 끝[정점]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언제나 그 자신의 고유한 끝[목적]이며,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고유성의 끝[목적]이다. 존재는 처음부터 언제나 그 자신의 고유한 끝[목적]이며,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의 고유성의 끝[목적]이다.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1996), 340쪽.)

"In the thinking and the language of Being, the end of man has been prescribed since always, and this prescription has never done anything but modulate the equivocality of the end, in the play of telos and death. In the reading of this play, one may take the following sequence in all its senses: the end of man is the thinking of Being, man is the end of the thinking of Being, the end of man is the end of thinking of Being. Man, since always is his proper end, that is, the end of his proper. Being , since always, is its proper end, that is, the end of its proper." (J. Derrida, "The Ends of Man,"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 134.)
인간의 고유성에 대해서 사유한다는 것은 곧 그 고유성의 끝(한계와 목적)에 대해 사유한다는 것이다. 나보코프의 메타모포시스적인 세계는 바로 그러한 사유의 한 끝을 보여준다. 타인의 영혼과 같은 리듬 속에 공속됨으로써 “나는 세바스챤이다, 아니 세바스챤이 나다.”라는 비분리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은 한 개인이 지닌 고유성의 종언이면서, 정점이며 또한 완성이 아닐까. <참인생>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며, 그러한 형이상학적 물음이 다차원적인 게임의 형태로 발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희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보코프의 고유성이며, 그 고유성의 끝이다.

3.5. 인간의 종언을 말하면서 세바스챤의 죽음을 빼놓을 수는 없다. 세바스챤의 일생에서 마지막해인 1936년으로 접어들면서 브이는 이 죽음의 연도와 사람 사이의 “신비한 유사점occult resemblance”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이 유사점에 의해 암시되는 것은 그 죽음의 필연성이고, 비고유성이다. 이 부분이다.
세바스챤 나잇 d. 1936... 이 연도는 나에게 잔물결이 이는 연못 속에 그 이름을 비추어 본 것같이 보인다. 마지막 세 숫자의 곡선은 물결 모양 같은 윤곽이 웬일인지 세바스챤의 개성을 상기시켜준다.(...) 만일 내가 여기저기에서 적어도 그가 생각하는 것의 그림자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따금씩 무의식적인 뇌의 작용이 은밀한 미로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나를 이끌지 않았다면, 내 책은 서툰 실패작에 불과하다.
Sebastian Knight d. 1936... This date to me seems the reflection of that name in a pool of rippling water. There is something about the curves of the last three numerals that recalls the sinuous outlines of Sebastian personality.(...) If here and there I have not captured at least the shadow of his thought, or if now and then unconscious cerebration has led me to take the right turn in his private labyrinth, then my book is a clumsy failure. (224-5/154)
여기서 브이는 자신과 세바스챤의 관계가 운명적인 분신double이면서 동형isotopie이며 거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무의식적이지만 알게 된다. 1936년에서 936은 잔물결(3)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본 형상이다(9↔6). 여기서 9가 세바스챤이라면 6은 브이이다. 머릿 숫자 1은 이들이 한몸임을 말해준다. 세바스챤은 자신의 운명의 소용돌이를 안고 이제 서서히 종국을 향하고 있고, 브이는 바야흐로 작가로서 입문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 하강하고 상승하는 운명을 9와 6은 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인생>의 시작인 1장에서 언급되는 한 러시아 여인은 “올가 올레고브나 오를로바Olga Olegovna Orlova라는 달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여인의 일기에서 브이는 세바스챤이 태어난 1899년 12월 31일의 날씨 기록을 본다. 여기서 이 “달갈 같은 이름”은 세바스챤의 태생을 상징하는 듯하다. 그는 O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6년 후에 브이 또한 같은 집에서 태어난다. 여기서 세바스챤과 브이를 나타내는 숫자인 9과 6은 O에 운동성(꼬리)이 부여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숫자 상징은 20장에서 세바스챤이(나중에 Kegan이란 다른 환자임이 밝혀지지만)이 입원해 있는 병실은 36호라는 데에도 이어진다. 936에서 9(=세바스챤)가 떨어져나간 것이니 세바스챤이 이 병실에 입원해 있을 리 없다. 그는 이미 죽은 것이다. 세바스챤 나잇Knight은 나잇night(=어둠) 속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브이는 성 다미에를 병원을 찾아가 세바스챤을 찾으며 이렇게 말한다. 'I have come,' I said, 'to see Monsieur Sebastian Knight, K, n, i, g, h, t. Knight. Night.'(168) 이렇듯 나잇의 이름은 몇 차례에 걸쳐 낱낱으로 분해되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12장에서 로이 카스웰Roy Carswell(이것 또한 루이스 캐롤의 아나그램이다) 속의 초상화가 보여주는 세바스챤, 즉 연못 속의 자신을 들여다 보고 있는 모습(144/99)을 이제 브이 또한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참인생>의 이야기 전체가 바로 이 연못 속의 자신 들여다보기인 것이다. 브이는 세바스챤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욕실로 가서 거울looking- glass 앞에 몇 분 동안 서 있는다.”(234/160)
3.6. 브이가 세바스챤의 아파트를 찾아갈 갔을 때 발견한 이상한 문구 또한 이러한 거울보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시간의 동시화synchronization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깊게깊게 잠드는 자였기에 로저 로저슨, 늙은 로저슨은 늙은 로저스가 산 것을 샀다. 깊게 잠드는 자가 되는 게 그토록 두려운 늙은 로저스는 내일을 놓치는 게 그토록 두려웠다. 그는 깊이 잠드는 자였다... 그는 숙명적으로 내일의 사건의 영광, 이미 훈련의 영광을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그가 하는 것은 사고 그날 저녁을 사기 위하여 집으로 옮겨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고 여덟 개의 각기 다른 크기와 강도로 똑딱거리며 9, 8, 11시를 지나치는 자명종 시계는 그는 시계를 침실에 놓았고 그 모습은 마치 9개의 알람시계가 9마리의 고양이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As he a heavy A Heavy sleeper, Roger Rogerson, old Rogerson bought old Rogers bought, so afraid Being a heavy sleeper, old Rogers so afraid of missing tomorrows. He was a heavy sleeper. He was mortally afraid of missing tomorrow's event glory early train glory so what he did was to buy and bring home in a to buy that evening and bring home not one but eight alarm clocks of different sizes and vigour of ticking nine eight eleven alarm clocks of different sizes ticking which alarm clocks nine alarm clocks as a cat has nine which he placed which made his bedroom look rather like a (50/33)
무슨 말인지 잘 알아먹기 힘들지만(번역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다), 여기서도 로저스Rogers와 로저슨Rogerson은 트윈twin이며 분신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내일의 어떤 사건(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 크기도 다르고 똑딱소리도 다른 8개의 알람시계를 사서 9시, 8시, 11시 등에 맞춰놓는다. “깊은 잠”이란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한다면, 이 말장난word-play이 배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죽음 극복에의 욕망이다. 이 욕망이 세바스챤에게서 자신의 창작으로 나타났다면, 동생 브이에게는 형의 삶을 전기의 형식으로 다시 복원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들은 로저스Rogers와 그를 따르는 로저슨Rogerson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8개(9개?)의 알람시계를 동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미 앞에서 얘기한 동시화의 세계가 아닐까.

SCENE 4
4.1. 나보코프의 이전의 러시아어 작품들이 그렇듯이 <참인생> 또한 게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미 세바스챤 나잇Sebastian Knight의 기사Knight와 그의 애인인 클레어 비숍Clare Bishop의 주교Bishop가 이미 장기의 말이름이다. 그리고 세바스챤이 죽은 장소인 성 다미에르St Damier에서 다미에르Damier는 불어로 장기판을 뜻한다. 이렇듯 게임소설novel as a game적인 성격과 자기 정체성의 탐구novel as a quest for identity의 병치라는 나보코프 특유의 전략은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가? 이 문제를 세바스챤이 쓴 소설들과 그에 대한 브이의 읽기를 따라가면서 생각해보기로 한다.
4.2. 세바스챤이 제일 처음 쓴 소설은 <무지개빛 단면The Prismatic Bezel>(1924)이다. 여기서 ‘무지개빛’이라는 건 프리즘을 통해서 투과된 빛의 분광을 뜻한다. 우리 눈에 그저 단순하게 한 가지로 보이는 빛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빛의 종합이라는 걸 프리즘은 보여주는 것인데, 이 프리즘이 바로 세바스챤에게서(그리고 나보코프에게서) 바로 소설이란 허구적 세계가 아닐까. 이 <무지개빛 단면>은 일종의 탐정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10장). 열두명의 사람들이 한 하숙집에 묵고 있는데, 아베슨G. Abeson이란 미술판매상이 자신의 방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된고, 런던에서 탐정이 어렵사리 도착해 수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투숙객들이 다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이때 시체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서 이곳을 어슬렁거리던 행인인 늙은 노즈박Nosebag이 자신의 가발과 거은 안경을 벗어던지면서 자신이 아베슨임을 드러낸다. 여기서 노즈박Nosebag은 아베슨G. Abeson의 아나그램이다.
이렇듯 철자변환의 게임을 존재의 동일성 문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짓는 세바스챤의 방식은 바로 나보코프의 그것이면서 이 <참인생>의 그것이기도 하다. 브이와 세바스챤 또한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아나그램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세바스챤의 이러한 방식을 브이는 ‘문학적 구성의 방법methods of literary composition’(114/79)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허구적 작품이 구성되는 원리인바, 그것을 브이(그리고 세바스챤)는 아나그램(=구성․편집의 문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세바스챤의 이러한 인식과 방법은 그의 마지막 소설인 <의심스러운 아스포델The Doubtful Asphodel>에도 이어지는 바, 거기서 그는 기법의 완벽함을 과시한다. 브이의 주석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부분들이 아니고, 그것들의 조합이다. It is not the parts that matter, it is their combination.”(216/148)
4.3. 두번째 소설인 <성공Success>에서 다루어지는 ‘인간 운명의 방법methods of human fate'은 이와 관련하여 작가의 문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소설 속에 나오는 윌리엄과 마술사의 대화를 보라.
“제가 토기 한 마리 사 드릴까요?” 윌리엄이 말한다. “필요하면 내가 하나를 만들지.” 마술사는 ‘필요한’이란 말이 무슨 끝없이 긴 리본이라도 되듯이 길게 빼면 대답한다. “괴상한 직업이예요, 소매치기가 미치죠, 주문만 외면 되니가요. 거지의 모자 속에 든 동전과 당신의 마술모자에 든 오믈렛, 말도 안되지만 같거든요.” 윌리엄이 말한다.
"May I buy you a rabbit?" asked William. "I'll hire one when necessary," the conjuror replied drawing out the "necessary" as if it were an endless ribbon. "A ridiculous profession," said William, "a pickpokek gone mad, a matter of patter. The pennies in a beggar's cap and the omelette in your top hat. Absurdly the same." (120/83)
마술모자 속의 오믈렛과 거지의 모자 속에 든 동전을 “말도 안되지만” 같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작가-마술사의 허구적 세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을 다루는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한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조종할 수 있는 세계, 허구적 세계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무지개빛 단면>에서 피력된 구성방법과 더불어 <참인생>이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 지침의 역할을 한다.

4.4. 세번째 소설인 <우스운 산The Funny Mountain>(1932)은 세 개의 단편 모음집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세 명의 불쌍한 여행자를 도와주는 실러Mr Siller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실러가 문제되는 것은 세바스챤의 마지막 여인을 찾아가는 브이의 여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인물인 실버만Silverman이 이 실러를 빼닮았다는 데 있다. 즉 실버만은 허구적 인물인 실버의 현실적 구현체이다. 거꾸로 말하면, 실버만은 브이의 허구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인물이다.(최유미, <The Real Life of Sebastian Knight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2), 36-38쪽.)
“가장 정직한 중개인을 조심하라. 당신이 들은 것은 정말이지 세번 굴절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Beware of the most honest broker. Remember that what you are told is threefold.”(66/44)는 브이의 내면의 메아리는 이제 그 자신의 실재성에 대한 의혹으로까지 확산된다(사실 <참인생>의 가장 믿음직한 브로커 행세를 하는 인물이 바로 화자-작가인 브이가 아닌가). 그러한 의혹은 사실 브이 자신에게서 먼저 터져나오고 있기도 하다.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가 세바스챤 나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양심 속에서 같은 음성이 반복된다. 정말이지 누구인가? Who is speaking of Sebastian Knight? repeats that voice in my conscience. Who indeed?” 만약에 <참인생>이 세바스챤의 여섯번째 소설이라면, 6이란 숫자와 브이와의 연관성은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론 결국 허구적 주인공인 브이가 작가 세바스챤의 삶에 대해 궁리하고 탐색하고 있는 형국이 된다. 이런 식의 읽기 또한 ‘가능한’ 읽기이다.

4.5. 사실 다른 나보코프의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참인생>에서도 어떤 고유한 유일한 읽기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읽기를 통해 굿맨이 세바스찬 나잇의 문학세계를 규정지으면서, ‘불쌍한 나잇poor Knight’이 “소위 우리시대의 산물이며 희생자product and victim of what he calls ‘our time’”(77/52)라는 걸 보여주려한 것이 한낱, 브이에 의하면, “굿맨의 소극The Farce of Mr Goodman”이 되고 마는 것은 그런 유일한 읽기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심한 손가락innocent blind fingers”(98/67)으로 작품(열쇠)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브이가 실재적인 인물이든, 허구적인 인물이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그의 존재가 그렇듯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만을 유의하면 되겠다.
여기서 제3의 중재적인 해석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보코프가 두 세계, 혹은 더 나아가 다(多)세계 모델을 세계관으로 견지하고 있었다는 관점이다. 그 관점에 의하면, 거울 안의 세계와 거울 바깥의 세계는 동일한 지위의 현실성을 갖는다. 이미 앞에서 6과 9의 숫자를 통해 브이와 세바스챤이 거울상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지적한 바 있는데, 세바스챤의 시점에서 볼 때, 브이는 자신의 허구적인 거울상에 불과하고, 또 브이의 시점에서 볼 때, 세바스챤은 이미 죽은 인물로서 자신의 전기를 통해 재생되어야 하는 인물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우월한 현실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이런 식의 두 세계 모델은 시간의 힘을 상대화시킨다는 강점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세바스챤의 마지막 소설인 <의심스러운 에스포텔>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4.6. 세바스챤의 네번째 소설 <잃어버린 재산>은 브이에 의하면, 문학적인 발견의 여정에 있어서 일종의 정지halt이며 요약summing up이다. 이 소설의 한 장은 비행기 추락사고를 다루고 있는데, 떨어진 항공우편물 가방에 남아있는 편지들을 브이는 다시 소개하고 있다. 이들 중 연애편지는 당시 클레어 비숍과의 멀어져가는 관계에 대한 세바스챤의 안타까움이 직접 토로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사랑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재미있으면서도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던 동시화의 문제와 연관해서 중요한 시사를 제공해준다.
사람은 천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렘은 이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는 체조가 아니라 댄스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백 명의 부인들을 모두 다 사랑한 어느 거대한 터키인의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상상해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둘>이라고 말하면 나는 세기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끝이 없지요. 오직 단 하나의 참 숫자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 그리고 사랑이란 이 단수 개념을 설명하는 최고의 대표자입니다.
One may have a thousand friends, but only one love-mate. Harems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matter: I am speaking of dance, not gymnastics. Or can one imagin a tremendous Turk loving every one of his four hundred wives as I love you? For if I say "two" I have started to count and there is no end to it. There is only one real number: One. And love, apprently, is the best exponent of this singularity. (137/94)
여기서의 하나, 즉 단수성singularity은 앞에서 언급한 단수화synchronization과 유사한 의미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개인 것, 혹은 복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One라는 것은 정념론적 원리이면서 인식론적 원리이다. 아니 원리라기 보다는 차라리 가능조건이다(적어도 체조가 아니라 댄스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보코프 소설에서의 여러 인물들은 작가 자신의 분신들이며, 또 이 분신들은 전체-나보코프Total Nabokov로 수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일(一)과 다(多)의 수렴, 발산운동이 그의 소설을 직조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라. 한편으론 이 일과 다, 부분과 전체는 마치 프랙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부분은 전체를 고스란히 자기 안에 내포해 가지고 있다. 부분과 전체를 서로 닮은 꼴인 것이다. 브이가 세바스챤을 닮고, 세바스챤이 작가 나보코프를 닮는 과정은 이러한 일/다의 운동, 프랙탈 운동 과정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나보코프의 창조원리가 아닐까 싶다.

SCENE 5
5.1. 일/다의 수렴 발산 운동 대신에 왔다리 갔다리 식으로 이야기가 여기까지 뻗어나오게 되었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는구만. 세바스챤의 마지막 소설로 넘어가기 전에, 그의 마지막 여인(마지막 사랑?)이었던 니나(=르세프)에게 브이가 정작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이유를 잠시 음미해본다.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런 종류의 여인들에게 책이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이 백 권의 소설이 주는 스릴보다 더 야단스러울 텐데 만일 그녀가 만 하루 동안 도서관에 갇혀서 보내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아마 점심 때쯤 죽은 시체로 발견되리라.
What was the asking! Books mean nothing to a woman of her kind; her own life seems to her to contain the thrills of hundred novels. Had she been condemned to spend a whole day shuy up in a liberary, she would have been found dead about noon.(213-4/146)
그런 니나가 세바스챤의 마지막 사랑이었을까? 사랑이었다니! 어쨌든 지금이라고 사정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다. 무수한 니나들이여! 가련한 얼간이들이여! 돼먹잖은 천사들이여!

5.2. 세바스챤의 마지막 소설 <의심스러운 아스포델>은 죽어가는 한 남자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가 곧 책이다. 다른 건 그저 본문main subject에 딸린 주석commentary에 불과하다. 죽음에 대한 생각들과 상념들의 조합이 이 소설의 기법이면서 장기이다. 그는 마침내 삶과 죽음에 관한 온갖 질문의 대답인 ‘절대적인 해결’을 발견하는 데 이른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아온 야생의 시골도, 자연스런 현상의 우연한 종합도 아니고 이런 산과 숲, 들과 강을 한 문장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책 속의 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여행자와 같은 것이었다.
[I]t was like a treaveller realizing that the wild country he surveys is not an accidential assembly of natural phenomena, but the page in a book where these mountains and forests, and fields, and rivers are disposed in such a way as to form a coherent sentence. (219/150)
이 깨달음은 단순하면서 아름답다. 그걸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어지는 문장은 <의심스러운 아스포델> 전체에서, 그리고 이 <참인생>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적인 문장이다.
이제 수수께끼는 풀렸다. ‘그리고 모든 것의 의미가 그들의 형태를 통해서 빛나면 최상으로 중요한 것같이 보였던 여러 생각들과 사건들은 사소한 것조차 되지 못한다. 이제 아무것도 사소한 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한때는 중요성을 부정하기도 했던 다른 생각들과 사건들과 같은 크기로 축소된다.’ 그렇게 하여 과학, 예술, 혹은 종교와 같은 우리 뇌의 빛나는 업적들은 분류의 친근한 계보로부터 떨어져나오고 합세한 손들은 서로 혼합되어 즐겁게 하나가 된다. 버찌의 씨와 어느 낡은 벤치, 그 페인트칠한 나무토막 위에 놓여 있던 그것의 조그만 그림자, 혹은 찢어진 조그만 종이조각, 혹은 수천 수백만의 사소한 것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다른 사소한 것은 신기한 크기로 자란다. 다시 조형되고 재조립되어 둘 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세상은 영혼에 그 의미를 제공한다.
Now the puzzle was solved. ‘And as the meaning of all things shone through their shapes, many ideas and events, which had seemed of the utmost import!ance dwindled not to insignificance, for nothing could be import!ant now, but to the same size which other ideas and events, once denied any import!ance, now attained.’ Thus, such shining giants of our brain as science, art or religion fell out of the familiar scheme of their classification, and joining hands, were mixed and joyfully levelled. Thus, a cherry stone and its tiny shadow which lay on the painted wood of a tired bench, or a bit of torn paper, or any other such trifle out of millions and millions of trifles grew to a wonderful size. Remodelled and re-combined, the world yield its sense to the soul as naturally as both breathed.(219-20/150)
다소 길지만, 내용은 대단히 의미깊다. <참인생>과 같은 “뇌의 빛나는 업적”을 스스로 무화시키면서, 재조형되는 세계, 그래서 새롭게 의미가 생성되는 사소한 세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실, 브이가 세바스챤이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떤가. 또 세바스챤이 “상대방에게는 법칙들을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자기가 고안해낸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222)으면 또 어떤가. 문제는 우리의 고유성 너머에 자연스레 숨쉬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또다른 세계이다. <참인생>에 지시되어 있지만, <참인생> 저편에 있는 어떤 세계, 책장 너머의 세계, 그리고 이 “뇌의 빛나는 업적들”이 이루어놓은 자질구레한 제도들과 그 틈바구니 너머의 세계, 아니 이런 언어 저편의 세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숨은 가벼워지는 것을.
브이는 <의심스러운 아스포델>을 세바스챤의 모든 책 가운데 가장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그 책 자체로서 그걸 좋아한다고. 그 책의 전모를 다 읽은 것은 아니니까 나로선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위의 대목 같은 부분은 그냥 그 자체로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대로 왔든 거꾸로 왔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이제 사다리는 버려도 좋다.

ENDING
E.1. 나는 무얼 얘기했는가? 예전만큼의 정(신)력이 안된다는 걸 자백했는가? 이 피로 속에서(엄살이다). 어쨌거나 나보코프에 대해 몇 마디 할 얘기가 있었고, 그걸 <참인생>을 빌미로 삼아 하고자 했지만, 구성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제대로 다 털어놓은 것 같지는 않다. 굿맨과 브이의 전기를 비교하는 것, 세바스챤의 여자 관계를 추적하는 것 따위가 얼른 생각에 여기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들이다. 사소한 걸로 내버려두면 되는 것인지?... 이젠 다 잊어버리기로 한다.
E.2. 그렇다고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다. 1장에서 “살갗을 따스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펼쳐진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이 안겨주는 완벽한 사치. [T]he pure luxury of a cloudless sky designed not to warm the flesh, but solely to please the eye.”(10/5)라는 대목은 이 소설의 초점이 처음에는 시선(게임)의 측면에 있었음을 미리 말해준다. 그렇지만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이 유희적 측면은 형이상학, 도덕적 측면에 너무 많은 걸 양보했고, 결국은 끝에 와서 죽음에 대한 성찰에까지 이르러버렸다. 이건 혹 작가 자신도 예기치 못한, 통제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었을까(나는 “버찌 씨와 낡은 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나보코프 자신이 이 작품을 불완전하다고 본 것은 바로 그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추측을 나는 내 식으로 해본다. 육체(살갗)/시선(눈)의 대립구도가 막판까지 유지되지 않은 것이다. 나보코프에게서 ‘눈(시선)’은 한 인간의 분신으로서 기능할 만큼 중심적이다(그의 <스파이Eye> 같은 작품). 즉 고골의 ‘코’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나보코프의 ‘눈’이다. 또 그의 여러 작품들에서 시선(시각)은 주인공-인물에 대한 작가-화자의 지배-권력 자체이다. 작가는 시선의 지배권자이기에. 이런 걸 좀더 잘 말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오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살갗을 따스하게 해주는 햇빛이 좀 있었으면! 오갈데 없는 비만 줄기차게 내리고 있다...
08. 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