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에서 '독서에세이'를 청탁받고 쓴 글을 옮겨놓는다. 강의차 최근에 조금 들여다본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썼다. 지면사정으로 분량이 2매쯤 더 늘어났음에도 '서론' 정도에 머물렀다(루카치에 대해서, 혹은 루카치와 벤야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길게 써볼 생각이다).



대학신문(11. 10. 10)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루카치, 또는 유토피아에 대한 꿈
『대학신문』에서 원고청탁을 받는다고 반드시 대학시절을 떠올릴 필요는 없을 텐데, 연상효과 탓인지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이 생각났다. 내게 이 책은 80년대 후반 대학가의 풍경과 분리되지 않는 책이다. 개인적으로 학부시절에 읽은 가장 난해한 책 두 권이 『소설의 이론』과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였다. 두 책의 요지에 대해서는 ‘강의’까지 할 수 있게 됐지만, 직접 읽어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어느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전망이 어떻다는 걸 다 알더라도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고 보면 ‘읽기’는 ‘인식’과는 종류가 다르며 어쩌면 용도까지 다를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도 읽기는 경험이니까.
가장 난해했던 책이란 인상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읽어보리라 벼르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빨리 재회하게 되지는 않았다. 『소설의 이론』에 한정하자면 학부시절에 읽은 것과는 다른 번역본이 그간에 새로 나왔고, 그 또한 바로 구입해서 책장에 꽂아뒀지만 진득하게 손에 들 기회는 내지 못했다. 아마도 단순한 책 한 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가 아닌가도 싶다. 가볍게 손에 들기에는 너무 무겁고 묵직하달까? 거창하게 말하면 『소설의 이론』은 그냥 ‘이론서’가 아니라 한 세대의 ‘청춘’이고 ‘역사’다. 하다못해 내 경우만 해도 그렇다. 언제나 플래시백을 동반하는 청춘의 역사.
남학생의 경우 대학시절은 학부생시절과 복학생시절로 나뉜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내게 학부시절은 2학년까지였다. 5공화국 시절의 대학 2년을 용케 버티며 다니다가 3학년에 올라와서는 한달만 강의실에 고개를 내밀다 군대에 갔기 때문이다. 끌려간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갔다. 그게 89년 봄이었다. 그리고 복학한 게 91년. 보통은 동기들이 아닌 후배들과 강의를 듣게 되니 복학생에게 대학생활은 또 다른 풍경이고 또 다른 생활이다. 하지만 내 또래 학번에겐 ‘또 다른 역사’이기도 했다. 이 경우는 스케일도 커서 ‘세계사’다.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연이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됐다. 곳곳에서 레닌동상이 철거되고 끝내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세상이, 아니 역사가 일상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바뀌어갔다. 어쩌면 사회적 격동이란 게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오히려 예외에 속했는지도 모른다. ‘기적적인 일상’이란 것 말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사이 꽃잎에 이슬이 맺히는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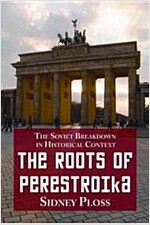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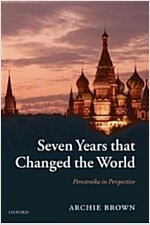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동기들과 소련의 ‘젊은’ 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읽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사회주의의 희망처럼 보였고 더 강력해진 사회주의가 곧 우리 눈앞에 등장할 것처럼 여겨졌다. 착각이었다. 러시아문학을 공부하겠다고 대학에 들어올 때만 해도 소련이란 나라는 ‘적성국가’였다. 동창회 자리에 나가 전공이 ‘소련’이라고 결연하게 얘기하면 박수를 받던 때였다. 하지만 학부를 졸업하기도 전에 소련이란 나라는 말 그대로 과거, ‘역사적 과거’가 됐다. 자칭 스탈린주의자였던 이들조차도 소련에 대해 욕을 퍼부었다. ‘역사적 사회주의’는 향수의 대상이거나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러고는 다들 곧 무관심한 표정이 됐다. “역사는 끝났다!” 모두 심드렁한 표정으로 카페에 앉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었다. 그렇게 가을이 저물어갔다.
돌이켜보니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마당이었으니 학부시절 강의실과 과방에서 명예롭게 울려 퍼지던 루카치란 이름이 퇴물의 대명사가 된 건 당연하다. 그는 교조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이었다. 하기야 “최악의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최상의 자본주의보다 더 낫다”고 단언한 골수 공산주의자가 루카치 아니던가.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루카치는 『소설의 이론』에서 소설에서는 세계의 본질이 시간과 함께 주어진다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으로 ‘소설적’이고, 진리에는 소설적 계기가 있는 듯하다. 역사의 종말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포장되던 신자유주의의 치세도 지난 2001년 9.11 테러와 함께 종언을 고했다. 한 철학자의 표현을 빌면 ‘현실 사회주의의 종언’에 뒤이은 ‘자유주의 유토피아의 종언’이다. 죽었다던 역사는 다시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건재를 확인시켰다. “나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점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그렇게 다시 길을 묻는 시대에 루카치를 손에 든다. “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라고 그는 『소설의 이론』 서두에 적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즉 지금은 복된 시대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유토피아를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면? 다시 회복해야 한다면? 어쩌면 인류의 위대한 망상 혹은 오랜 망집일지도 모르는 이런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루카치는 도스토예프스키를 복창하며 ‘황금시대’에 대한 열망이라고 불렀다. ‘진정하고 조화로운 인간들 사이의 진정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가능한 시대다. 혹은 문화와 문명이 인간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루카치는 말했다.
애초에 『소설의 이론』 자체가 도스토예프스키론의 서론격으로 쓰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본격적인 도스토예프스키론은 쓰이지 않았다. 그건 제1차 세계대전에 직면해 무엇이 파국에 직면한 서구 문명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던 루카치가 도스토예프스키적 세계에 대한 전망으로 나아가기 전에 러시아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근대 러시아문학 전체는 1917년 혁명에 수렴된다고까지 그는 적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자리는 ‘1917년 이전의 루카치’고, 우리가 다시 읽는 루카치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의 루카치’다. 공산주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지지와 옹호도 지금에 와서 다시 읽으면, “최상의 자본주의보다 못한 공산주의라면 공산주의도 아니다”란 뜻인가도 싶다. 현실사회주의를 ‘현실과 타협한 사회주의’란 의미로 이해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우리에게 꿈이 있는가. “실패하라, 더 낫게 실패하라”(사무엘 베게트)란 경구를 실천할 용기가 있는가. 그런 생각과 함께 『소설의 이론』을 다시 펼친다.
11. 1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