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날이 새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날이다. 나로선 서울시민이 아니기에 '딴 동네' 얘기이긴 하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굳이 투표장에 가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니 주문해서도 얻기 어려운 기회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줄 때다. 한편, 얼마전에 현대사 전공자들의 보수학술단체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왜 그게 '꼼수'에 불과한지 정리해주는 기사가 있기에 스크랩해놓는다. 말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이지만 실상은 (김어준식 어법을 빌려 말하자면) '민주주의냐 꼼수 민주주의냐'이다. 국민들도 그동안 충분히 속을 만큼 속았다. 이젠 갚아줄 때도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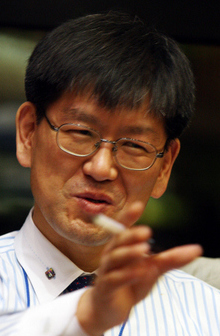
한겨레(11. 08. 24)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변질된 개념유신헌법의 독재정권 정당화서 비롯”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조선일보>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크게 보도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질 높은, 심화된 민주주의”라는 그의 말을 끌어들여, 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물음이 빠져 있다. 한국의 일부 세력이 주장해온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냐는 물음이다.



박명림(사진) 연세대 교수는 계간지 <역사비평> 가을호에 실을 ‘박정희 시기의 헌법 정신과 내용의 해석’이란 논문에서 박정희 시대의 헌법 문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적인 성격을 파헤쳤다.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민주주의 정신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박정희 시대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1972년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 때,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인 1948년 건국헌법 때부터 1969년 3선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문의 같은 부분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규정과는 거리가 먼 ‘민주주의 제(諸)제도’란 말이 쓰였다.
박 교수는 특히 유신헌법 때 들어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한국의 국가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추구해오던, 냉전시대 반공주의로 이해했던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와 다르다”고 지적한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현행 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공식 영어번역이라고 한다. 법제처 공식 누리집을 보면,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the liberal-democratic basic order’가 아니라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로 옮기고 있다.
이는 유신헌법이 참조했던 1949년 독일기본법의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라는 독일어 원문에 충실하게 옮긴 것이다. 이 조항은 파시즘과 전체주의, 공산주의 등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적극 방어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신헌법은 이 조항을 따오면서 본래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협소한 냉전시대 반공주의의 논리로만 적용했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본뜻과 정반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위해서라며 유신헌법을 내세웠으나, 여기에서마저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신쿠데타를 앞둔 박정희 정권이 ‘헌정변개’를 사전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에 통고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한다. 유신헌법과 함께 만들어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반공도 뭣도 아닌, 오로지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박 교수는 “과거에 권위주의를 뒷받침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에는 복지·형평·포용·균등 등을 반대하고 시장만능주의를 추종하는 논리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을 보면, 시장만능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로버트 달, 조지프 슘페터와 같은 주요 자유민주주의 이론가들의 행보에서도 이런 경향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래리 다이아몬드도 지난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 민주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유신헌법이 건국헌법과 건국정체성을 부인하고 만들어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은 우리가 아직도 유신의 잔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을 애초 건국헌법의 정신에 맞게 ‘민주주의 제(諸)제도’나 ‘민주적’으로 복원·통일하거나, 독일기본법에 담겨 있는 본뜻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건국헌법처럼 사회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규정하고 지향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원형 기자)
11.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