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닌 재장전' 예고
'레닌 재장전' 예고
<레닌 재장전>(마티, 2010)이 드디어 출간됐다(아직 이미지는 뜨지 않지만 알라딘에도 입고돼 있다). 책은 어제 배송받았는데, 표지가 깔끔하고 책도 분량에 비해 가벼운 것이 마음에 든다. 속표지(표2)에는 특이하게도 지난 11월 '번역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발췌돼 있다(7명의 역자 중 5명이 참석했었다). 사진은 마티출판사의 블로그에서 가져왔다.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마르크스와 달리, 여전히 언급하길 꺼리던 레닌이 이렇게 세상에 다시 등장한 것! 이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 레닌이 귀환했다. 게다가 세계의 담론을 이끌어가는 살아 있는 최고의 석학들이 레닌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레닌을 읽을 것인가? 그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이현우(알라딘 블로거 '로쟈')
“80년대 끝무렵부터 90년대 초반을 고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보 운동이 사그라들었다. 정의, 저항, 혁명 등의 단어가 증발한 것 같았다.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향해 걸어와 노동자들의 연대와 희망이 사라진 지금 우리 앞에 ‘레닌’이 부활하고 있다.” - 이재원
“이 책을 옮기며 알게 되었다. 나에게 레닌은 ‘질문’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구하도록 나를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몸 전체를 던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자체가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으며 민주주의였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에게 절실한 책이다.” - 한보희
“왜 레닌을 읽을 필요가 생겼을까? 이 점이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잊혀졌던 단어들을 되새기게 되었다. 정의, 정당, 조직…. 오히려 마르크스는 지식인의 세계에 속한 사람(사상), 고전이 되었다. 하지만 레닌은 지식인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상가다. 그런 점에서 새로웠고 자극적이다. 왜 레닌을 읽을 필요가 생겼을까?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된다.” - 최정우(알라딘 블로거 '람혼')
“바디우의 레닌은 참으로 흥미로웠다. 냉혹한 현실 정치인이란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로, 레닌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섰을 때 언제나 ‘정의와 이념, 그리고 진리를 선택했다’고 바디우는 말한다. 레닌은 말랑한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진리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 이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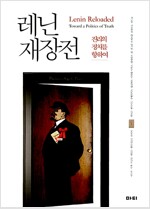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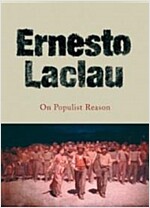
레닌의 철학과 정치적 실천에 대한 재해석/재평가를 담은 17편의 글 가운데 내가 맡은 건 지젝이 쓴 '오늘날 레닌주의적 제스처란 무엇인가; 포퓰리즘적 이성에 맞서' 하나이다. 다른 역자들, 특히 역자들을 대표해 '옮긴이의 글'을 쓴 이재원씨나 가장 어렵고 많은 분량의 텍스트들을 옮긴 한보희씨에 비하면 대수로운 수고는 아니었다(그럼에도 편집부를 애먹게 했지만). 지젝의 텍스트는 이렇게 시작한다(이 서두는 <시차적 관점>의 내용과 일부 중첩된다). 이후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에서 지젝은 주로 라클라우의 포퓰리즘론(<포퓰리즘적 이성에 대하여>)과 대결한다.

슬로베니아의 늙은 공산주의 혁명가 요제 유란치치의 운명은 스탈린주의적 왜곡의 가장 완벽한 은유로 꼽을 만하다. 1943년 이탈리아가 항복했을 때 유란치치는 아드리아해 라브 섬의 한 강제수용소에서 유고슬라비아 포로들이 일으킨 반란을 지휘했다. 그의 지휘하에 2,000명의 굶주린 포로들은 단독으로 2천 200명의 이탈리아군을 무장해제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체포되어 인근의 작은 골리 오톡(‘벌거벗은 섬’)의 악명 높은 공산주의자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는 1953년 다른 죄수들과 함께 1943년 라브섬에서의 반란 1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 데 동원되었다. 요컨대, 공산주의자 죄수로서 유란치치는 그 자신이 지휘한 반란을 위한, 곧 그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셈이다. 만약 ‘시적 불의’(이 경우엔 ‘시적 정의’가 아니다)라는 게 있다면, 유란치치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사실 이 혁명가의 운명이야말로 스탈린 독재시절 전체 인민의 운명, 처음엔 혁명을 통해서 구체제를 영웅적으로 전복시키고, 그 다음엔 새로운 규정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혁명적 과거에 대한 기념비를 강제로 세워야 했던 수백만 인민의 운명이 아니던가? 따라서 이 혁명가는 그 자신의 운명이 전체의 운명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아주 탁월한 ‘보편적 단독자’이다.
여기서 진정한 과제는 10월 혁명의 비극을 사유하는 것이다. 곧 그 위대성, 유례없는 해방적 힘과 함께 그것이 스탈린주의로 귀결된 역사적 필연성을 동시에 인식해야만 한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 맞서야 한다. 하나는 스탈린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우발적인 일탈에 불과하다고 보는 트로츠키식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기획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전체주의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트로츠키에 대한 최고의 전기를 펴낸 아이작 도이처는 그 셋째 권에서 1920년대 말 강제 집산화와 관련하여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외부를 향하여 확장하는 데 실패하고 소련 안으로만 한정되자 혁명의 역동적 힘은 내부로 향하게 되고 소비에트 사회의 구조를 한 번 더 폭력적으로 재구축하기 시작했다. 강제적인 산업화와 집산화는 혁명 확산의 대체물이 되었고 러시아 부농계급(kulak)의 일소는 국외 부르주아계급 타도의 대용품이 되었다."(12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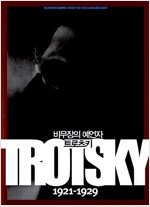

마지막에 인용된 아이작 도이처의 책은 '트로츠키 3부작'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장한 예언자 트로츠키>(필맥, 2005), <비무장의 예언자 트로츠키>(필맥, 2006), <추방된 예언자 트로츠키>(필맥, 2007)로 번역돼 있다. 그 셋째 권은 물론 <추방된 예언자 트로츠키>를 가리키는데, 책을 갖고는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대조해보진 않았었다. 미주를 보니 편집부에서 해당 쪽수를 찾아놓았다. 이렇게 번역됐다.
"러시아혁명의 충격이 유럽에서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 추동력은 아직 소진되지 않았음이 판명됐다. 그러나 그 추동력이 밖으로 작용하거나 확장되지 못하고 소련 안으로 응축되면서 내부지향적인 것이 되고 다시 한 번 격렬하게 소련사회의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강제적인 공업화와 집단화가 혁명의 전파를 대체하게 됐고, 러시아 쿨라크의 해체가 해외 부르주아 지배체제의 전복을 대신하는 대용품이 됐다."(166-7쪽)
이하 '오늘날의 레닌주의적 제스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10. 01. 24.
P.S. 교정을 한 차례 보긴 했으나 잘못 옮기거나 이해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인용한 대목에서도 "새로운 규정의 노예가 되어"란 말은 "새로운 지배의 노예가 되어"라고 옮기는 것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든다(옮길 때는 'rules'라고 복수형으로 돼 있어서 '지배'란 단어를 피했었다). 그리고 134쪽에서 "야만적인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조차도, 포퓰리즘이 등가적 요구의 사슬에 엮어 들어갈 수 있다."는 "야만적인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조차도, 포퓰리즘의 등가적 요구 사슬에 엮여 들어갈 수 있다."로 수정돼야 한다. 교정시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