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관심도서 두 권은 신시아 브라운의 <빅히스토리>(프레시안북, 2009)와 제임스 베니거의 <컨트롤 레벌루션>(현실문화, 2009)이다. 전자는 빅뱅부터 현재까지의 '통합적 지구사'를 표방한 역사서이고, 후자는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기원'으로서 '제어혁명'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과학서이다. 생각보다는 덜 주목받았는데, 눈에 띄는 리뷰기사들을 스크랩해놓는다.

한국일보(09, 08. 29) 빅뱅에서부터 다시 쓴 지구인의 역사
역사책은 흔히 인류가 문자로 기록을 남긴 약 5,500년 전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의 시간은 '선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는데, 대체로 인간이 구석기를 사용하던 시절을 시점으로 삼는다. 그보다도 앞선 시간은 역사가 아니라 생물학이나 지질학, 혹은 천문학 같은 과학의 대상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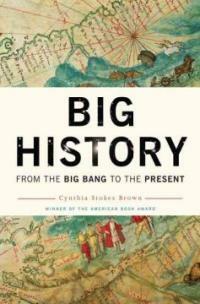
<빅 히스토리>는 이런 구분을 거부하며 역사의 대상을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확장한다. 미국 도미니칸대 교육학과 교수인 저자 신시아 브라운은 "역사는 과학적 작업의 한 부분"일 뿐이라며 "구태여 두 부분으로 나눠 하나는 '과학'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역사'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책은 137억년 전 우주의 시작인 빅뱅에서 출발한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시간대_우주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_에 대해 과학 용어를 통해 생각할 능력을 갖게 됐으며, 그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의 이야기를 보다 큰 맥락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초(超)거시적 입장에서 기후, 음식, 성, 무역, 종교, 사상, 제국, 문화 등 역사의 기본 요소들을 다룬다.
<빅 히스토리>의 관점은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권의 관점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시민의식이 필요한 글로벌 시대의 역사가 어떤 변종을 거치게 될지를 예견케 한다. 또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복합적 결과로서 역사를 구성함으로써,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새로운 통섭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유상호기자)

중앙일보(09. 08. 19) 토플러가 놓친 것, 토인비가 꿰뚫어 본 것
◆앨빈 토플러는 틀렸다=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토플러는 근시안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우리 세대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역학(다이내미즘)을 간과한 채 한시적이고 지엽적인 변화에만 주목”(34쪽)했다. 제3의 물결(정보화 혁명)이 가족 형태, 경제와 정치구조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예견했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쳤을 뿐이다. ‘지구촌’을 언급(1964년)했던 마셜 맥루언,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예견한(60년) 다니엘 벨, 탤러매틱 사회론의 시몽 노라(78년) 역시 절반만 맞았다.
◆아놀드 토인비가 맞았다=토인비가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것은 1884년이다. 증기기관차·철도 등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거의 100년 뒤의 일이다. 산업혁명이 사회변화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인류사에 농업사회가 처음으로 종언을 고했다고 지적했는데, 이후 그 용어가 학계에 보편화됐다. 저자 말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변동을 저류로부터 제대로 파악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이 책은 그 ‘어려운 일’에 대한 도전인데, 결과는 경이롭다. 꼭 20년 전 미국에서 출판된 이후 고전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데 지금 봐도 설득력이 크다. 읽을거리로 치면 가히 ‘월척’인데, 맥루언·벨·토플러 등과 달리 콘트롤 레벌루션(제어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산업혁명 이후 펼쳐진 ‘모든 것의 역사’를 쥐고 흔든다. 정치·경제·미래학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생물학까지 넘나드는 학제적(學際的) 접근도 당연한다.

저자는 우선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보화 사회가 시작됐다는 통념부터 뒤집는다. 콘트롤 레벌루션은 산업혁명 이후 즉각적으로 발생했다. 산업혁명 때문에 인류의 삶 최초로 대량생산· 대량 유통이 가능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콘트롤하지 않으면 자칫 사회가 마비되거나 대형사고가 따를 판이었다. 실제로 사고가 빈발했다. 이런 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어·관리하는 기술이 이때 등장했다. 물류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철도·전신·우편·라디오 등 전에 없던 혁신을 이뤄낸 것이다. 정보처리(프로세싱)와 교환 그리고 제어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인류사에 등장한 제어혁명의 첫 모습이다.
단일통화·표준시·디지털·컴퓨터·인터넷 등의 등장도 그 맥락이다. 이 덕분에 예전의 고립된 지역시장이 단일한 세계 경제체제로 통합이 가능했다. 즉 현대사회 변화의 가장 큰 저류에는 제어혁명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화사회·후기산업사회 등의 규정은 단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그렇게 딱딱한 것만은 아니다. 19세기 무수한 발명의 일화를 미주알고주알 드러내며 그 안의 숨은 의미를 천착해내는 등 만물상적 지식은 크게 부담없다.
모든 과학기술이란 생명 유기체의 섬세한 메커니즘을 모방하거나 확장한 것이라는 제1부 2장의 시각이 특히 주목할만하다. 생명의 핵심이란 결국은 프로그래밍과 제어라는 독특한 시각인데, 사회학자가 쓴 과학론이 아주 볼만하다.(조우석 문화평론가)
09.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