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쟈의 인문학 서재>(산책자, 2009)에서 혼란스런 고유명사 음역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클로소프스키'를 언급한 바 있는데(375쪽), 바로 그 클로소프스키의 대표작이 출간됐다. <니체와 악순환 - 영원회귀의 체험에 대하여>(그린비, 2009). 책은 1969년에 출간됐고 들뢰즈의 <니체와 철학>과 함께 1960년대 '니체의 재발견'을 가져온 저작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1964년 루아요몽에서 니체를 주제로 한 유명한 학술토론회가 개최되며 클로소프스키 또한 발표자로 참여한다. 기억에는 들뢰즈 혹은 푸코가 이 학술토론회를 주도했고, 발표문은 <새로운 니체>로 묶여서 출간됐다. 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와 악순환>은 내가 니체 자신과 함께 읽은 가장 위대한 철학책입니다." 개인적으론 오래전에 구해놓은 영역본을 어제 책꽂이에서 빼놓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읽을 여유는 없고, 일단은 리뷰기사만을 먼저 챙겨놓는다.


한겨레(09. 06. 06) 니체 ‘자아 동일성’ 벗어나 ‘무한 자유’ 얻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클로소프스키(1905~2001·사진)의 저작 <니체와 악순환-영원회귀의 체험에 대하여>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인 ‘영원회귀’를 중심으로 삼아 니체의 사유를 해석한 독특한 연구서다. 클로소프스키의 니체 연구의 결산이라고도 할 책이자, 한국어로 번역된 클로소프스키 첫 저작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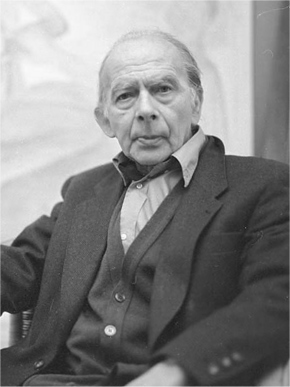
클로소프스키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부모가 모두 화가였던 클로소프스키는 그 자신도 화가로서 대단한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화가 생활은 클로소프스키 삶의 일부일 뿐이다. 청소년기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앙드레 지드의 영향을 짙게 받은 그는 1950년대에 소설들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클로소프스키의 집요한 탐구 영역은 인간의 한계 체험으로서의 ‘광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28년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횔덜린의 시들을 번역한 것은 광기 탐구의 전초전이라 할 일이다. 1934년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조르주 바타유를 만나 니체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횔덜린도 니체도 광기의 폭발로 삶을 암흑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이다. 1947년에는 ‘에로스의 광인’이라 할 사드 후작에 관한 연구서 <내 이웃 사드>를 발표했다. 그는 스스로 “나는 기인(maniaque·광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암시하는 대로 수수께끼 같은 특이한 인물이었다.
1969년에 출간한 <니체와 악순환>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니체>, 질 들뢰즈의 <니체와 철학>과 함께 니체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고 독창적인 해석을 제공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1960년대에 쓴 10편의 소논문을 묶은 이 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독특함을 보여준다. 짧은 논문들이 모여 니체 일생의 모자이크화를 그려내기 때문이다. 클로소프스키는 니체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출간하지 않고 남겨둔 단편들을 주로 참조해 주인공의 두뇌 속으로 들어간다. 니체 삶의 역사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서 사유의 국면국면을 조명해 니체 사상의 변곡점들을 확인한다.
이 책이 다른 니체 연구서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먼저 니체의 광기에 관한 꼼꼼한 추적에 있다. 클로소프스키는 니체의 사유가 착란(광기) 주위를 돈다는 점이 이제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 책의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니체의 글에서 이 착란의 중심은 ‘벌어진 틈’으로, ‘심연’으로, ‘간극’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오스’로 표현되는데, 이 카오스가 니체를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었음을 니체의 글은 보여준다. 니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은 뒤부터 이 카오스를 보기 시작해 발광 때까지 그 심연에 매혹당했다. 다른 니체 연구서들이 니체의 광기를 삶의 파국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로 보는 데 반해, 클로소프스키는 광기를 니체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힘으로 이해한다. 중요한 것은 니체가 이 광기에 휘말리지 않고 사유의 명석함으로써 광기의 힘을 해부하고 거기에 저항했다는 사실에 있다. 니체의 발광은 그 대결이 마침내 끝났음을 의미한다. 카오스와 명석함의 이 지속적인 대결이 니체 사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클로소프스키는 해석한다.
클로소프스키가 니체 사유에서 주목하는 또다른 주제이자 이 책에서 가장 힘주어 해명하려는 주제가 ‘영원회귀’다. 영원회귀는 1881년 여름 서른일곱 살의 니체가 알프스산맥 질스마리아에서 얻은 계시적 체험의 내용이다. 삶이 영원히 되돌아오고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이 돌연한 계시를 받고 니체는 깨달음이 주는 ‘환희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내용이 니체 자신에게 매우 모호한 의미를 지녔는데,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니체의 나머지 인생이었다고 클로소프스키는 말한다.
클로소프스키가 여기서 강조하는 영원회귀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삶을 반복해 사는 것’이다. 니체는 “역사의 모든 이름들, 결국 그것은 나다”라고 썼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수히 다른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단 한 번뿐인 삶이라는 동일성, 그 삶의 주인인 ‘나’라는 동일자는 사라지게 된다. 나는 나 아닌 것들의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된다. 삶은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다. 끝없이 되돌아오고 끝없이 되풀이되는 악순환만 남는다. 이런 인식은 ‘자아’라는 이름의 동일성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니체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모두 ‘자아라는 동일성’에 기반을 둔 사유의 산물이라고 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근거를 발견한 셈이 된다. 클로소프스키가 해석하는 니체는 ‘탈근대적 급진주의자 니체’의 모습이다.
니체는 1889년 1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최후의 발광을 하고 정신을 놓아버렸다. 그 사건은 니체 내부의 카오스가 그의 명석함을 집어삼켰다는 뜻도 되지만, 니체 자신이 자기동일성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다는 뜻도 된다. 니체는 자아라는 완강한 정체성으로부터 풀려나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클로소프스키는 해석한다.(고명섭 기자)
09.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