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21에 실린 '로쟈의 인문학서재'(http://h21.hani.co.kr/section-021162000/2007/11/021162000200711290687031.html)를 옮겨놓는다. 아렌트의 <정치의 약속> 출간을 빌미로 그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몇 자 적은 것이고 한 문단은 예전에 쓴 글에서 따왔다. '한나 아렌트'가 '해나 아렌트'로 표기된 건 한겨례의 표기원칙에 따른 것이다(나로선 동의하기 어렵지만). 파르테논 신전의 사진은 마음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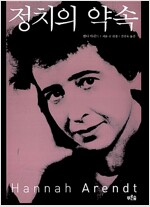

한겨레21호(07. 11. 29) 人間을 들여다보라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정치사상가라 할 만한 해나 아렌트의 <정치의 약속>(푸른숲 펴냄)은 지난 1975년 세상을 떠난 그의 유고 중 하나다. 책은 국내에 먼저 소개된 <전체주의의 기원>(1951)과 <인간의 조건>(1958) 사이의 유고들을 주로 모은 것이다. 대부분이 반세기 전에 쓰인 글들인 셈이지만 여전히 정치의 의미와 정치적 사유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한다.

그럼 아렌트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나? 그는 <인간의 조건>에서 ‘관조적 삶’과 대비되는 인간의 ‘활동적 삶’을 ‘노동’과 ‘작업’, 그리고 ‘행위’로 나누었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행위인데, 이는 ‘정치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다. 애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가 말한 ‘준 폴리티콘’(zoon politikon)은 실상 ‘정치적 동물’로 번역되어야 하며(‘사회적 동물’로 번역한 이는 로마의 세네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 ‘정치적인 것’의 발견(혹은 발명)이야말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함의 형식을 탐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인정이다. 정치에서 다루는 인간은 유적 존재로서의 ‘인류’나 단수로서의 인간(man)이 아니라 복수로서의 인간(men)이다. 즉, ‘인간’이 아니라 ‘인간들’을 다룬다. 아렌트가 보기에 철학과 신학은 항상 단수의 인간과 관계하기 때문에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따라서 ‘정치철학’은 모순형용이다).
정치란 인간들 ‘사이에서’, 혹은 단수의 인간 ‘외부에서’ 생겨난다(사실 한자어 ‘人間’은 이미 이러한 관념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의 근본은 인간의 복수성(human plurality)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다. 그래서 정치는 진리와 무관하다. 가령 우리는 2×2=4인가, 아니면 2×2=5인가의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다. 지구가 도는지 마는지를 배심원들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후보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같은 문제는 정답, 즉 진리를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의 영역, 의견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행위란 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서 복수의 행위자들이 하는 공동행위, 즉 함께-행동함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장이 그리스의 ‘폴리스’였다. 아렌트의 지적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에게 자유롭다는 것은 폴리스에서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거꾸로 폴리스에서 살기 위해 인간은 이미 자유로워야 했다. 즉, 본래적 의미에서 ‘정치적 인간’은 권모술수의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렌트는 자유가 정치의 의미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치란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권리 주장이며 그 행사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흔히 오해되는 그리스어 ‘이소노미아’(isonomia)가 뜻하는 바 또한 모든 사람이 법적 활동을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에서는 폴리스, 곧 정치의 공간에서만 가능했다. 폴리스는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남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 공간으로서 ‘폴리스’가 있는가? 우리는 노예가 아닌,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정당하게 향유하고 있으며 또 적합하게 행사하고 있는가? ‘정치적 인간’ 대신에 ‘경제적 인간’이, ‘정치’ 대신에 ‘정치공학’이 득세하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아니라 ‘BBK’ 같은 금융사기 사건이 국민적 (무)관심사가 되고 있는 즈음인지라 ‘정치의 약속’에 대한 아렌트의 사유와 ‘정치로의 초대’는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정치적 구호들은 난무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정치가 부족하다.
0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