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캔들몇 달전(이라고 적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지난봄이다)에 지라르의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문학과지성사, 2007)이 출간됐다(소개기사는 http://blog.aladin.co.kr/mramor/1104858). 책은 바로 구입해서 꽂아두었는데(아직 영역본은 나오지 않은 듯하다) 중앙일보의 '테마읽기'를 보고 다시 떠올리게 됐다. 게다가 최근에 <희생양>(민음사, 2007)이 재출간되기도 해서 잠시 지라르 읽기 목록도 다시 챙겨두었다. 바로 이전에 소개된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문학과지성사, 2004)와 <문화의 기원>(기파랑, 2006)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한 바가 있기에(http://blog.aladin.co.kr/mramor/909949, http://blog.aladin.co.kr/mramor/920680 참조) 이번엔 <스캔들>과 <희생양>을 읽어볼까 한다(<희생양> 혹은 <속죄양>은 문학평론가 김현이 <르레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에서 지라르의 가장 좋은 책이라고 평한 바 있다). 지라르가 생소한 독자라면 아래 기사를 참고해서 '인문학의 다윈' 혹은 '인류학의 도스토예프스키'(나는 그렇게 부른다)와 한번쯤 만나보시길...


중앙일보(07. 11. 24) [테마읽기] 르네 지라르
문화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흔히 다윈에 비교된다. 한 주제를 두고 평생에 걸쳐 끈질기게 탐구하고 있어서다. 그의 지적 화두는 ‘희생양과 모방적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룬 그의 대표적인 책은 여럿 나와 있으나, 대담집은 의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문학과지성사)의 2부는 정치학자와 나눈 대담이다. 『문화의 기원』(기파랑)은 두 명의 문학 전공자와 벌인 논쟁적인 토론을 기록한 본격적인 대담집이다.
두 권의 책을 읽다 보면 대담집 읽기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다. 이론서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 자전적 기록을 볼 수 있어서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건만, 지라르는 인디애나대학에 재직할 적에 논문을 발표하지 않아 교수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고 한다. 대담집에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질문도 제법 들어 있다. 학계의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그 유명한 레비스트로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대해 지라르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충실히 설명한다.

그의 모방 메커니즘을 거칠게나마 요약하면 “모방적 욕망에서 시작하여 모방적 경쟁을 거쳐 모방위기 또는 희생위기로 격화되었다가 마침내 희생양의 해결로 끝나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풀이하자면 이렇다. 지라르의 이론이 놀라운 것은, 욕망이 모방적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데 있다. 우리는 모델 되는 사람의 욕망을 욕망할 뿐이다. 이 관계는 끝내 두 사람을 경쟁으로 몰아가게 된다. 욕망의 대상은 사라지고,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셈이다. 이 상황은 전염된다. 두 사람이 경쟁하며 욕망하는 것은 제3자도 탐낼 만한 법이다. 마침내 경쟁자들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만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위기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을까. 공동체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지목한 희생양을 살해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었다고 지라르는 분석한다. “집단적 폭력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게 집중적으로 향하는 것”이다. 신화나 고대종교는 희생양을 보는 관점이 동일했다. 위기의 원인을 희생양에게 두고 있었고, 공동체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이유로 희생양을 신적인 존재로 추켜세웠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동체의 만장일치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바로 희생양이 무고하다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을 폭로한다. “성서의 희생양은 무고한 존재여서, 비난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죽어줌으로써 희생양 메커니즘의 종식을 불러왔다. 지라르는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진정으로 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종이란, 자신이 박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우리 욕망의 모델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그리스도가 욕망한 것을 욕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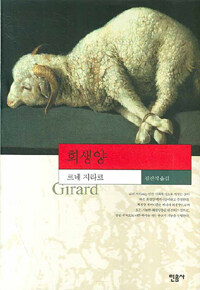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세대로는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민족으로는 제3세계 출신을 차별하고 있고, 노동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 이들은 무고하며 외려 우리들이 박해자라 고백할 때 더 이상의 희생양이 생겨나지 않을 터다.(이권우_도서평론가)
07. 11. 25.

P.S. 지라르의 오이디푸스론과 도스토에프스키론이 정식으로 번역/소개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는 예전에 적은 바 있는데, 최근에 나의 관심을 자극하는 책은 그의 셰익스피어론이다. <질투의 극장>(1991/2004)이 그것인데 영역본으로 366쪽 분량이니까 오이디푸스론과 도스토예프스키론을 합한 것보다도 더 분량이 많다. 그럼에도 이 책 또한 번역/소개되면 좋겠다. 최근에 500쪽이 넘는 인문 번역서들도 드물지 않게 출간되고 있으므로 무망한 기대는 아닐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