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전격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전쟁이 내일이면 3주째로 접어든다. 여러 전망이 나오고고 있지만 확실한 건 러시아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전황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현재로선 러시아가 적당히 발을 빼거나(명분을 챙길 수 있을까?) 아니면 공세를 더 강화하면서 오히려 푸틴의 몰락을 자초하거나(핵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듯싶다. 어느 경우이든 러시아가 기대했던 승리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문학을 자주 강의하는 입장에서(나는 옐친에서 푸틴으로 이어지는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한다(우크라이나 자체가 친러시아적인 동부와 친서방적인 서부로 나뉘어 있기도 한데, 이번 러시아의 침공은 자연스레 반러 감정을 확산시키고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그건 이번 학기에 우크라이나 출신의 러시아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전작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감정이다. 고골에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분리하는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송유관 문제로 양국관계가 나빴던 지난 2009년은 고골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양쪽 모두에게서 고골은 멋쩍게 기념되었다). 이 문제는 한 학기 동안 내내 고심거리가 될 듯하다.



전쟁의 여파로 여하튼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서들에 주목도 생긴 듯싶다. 타이밍을 잘 맞춰 출간된 우크라이나 역사서가 나름 주목받고 있는 게 방증이다. 앞서 페이퍼를 적은 기억이 있는, 우크라이나 역사가의 두 권짜리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것과 대비된다.



국내출판 쪽에서 우크라이나는 내게 <우크라이나>의 두 역자를 떠올리게 한다. 먼저, 주 우크라이나 대사까지 역임한 허승철 교수는 가장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전도사다. 우크라이나어 사전과 우크라이나 역사서를 저술했으며 관련 주제의 번역서도 다수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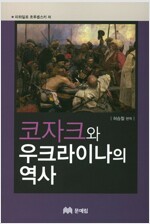

허승철 교수의 공저 가운데는 우크라이나의 민족시인의 생애와 문학을 소개한 <타라스 셰브첸코>도 있는데, 셰브첸코가 바로 우크라이나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시인이다.



국내에는 대표작 <유랑시인>을 포함해(역사학자 한정숙 교수의 번역이다) 시집이 번역돼 있다. 그밖에 우크라이나문학 전공자인 최승진 교수가 우크라이나 현대시인 선집으로 펴낸 <우크라이나의 젊은 여신들>이 우크라이나문학 관련서다.



다시 허승철 교수로 돌아오면, 코사서스도 3국(조지아, 아르메이나,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책과 함께 번역서 <크림반도 견문록>도 펴냈는데, 우크라이나 관할이었던(사실 '영토'라고 하기엔 애매한 지역이었다) 이 크림반도가 지난 2014년 무력에 의해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크림반도에 있는 휴양지 얄타는 많은 러시아문학(특히 체호프 작품)의 배경이기도 하고 유명한 회담 장소이기도 하다(한국 현대사와도 관계가 깊군). 얄타 회담과 관련한 두 권의 책도 허승철 교수가 옮겼다. 우크라이나 역사와 문학과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의 책들을 참고할 수 있다.



다시 문제는 고골. 고골의 초기작들이(주로 1831-1833년에 쓰인 작품들)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한다(우크라이나는 '소러시아'로 불렸다). 작품집으로는 <디칸카 근교 마을의 야회1,2>(1831-32)와 <미르고로드>(1835, <타라스 불바>가 수록) 등이다. 다행히 <디칸카>는 지난해에 완역본이 나와서 읽어볼 수 있지만, <미르고로드>는 수록된 작품이 분산 번역되었고 일부는 절판된 상태다.



<미르고로드>의 수록된 작품은 네 편인데, 이 가운데 <타라스 불바>는 단행본으로 나왔고(개작본이다), <두 이반이 싸운 이야기>는 번역본에 <디칸카>에 수록돼 있다. <옛 기질의 지주>와 <비이>가 현재 읽어볼 수 없는 상태(<비이>는 절판된 <오월의 밤> 혹은 <외투>(생각의나무)에 수록돼 있다).
우크라이나 풍속과 민담을 걸쭉한 이야기로 변형해낸 고골의 작품들을 다시 읽으며(셰브첸코와 다르게 고골은 러시아어로 작품을 썼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문화적, 문학적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