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는 4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할 줄 안다. 나는 그런 J 가 너무 근사해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게 됐니?' 물었더니, '미친듯이 단어를 외웠다'고 J 는 내게 답했다. 그 답도 신선했다. 잘하는 건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해주어서. 그게 몇 년전 우리의 첫만남 때의 대화였는데, 그 후의 J 는 그 뒤로도 불어와 일어의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스페인어에도 관심을 가진 것 같다. J 는 어느날의 편지에 커피와 와인을 보면 네 생각이 난다, 고 적어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나는 외국어를 대할때면 J 생각이 난다. '이윤 리'의 《천년의 기도》를 읽다가도 J 를 떠올렸고, '샤오루 궈'의 《연인들을 위한 외국어 사전》을 읽다가도 J 를 떠올렸다. J는, 통역과 번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어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쩌면 자신이 모르는 뜻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boy 란 단어를 사전을 찾아 보기도 한다고 했다. 잘한다는 건, 괜히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잘하는 게 있다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인 것도 같고.
이 책, 《디어 슬로베니아》를 읽으면서 또다시 J 생각이 났다. 시인 김이듬은 92일간 슬로베니아에 머무르면서 그 때 느꼈던 것들을 이 책 한 권에 적어놓았다. 슬로베니아에 92일간 머무르면서 김이듬은 그곳 대학 학생들에게 한국 문학을 강의했다고 한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다니, 그 먼 데서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며 읽어가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다.
슬로베니아의 대표적인 술은 라키아rakya라고 하는 한국의 소주 같은 술로 배나 감 같은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다. 알코올 도수가 무려 40도다. 나는 이곳의 우니온Union 맥주를 좋아했다. 술맛이 좋아 연신 마시다 술에 취하면 덜컥 모국어가 그리워졌는데, 사고의 도구가 모자라는 느낌이었다. 그럴 때면 한국에서는 잘 듣지도 않는 최신가요를 찾아 틀어놓거나 한국 시인의 시집을 들춰보는 것으로 그리움과 생각의 결핍을 메우곤 했다.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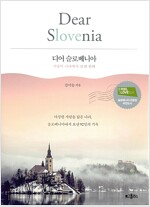
외국어를 더 많이 쓰는 곳에서 지내면서, J도 가끔은 덜컥, 모국어가 그리워질까? 사고의 도구가 모자라는 느낌을 받을까? 그럴 때면 평소 즐겨 듣지 않던 가요를 듣기도 하고, 한국 시인의 시집을 들춰보기도 할까?
너도 나를 떠올리며 나와 같이 마음 서쪽 창가가 붉어지는지, 우리의 기억을 창밖으로 밀쳐버렸거나 말려죽이지 않고 작은 화분 붉은 꽃처럼 가끔 들여다보는지 궁금하구나. (p.233)
슬로베니아에서의 생활에 대한 글과 사진 외에도 김이듬은 자신이 그곳에서 읽었던 시들을 적어두기도 했는데, '프랑시스 잠'의 시를 가만, 읽었다.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프랑시스 잠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 병에 우유를 다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상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옴 오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베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들이는 일.
*프랑시스 잠, 《새벽의 삼종에서 저녁의 삼종까지》, 곽광수 역, 민음사(1995)
김이듬은 크리스마스 이브도 슬로베니아에서 보냈다.
나도 언젠가는, 생애 한번쯤은, 여기가 아닌 먼 곳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낯선 곳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회사를 관둬야 되는데....
아 글을 더 못쓰겠다. 아름다운 풍경이 잔뜩 있는 사진 보면서 책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해.......왜이러지 ㅠㅠ 역시 보약을 먹어야 하나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