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친구와 알라딘 파우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셰익스피어를 선택했는데 너는 무얼했냐, 피츠제럴드를 하지 않다니 의외로구나, 부터 시작해서 필립 로스가 있으면 그걸 택할텐데 까지. 친구는 원하는 작가의 이름을 단 한 명만 선택할 수 있다면 필립 로스를 파우치에 새기고 싶다는 거였다. 나는 선뜻 한 명을 고를 수 없다고 말했다. 피츠제럴드는 당연히 좋긴 하지만 파우치 디자인이 별로였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선택했지만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니 상관없다. 누군가 신청할 수 있는거라면 코맥 매카시를 해야 할까, 존 쿳시는 어떨까, 로맹 가리는, 줌파 라히리는 등등. 친구는 내게 계속 한 명만 선택하라 말했고,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것엔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구는 다시, 생존 작가들중 필립 로스가 가장 좋다며, 자신은 필립 로스를 꼭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전 필립 로스와 만나고 싶어요!!!」
정확히 위와 같이 친구는 말했고, 이런 대화를 이어가다 이렇게 종결되어 가는 시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전 현빈.....」
이어지는 친구의 답은 이랬다.
「ㅋㅋㅋㅋㅋ」
「지금 세차게 기침 했음 ㅋㅋㅋ」
그랬다. 나는 파우치나 에코백에 피츠 제럴드, 로맹 가리, 코맥 매카시, 줌파 라히리를 넣기를 원하고, 그들의 얼굴이 그려진 에코백을 선택하는 것이 기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대화를 친구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기쁨이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은건 그들이 아니라 현빈이었다.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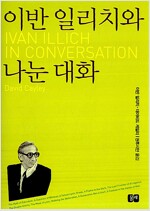
어렵게 읽긴 했지만 어쨌든 다 읽기는 한 이 책의 초창기에, 이반 일리치는 이런 말을 한다.
사실 내 인생은 대부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된 결과이다.– 71쪽
아,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멋진 말이다. 실상 이반 일리치와 데이비드 케일리가 나눈 대화를 읽다보면 이반 일리치는 약간 까탈스러우며 까다로운, 까칠한 사람이란 인상을 받게 된다. 그의 앞에서는 말을 잘못했다가 무식해보이는 게 식은 죽 먹기란 생각도 들고. 교수로서의 그를 만나고 싶어진단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의 질문 세례도 받고 싶지 않아진달까.
그러나 이 까칠한 학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애정이 보통의 것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그런 그가, 누군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저런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한다는 것도 꽤 놀랍다. 더 많이 알고 더 지적이고 수많은 외국어를 익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통의 인간인 것이다. 나랑 같은, 우리랑 같은!
충격이었다! 나로서는 그로부터 3~4년 안에 우리가 친한 친구가 되고 또 그가 만년에 쿠에르나바카에서 나와 함께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굿맨을 내가 알게 된 위대한 사상가의 한 사람으로, 또 사려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223쪽
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과 친구가 되다니, 그는 얼마나 감탄했을까. 스스로도 수없이 되뇌이지 않았을까. 으악,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구가 되다니, 정말 놀라워! 하고. 이반 일리치에게 '폴 굿맨'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친구로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런 친구가 됐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 나 역시 그런 존재를 만나, 상상도 하지 못한 순간에 가까워지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런지도 모른다. 내 앞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떻게 친구가 될까. 그리고 그들과 어떤 사이가 될까.
최근에 친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도 우리들 사이가 예전같지 않게 될거란 사실이 무척 아팠다. 한 친구는 울었다고도 했다. 앞으로도 연락을 하고 지낼거지만, 만나기도 할테지만, 그 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 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모두 힘들어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멀어지게 될 거라곤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사실이 떠올랐다. 누군가와는 조금 더 멀어지고 누군가와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건가 보구나, 하는 당연한 깨달음을 새삼 떠올렸다. 그러던차에 이반 일리치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과 친구가 되는걸 보노라니 마음속에 꿈틀, 희망이 생기는 것도 같은거다. 나 역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현빈 같은....설마 현빈이, 말도 안돼, 싶지만, 어쩌면 정말 2-3년안에 나의 소울메이트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닌가! 한 달에 한 번쯤 만나 맛있는 걸 함께 먹으며 밀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잖은가! 꺅!
이 책의 <사랑이라는 가면>이란 챕터에서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친구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챕터를 읽는게 좋았다. 위의 인용문도 이 챕터의 것이고 아래의 것도 마찬가지.
(존 홀트에 대해 얘기하며)그는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멋진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어 가끔씩 찾아가서 만져볼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다!– 231쪽
폴 굿맨도 존 홀트도 사실 내게는 외계어와 다름없는 이름이지만-그것은 '이름'이라기보다 알지 못하는 용어로 읽힌다-, 맙소사,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어 가끔씩 찾아가서 만져볼 정도로 멋진' 사람이라니. 너무나 근사하지 않은가. 이 까칠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니. 아니 대체 존 홀트는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나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존재가 있었다. 그를 어떻게 정의내려야 할 지 모를 그때. 우리의 관계가 어떤건지도 명확히 정의내릴 수 없었던 그때. 그의 포지션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모르겠는 그때. 나는 수없이 많이 생각했었다. 몇번이나 생각했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고. 이런 사람과 내가 알고 지내고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니! 하고. 간혹 이런 사람들이 내게 존재한다는 게 신의 축복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중 어떤 이들은 처음의 그 빛을 잃고, 그들중 어떤 이들은 갈수록 그 빛을 더하며 내 옆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것이다. 와, 이런 사람이 정말 있는걸까 싶어 가끔씩 찾아가서 만져볼 정도, 인 그런 사람. 아- 가슴에 애정이 들끓는다. 그가 반짝거리던 그때, 내 손을 들어 그의 팔에 살며시 가져다대었던 그 기억. 내 손바닥에 느껴지던 그의 팔의 느낌. 또다른 사람, 그 사람과 지하철 역에서 각자의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야 하기 위해 작별의 인사를 하던 순간, 이 사람이 너무 좋아, 하는 생각으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던 기억. 그 순간에 나는 입밖으로 신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으윽- 하고. 으윽, 헤어지기 싫어, 하는 뜻을 담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쿵쾅대던 가슴, 같은 것을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는, 신이 나를 사랑해 만들어 보내준 사람 같았다. 그러나 신이 그를 사랑해 나를 만든건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헤어짐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헤어짐은 존재하지 않는채로, 새로운 만남들이 계속계속 쌓여갔으면 좋겠다. 기대와 설레임과 행복함이 찾아드는 만남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삼십년 후에도, 그런 사람과 계속 새롭게 만나 새롭게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지만, 만남이 있어도 헤어짐은 없었으면 좋겠다.
월요일을 어떻게든 우울하지 않게 맞이하고 싶어 빨간색 매니큐어도 바르고, 출근길에 캬라멜마끼아또도 사서 마셔보았다. 뭐, 그랬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