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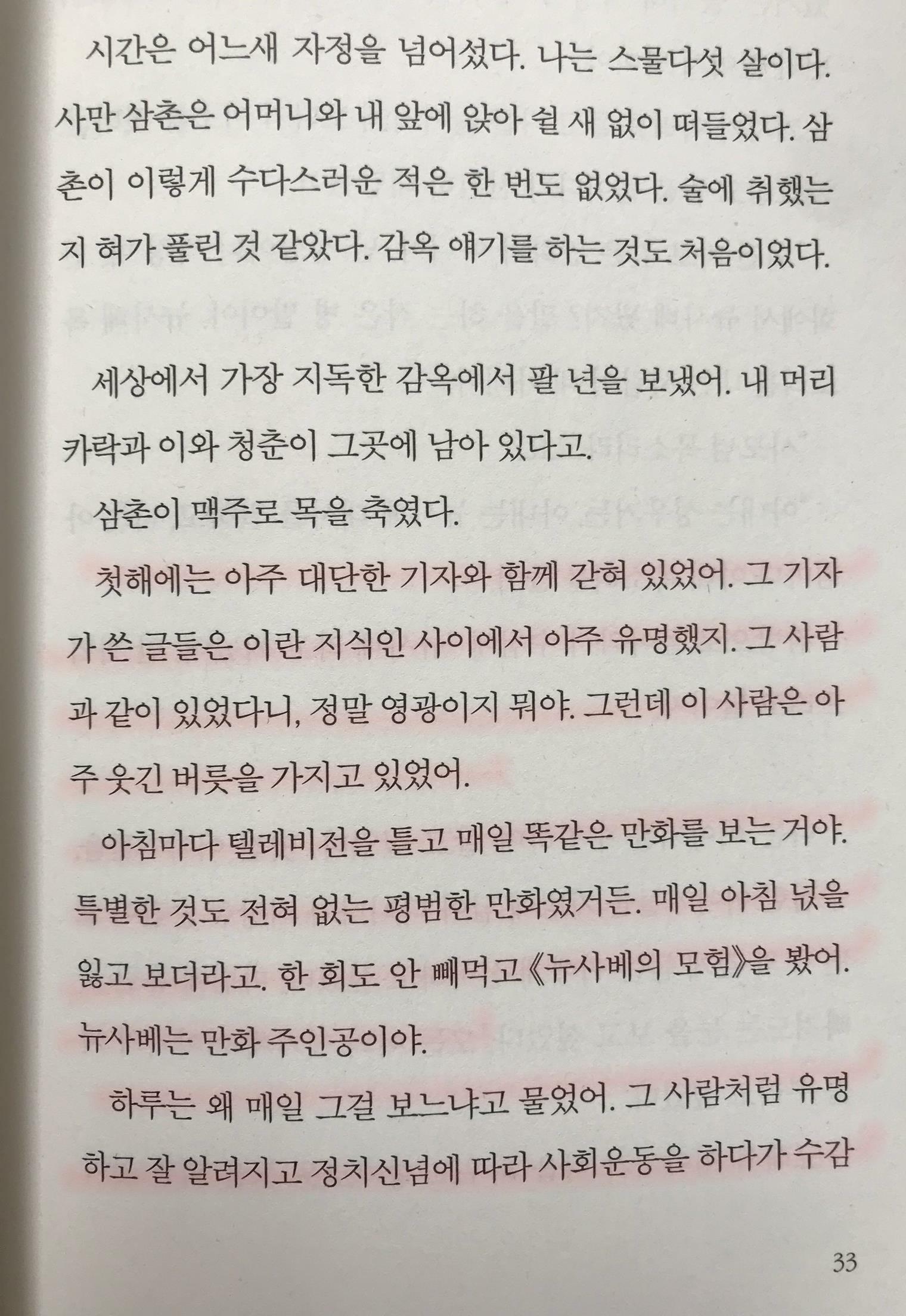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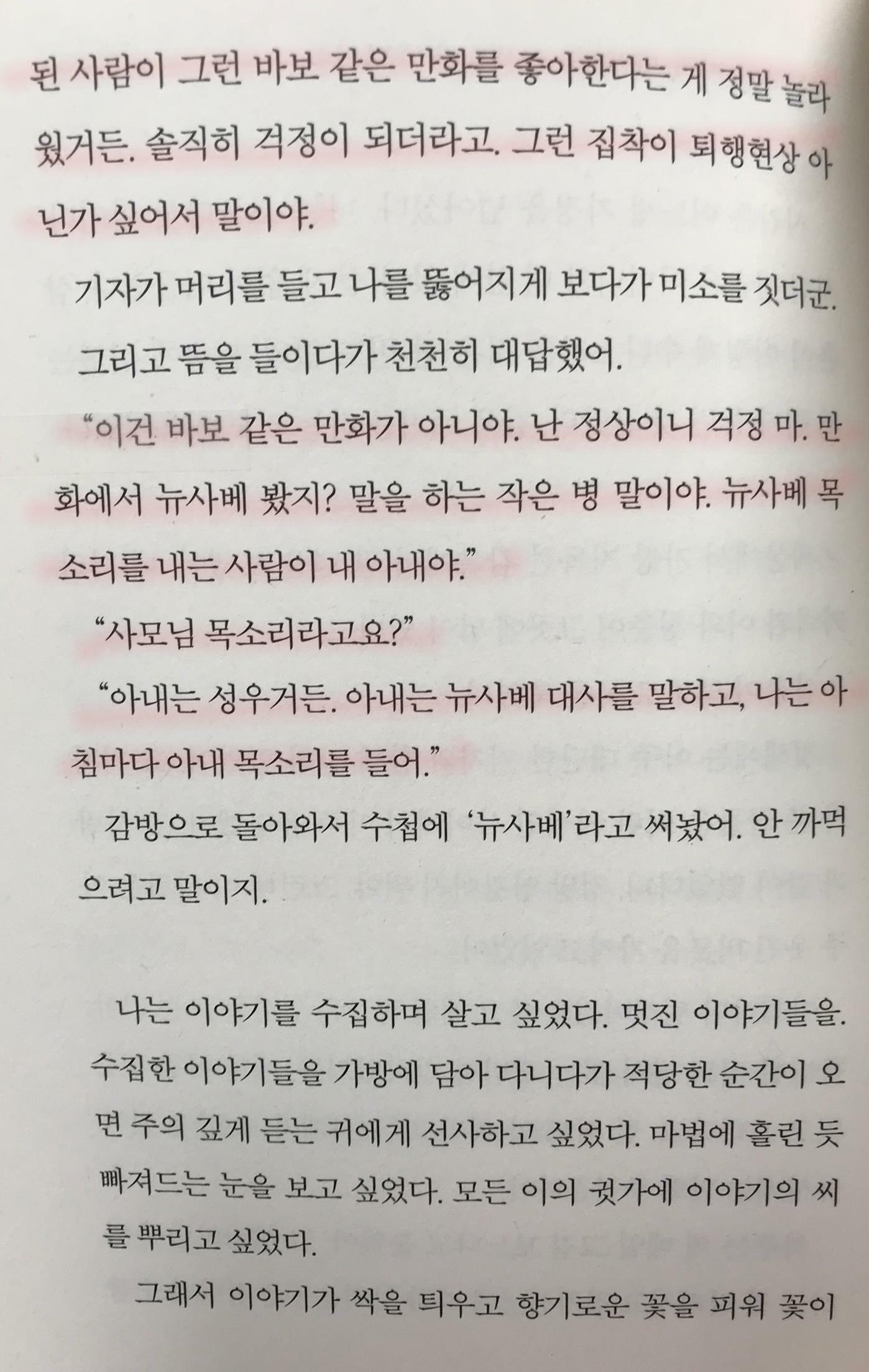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알고 친하게 지내도,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면을 볼 것이며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짐작만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짐작이니만큼 틀릴 확률도 높다. 내 앞에선 널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벗어나고 싶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이 아주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경험에 비추어 '저 행동은 저것을 의미할 것이다' 추측해본들,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같다고 생각해서 혹은 나랑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종종 실수를 한다. 애시당초 '이럴 것이다', '이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 짐작 따위로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끝을 볼 수 없다. 다만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 조심스레 접근할 수 있을 뿐.
사랑은 물론이고 모든 감정들이 바깥으로 말해져야 알 수 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하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만 삼촌은 독재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잡혀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아주 유능한 기자를 만난다. 그런데 그 기자는 '어딘가 바보처럼' 매일 같은 만화방송을 본다. 저사람은 정상이 아닌가보다, 저 뛰어난 사람이 왜저러나, 생각했던 그에게, 그 기자는 만화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고 말한다. 감옥에 갇혀있어서 떨어져있는 아내의 목소리를 이렇게 매일 듣는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심한 만화를 매일 보는거지? 설마 저 등장인물들 중의 한 명의 목소리가 아내의 것일까? 저 사람의 아내는 성우인 걸까?' 까지 어떻게 사고가 나아갈 수 있느냐 말이다. 아무도 거기까진 못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해봤으므로 혹여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아 저 사람이 매일 저 만화를 보는 데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는 추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편견에서 오는, 내 무지에서 오는 사고의 한계를 한 번 깼으니까.
목소리는 무엇일까.
목소리가 좋아서 사랑했는지 사랑했는데 목소리가 좋은건지, 어떤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좋아 매일 듣고 지내던 날들에, 수시로 그런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살아도 세상 행복하다'고.
그것은 목소리 자체가 준 행복일 수도 있지만, 그 목소리 안에 내가 사랑하는 감정과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온 평온과 안정일 수 있을 것이다.
저 기자는 감옥에서 내내 혼자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순수하게 아내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에 대한 아내의 사랑과 아내에 대한 자신의 사랑, 사소한 말 한마디와 그것을 발음하던 입의 모양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과거의 그들에게로 그리고 현재의 그리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목소리는 그저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그저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더 큰,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면. 목소리가 그리움을 불러내고 목소리가 행복을 느끼게 한다. 한 때 나는 목소리로 충만함과 충족함을 느꼈다. 별 거 아닌 말을 주고 받는 것 뿐이었지만, 내 목소리가 그에게 닿고 그의 목소리가 내게 닿는 그 순간들을, 순간과 순간이 이어져 하루가 되고 일 년이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나는 사랑했다. 그래서,
환하고 따뜻한데도, 눈이 부실만큼 빛이 내리쬐는데도 아팠던 날이 떠올랐다.
수십번, 그 상황으로 나를 다시 돌려놓는다. 그 아팠던 날로. 생각만 해도 너무 아파 고개를 젓고 얼른 떨궈내려 하지만, 나는 어김없이 또 그 날로 돌아간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 때 내게 남은 선택지는 행복과 불행이 아니라, 그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 '많이 아플지도 모르고', '더 많이 아플지도 모를' 그 두 가지의 선택지였나. 내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왜 나는 '뭐가 더 아플까'를 생각해야 했을까. 옆에 있으면서 밀려나는 게 좋을까 아예 옆에 없는 게 좋을까. 왜 선택지는 고작 이 따위여야 했나. 결국 '이게 차라리 덜 아프지 않을까'를 선택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를 수시로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건, 나는 세컨드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였다. 언제나 김경미 시인의 시를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겠다 했건만, 세상 모두에게 세컨드가 될 거라고 다짐에 다짐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내가 세상을 세컨드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세컨드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 역시 세컨드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상처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면, 나는 결코 세컨드가 될 수 없었다. 그럴 때는 차라리 버려지는 게 나았다. 길가의 이름없는 돌맹이가 되는 편이 나았다. 세컨드가 될 바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어.
나는야 세컨드 1
김경미
누구를 만나든 나는 그들의 세컨드다
,라고 생각하고자 한다
부모든 남편이든 친구든
봄날 드라이브 나가자던 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나는 저들의 세컨드야, 다짐한다
아니, 강변의 모텔의 주차장 같은
숨겨놓은 우윳빛 살결의
세컨드,가 아니라 그냥 영어로 두번째,
첫번째가 아닌, 순수하게 수학적인
세컨드, 그러니까 이번, 이 아니라 늘 다음, 인
언제나 나중, 인 홍길동 같은 서자, 인 변방, 인
부적합, 인 그러니까 결국 꼴지,
그러니까 세컨드의 법칙을 아시는지
삶이 본처인 양 목 졸라도 결코 목숨 놓지 말 것
일상더러 자고 가라고 애원하지 말 것
적자생존을 믿지 말 것 세컨드, 속에서라야
정직함 비로소 처절하니
진실의 아름다움, 그리고 흡반, 생의 뇌관은,
가 있게 마련이다 더욱 그곳에
그러므로 자주 새끼손가락을 슬쩍슬쩍 올리며
조용히 웃곤 할 것 밀교인 듯
나는야 세상의 이거야 이거
《나의 페르시아어 수업》은 몹시 아름다운 책이다. 이란에서 혁명을 이끌던 부모로부터 태어난 소녀가 프랑스로 망명을 가고, 어린 시절에 프랑스어를 배우며 그 문화에 적응해야 했던 당혹감과 아픔이 그대로 묻어난다. 모국을 놓지 않으려 했다가 모국어를 내팽개쳤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모국어를 끌어 안게 되는 과정이 조용하게 그려지는데, 프랑스의 자유와 이란의 압박 사이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갈등하는 매순간들이 안타까웠다. 성인이 되어 이란으로 돌아가서는 '다시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부르짖었지만 결국 프랑스로 돌아가고 그 후에 중국에서도 터키에서도 충동적으로 살아보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작가의 책에 쓰여지지 않은 삶에는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싶었다.
이 책은 '소설'이지만, 등장인물의 삶에서 그대로 작가를 엿볼 수 있다. 그녀가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전공하고 이란의 시를 논문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운명의 흐름이란 걸 느꼈다.
우리는 모두 방황했다.
우리는 모두 방황한다.
우리는 모두 방황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짧게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길게 방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자리인지, 어디가 우리의 '제자리'인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책속의 작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본다. 어쩌면 인생에 정해진 제자리는 없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나의 제자리일 것이다. 언제나 내가 생각하고 말해왔던 것처럼, 시간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나의 제자리가 당신의 제자리와 맞닿기를 희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