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우라 ㅣ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229
카를로스 푸엔테스 지음, 송상기 옮김 / 민음사 / 2009년 11월
평점 :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송상기 옮김, 민음사)를 읽다. 한나절이면 충분히 읽을 만큼 얇은 ‘중편소설’이다. 푸엔테스 자신의 작가노트와 역자 해설을 빼면 사실 단편 정도 분량 밖에 되지 않는다. 본문 62쪽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묶은 편집자의 ‘만용’(?)이 조금 화가 날 정도였다. 하지만, 낯선 2인칭 시점과 어두운 고딕소설적 분위기 때문에 책장은 손쉽게 넘어가질 않았다. 푸엔테스의 이름이야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그의 소설을 읽는 것은 이번이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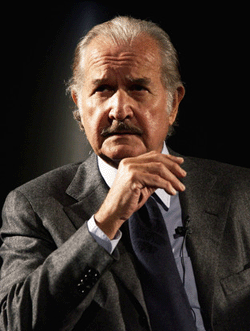 이 소설의 첫 장에는 프랑스 역사가 쥘 미슐레의 다음과 같은 말이 제사로 붙어 있다. “남자는 사냥을 하고 투쟁을 한다. 여자는 계략을 짜고 꿈을 꾼다. 그녀는 환상의 어머니이자 신들의 어머니다. 그녀에겐 또 다른 눈이 있고, 욕망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무한정 비행할 수 있는 날개가 있다. 신은 남자와 같아서 여성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죽는다.” 남자의 거처는 사냥과 투쟁이라는 생활세계인 반면, 여성은 환상과 욕망, 상상력의 세계에 산다, 라는 얘기일 것이다. 이 말의 정치성은 차치하더라도, 곧이어 펼쳐질 이 소설의 제사로서는 적절한 인용이다.
이 소설의 첫 장에는 프랑스 역사가 쥘 미슐레의 다음과 같은 말이 제사로 붙어 있다. “남자는 사냥을 하고 투쟁을 한다. 여자는 계략을 짜고 꿈을 꾼다. 그녀는 환상의 어머니이자 신들의 어머니다. 그녀에겐 또 다른 눈이 있고, 욕망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무한정 비행할 수 있는 날개가 있다. 신은 남자와 같아서 여성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죽는다.” 남자의 거처는 사냥과 투쟁이라는 생활세계인 반면, 여성은 환상과 욕망, 상상력의 세계에 산다, 라는 얘기일 것이다. 이 말의 정치성은 차치하더라도, 곧이어 펼쳐질 이 소설의 제사로서는 적절한 인용이다.
줄거리는 아주 단순하다. 젊은 역사학도인 펠리페 몬테로는 우익 군인이었던 요란테 장군의 일대기를 편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콘수엘로 부인의 저택에서 일하게 된다. 거기서 그는 늙은 콘수엘로 부인과 그녀의 조카딸인 아우라를 만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젊고 어여쁜 아우라와 사랑에 빠진다. 그녀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콘수엘로 부인의 또 다른 분신, 젊은 날의 그녀의 환생이었던 것. 그러니까 펠리페는 이 어둡고 음습한 집에 들어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뒤에야 그 둘이 동일한 인물임을 깨닫는다. 아우라는 콘수엘로의 욕망의 판타지가 만들어낸 그녀의 영원한 청춘, 요란테 장군과의 애절한 사랑을 영원히 현재화 하기 위해 불러낸 여인이었던 것.
“얼굴에 키스해 줘요, 얼굴에만.”
네 곁에 기댄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아우라의 긴 머리카락을 애무할 거야. 그녀의 날카로운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약한 여인의 어깨를 매몰차게 잡을 거야. 그녀가 걸친 비단 가운을 잡아 채고 그녀를 안아, 네 품에서 작고 벌거벗은, 힘없이 스러질 것 같은 그녀를 느껴. 그녀의 신음 섞인 저항과 무기력한 울음도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도 경황도 없이 그녀 얼굴에 입을 맞출 거야. 그녀의 처진 젖가슴을 만지는데, 한줄기 빛이 아스라이 들어오자, 너는 깜짝 놀라 그만 얼굴을 떼고, 달빛이 새어드는 벽의 틈을 찾아. 생쥐가 갉아 먹은 눈 모양 틈에서 은빛이 새어 들어와 아우라의 백발과 창백하고 메말라 양파 껍질처럼 푸석푸석하고 삶은 살구마냥 주름진 얼굴을 비춰. 이제까지 키스해온 살집없는 입술과 네 앞에 드러난 치아 없는 잇몸에서 너는 입술을 뗄거야. 달빛에 비친 늙은 콘수엘로 부인의 흐느적거리고, 주름지고, 작고, 오래된 나체를 보지. 네가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돌아와 줘서 그녀는 가볍게 전율해....
너는 눈을 뜬 채로 콘수엘로의 은빛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을 거야. 달이 구름에 가려 앞이 안보이고 두 사람 역시 어둠 속에 가려 젊은 시절의 추억. 되살아난 기억의 어느 순간으로 대기중에 이끌려 갈 때 그녀는 다시 너를 끌어안을 거야.
“돌아올 거예요, 펠리페. 우리 함께 그녀를 데려와요. 내가 기운을 차리게 놔두세요. 그러면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듯 돌연한 반전과 두 사람의 포옹으로 끝난다. 콘수엘로가 사랑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요란테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과 그녀의 분신인 아우라와 펠리페의 사랑을 통해서 과거의 사랑을 반복하는 일이다. 그러니, 여기서 콘수엘로-아우라와 요란테-펠리페는 다르지만 동일한 커플이다. 두 커플은 스러져간 과거의 사랑을 반복함으로써, 그 사랑의 순간을 영원한 현재에 가두려는 콘수엘로의 욕망을 실현한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는 달빛 속에서 여자를 다시 껴안는다. 달이 여성을 상징한다는 오래된 은유를 기억한다면, 결국 남자는 여성의 세계 속에서, 그녀가 만든 상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녀가 만든 영원한 현재에 머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님처럼 나 이제 문을 잠그네/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지만, 그 집은 영원한 사랑이 머무는 곳이다.
펠리페가 정리하고 있는 요란테 장군의 일대기는 “‘날 잡지 말아요. 난 나의 청춘을 향해 가고 있고, 청춘은 내게 오고 있어요. 벌써 들어왔고, 정원에 있고, 이미 도착했어요.’ .... 콘수엘로, 불쌍한 콘수엘로.... 콘수엘로, 악마도 천사였지, 한때는...”으로 끝난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미신으로 마약을 찾아 헤맨다.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청춘이자 그 청춘을 반복할 두 사람만의 아이. 그런데, 그 아이는 상상과 판타지에서 잉태된 여자, 바로 아우라다. 콘수엘로의 판타지이므로 그녀는 바로 자신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여성이 가진 섬뜩한 사랑의 욕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포크너의 단편 <에밀리에게 장미를, A rose for Emily>를 연상시킨다. 한 여자의 집요하고도 도저한 욕망을 보여주는 이 단편은 나에게 소설 말미에 등장하는 ‘철회색(iron-gray) 머리카락’의 이미지로 남아 있다. 사랑하는 남자를 독살시켜 그와 함께 하기로 한 신혼방에 눕혀 놓은 채 74세로 죽을 때까지 함께 시체와 보내는 외로운 여자. 자신의 사랑을 어두운 신혼방의 시체로 가둬놓은 채, 죽어서야 그 비밀의 욕망이 드러나는 이 질기고 모진 사랑. 철회색 머리카락은 사랑의 한 순간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욕망을 시간의 풍화작용을 견뎌내는 ‘금속성’의 이미지로 보여준다. 10여년 전에 읽은 단편임에도 그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이미지는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포크너와 달리 푸엔테스는 동일한 사랑의 욕망에 판타지의 옷을 입힌다. 포크너에게 철회색 머리카락이 등장한다면, 푸엔테스는 사실과도 같은 환영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크너의 리얼리즘과 푸엔테스의 반리얼리즘인 셈인데, 후자의 판타지는 영원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리얼’하게 재현한다. 지시대상은 여성의 욕망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방식, 그것을 재현하는 방식의 차이다. 푸엔테스는 뒤에 붙은 작가노트에서 이 소설의 문학적 기원으로서 미조구치 겐지의 영화와 그 영화의 원작인 일본 설화 <오토기보코>, 이 설화의 또다른 기원인 중국 <전등신화>의 ‘애경전’을 거론한다. 전등신화가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기원임을 짐작한다면, 김시습과 푸엔테스는 동일한 젖줄을 대고 있는 셈.
푸엔테스가 실제적 기원으로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은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한 소녀. 그리고 마리아 칼라스다. 라 트라비아타의 마리아 칼라스는 죽기 직전의 오페라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로 젊음과 노년, 삶과 죽음을 분리할 수 없고, 젊음, 노년, 삶, 죽음이라는 이 네 가지가 서로를 부른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디바가 부르는 노래가 열정과 감동으로, 시간이 사라진 영원한 지복의 순간을 담고 있듯이, 사랑의 한순간은 시간이 정지돼 있는 것. 시간을 가둬놓거나(에밀리), 시간이 부재한 판타지이거나(아우라) 간에 사랑의 순간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그나저나, 무섭고 섬뜩하지 않은가. 시간을 지배하려는 이 여자들의 욕망은.